-

-
치즈랑 소금이랑 콩이랑
에쿠니 가오리.가쿠타 미츠요.이노우에 아레노.모리 에토 지음, 임희선 옮김 / 시드페이퍼 / 2011년 9월
평점 :

품절


몇 번이나 미루다 읽게 된 책인데 정말 순식간에 읽어 버린것 같다. 먹고 사는 일이 어느덧 부수적인 느낌으로 변해버린 요즘, 먹는 것이 곧 인생의 한 부분이 될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책이다. 게다가 책의 내용이 각기 다른 네 나라의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결코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는 우리네 인생을 담고 있는 것 같아 좋았던 책이기도 하다.
일본을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4명의 여성 작가가 각각 유럽의 슬로 푸드와 소울 푸드를 찾아서 여행한 그곳을 배경으로 쓴 책이라는 점에서 이 책은 그 나라만의 특수성과 일본이라는 나라의 감성을 느낄수 있는 책인것 같다. 분명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포르투갈을 이야기 하지만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도 일본인 작가이기 때문에 왠지 모르게 그속에서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기 때문이다.
말기 암환자인 어머니의 죽음을 평소 클럽의 모임같은 상황에서 발표하고, 그럼에도 아버지는 요리를 하고 다른 식구들은 그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선 그 일이 결코 축하할 일이 아닌데도 평소처럼 하는 그 상황이 싫어서 가족과 멀어진 아이노아는 자신의 고향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마치 시대에 뒤떨어진 일처럼 느껴진다. 집에서 나와 여행을 하고 그곳에서 밥을 해주면서 살아가던 아이노아는 어느날 난민 캠프 같은 곳에서 음식을 해주지 않겠냐는 제의를 듣고 우연한 기회를 그 길을 택하게 된다.
그렇게 오랜 시간 후에 집으로 돌아 온 아이노아는 그토록 싫어던 고향과 그날의 음식들을 이해하고 자신이 그것을 만들게 된다.


두번째 이야기 <이유>는 많은 나이차가 나는 남자와 결혼한 여자가 뇌출혈로 쓰러진 남편은 병원에 자신은 두 사람의 산속 집에서 살아가는 이야기가 나온다. 의식조차 없는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와 잠을 자기도 하지만 그건 잠깐의 일탈일뿐, 언젠가 남편이 혼자 남겨질 자신에게 가르친것처럼 그렇게 혼자서 집안일을 한다.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이야기는 <블레누아>이다. 지나치게 미신을 믿고, 자신들의 지역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며, 주인공인 장을 인정해주지 않는 어머니와 의절하다시피 하고선 파리로 와서 요리를 하는 이야기이다. 그렇게 부단한 노력으로 결국 유명한 레스토랑의 요리사까지 되지만 자신을 끝끝내 인정해주지 않고 돌아가신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다가 사라라는 여인을 만나서 마음을 나누는 교제를 하고, 둘은 지친 도시 생활을 벗어나 타를 도트(식사를 제공하는 프랑스식 민박)를 운영하고자 약속한다. 그리고 조금씩 느리지만 자신과 사라 두 사람, 친척들, 두 사람이 자리 잡은 마을의 사람들을 도움으로 계획했던 타를 도트 건물을 만든다. 그리고 장은 그 마을의 토속음식을 마을에서 난 재료로 만들고자 하고, 그 재료 중 이제는 재배조차 하지 않는 메밀을 찾게 된다.
과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부모님이 재배했던 메밀밭을 사주셨던 분을 찾아가 아직까지 남겨진 메밀을 발견하고 그 메밀밭과 메밀꽃을 통해서 어머니의 진심어린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 장은 오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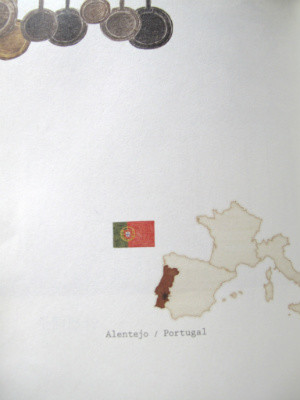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는 포르투갈의 두 게이의 이야기다. 매력적인 모습과 바람기로 루이스 자신을 힘들게 하는 마누엘과의 여행에서 늘 불안했던 마음에서 이제는 조금의 평화를 얻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이 모든 이야기에는 필연적으로 음식이 나온다. 때로는 가족과의 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결국엔 그 음식으로 화해하는 모습은 그토록 싫어했던 것을 이해함을 표현하기에 더욱 의미있게 다가온다. 그렇기에 단순히 먹는다는 의미 이상의 삶의 애환과 희노애락이 담긴 음식 이야기는 한 인간의 인생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아 감동적인 책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