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체의 본성은 이기적이다.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남을 해치기도 한다. 약육강식의 생태계는 그렇게 흘러왔는데 인간도 그리 다릴게 없어 보인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는 남이 어떻게 되던 말던 상관 하지 않는 인간들이 득세하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꼴은 참 보기가 싫다.
이 책을 읽어보며 든 생각은 인간의 도덕이라는 것은 공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다. 옳고 그름이나 도덕적 개념도 어쩔때는 이기적이다. 자신의 집단만이 정의고 다른 집단들은 거짓이며 악이다라는 개념은 특히 종교에서 많이 나타났고, 세상에 이런 저런 분쟁들을 유발시켰다. 과거보다 나아지긴 했지만 현대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큰 문제가 아니더라도 사회에서 개인이 서로 말이 통하지 않고 소통이 되지 않는 사람을 마주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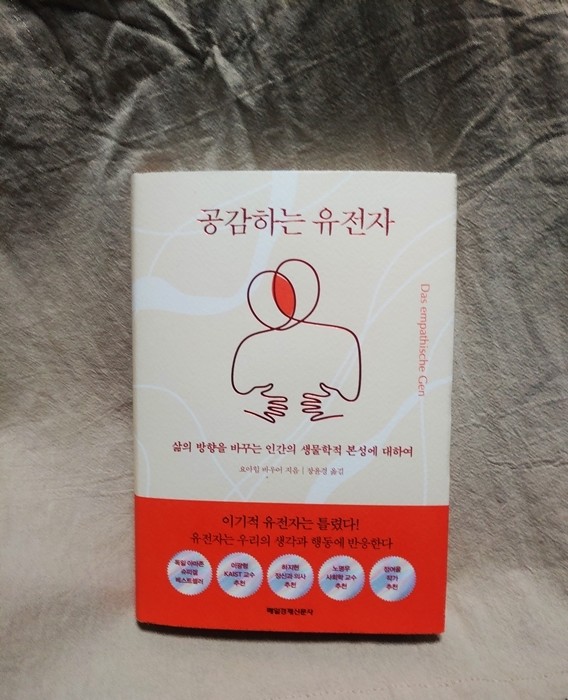
신경과학자이자 정신과 의사이기도 한 저자 요아힘 바우어는 공감의 과학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 공
감력은 인간이 생존하는데 큰 역할을 했으며 타고난 능력이기도 하다는 비슷한 이야기를 전에도 읽은 적이 있는데, 이 책이 조금 더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듯했다.
인간은 협력하고 공존함으로서 신체적으로 약하다는 단점을 딛고 생존해 왔는데, 현대에와서 그러한 능력이 더더욱 필요해졌다.
인간의 유전자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반응하고 활동을 하며 공공의 이익과 목적에 부합된다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과학적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 그저 철학등에서 이야기 하듯이 주장이 아닌 검증된 방식의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설득력이 있고 와닿았다. 인문학을 과학으로 증명하는 이야기라고나 할까?
과학이나 철학이나 결국 인간과 세상에 대한 탐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슷한 점이 많게 느껴진다. 과거의 철학자들에 비해 최근의 철학자들은 오히려 희망이 없음을 이야기 하는데, 과학자들이 오히려 인문학적 희망을 이야기 하고 있다는 자체가 참 재미도 있었다.
좋은 삶이란 무엇일까? 쇼셜 게노믹스라는 개념을 저자는 이야기 하고 있다.
그리 어렵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과학이 이야기 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증명이 되었듯이 인류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협력을 해야 한다. 개개인이 하나하나 전부 협력을 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함께 하는 생존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시기가 된 것이다. 이런 시기에 어떤 자들은 비관적이고 어떤 자들은 낙관적으로 보는데 낙관적인 쪽으로 보는 것은 희망이요 비관적인 것도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라 피드백으로 삼아 문제점을 극복하는 것도 비관의 낙관적인 쓰임이라는 생각도 해보게 된다.
목적과 의미가 있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느낄 것이다. 인간은 목표지향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그저 살아남고 내 유전자를 전달하는 것이 목표였다면 현대에는 생존률이 과거 인류에 비해 크게 올라갔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다. 문제에 정답은 없지만 자신만의 답은 있는 법. 그 답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 책을 읽어본다면 후회 없을 것이다.
[이 책은 네이버 문화충전 카페의 소개로 서적을 제공받고 자유롭게 작성한 리뷰임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