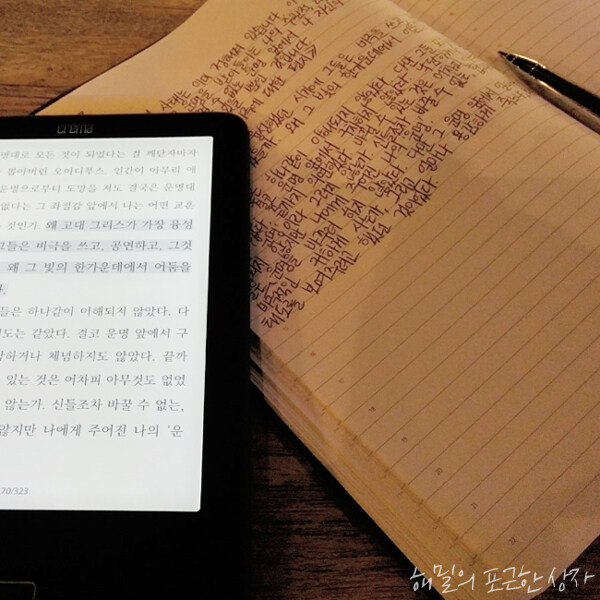
왜 고대
그리스가 가장 융성했던 시기에 그들은 비극을 쓰고, 공연하고, 그것에 열광했을까.
왜 그 빛의
한가운데에서 어둠을 상상했던 것일까.
비극의 주인공들은 하나같이 이해되지
않았다. 다만 그들 모두의 태도는 같았다.
결코 운명
앞에서 구차하지 않았다. 낙담하거나 체념하지도 않았다. 끝까지 의연했다.
바뀔 수
있는 것은 어차피 아무것도 없었다. '운명'이라 그러지 않는가.
신들조차
바꿀 수 없는, 합리적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나에게 주어진 나의 '운명'.
그들은 비극적인 운명을 바꾸려 하지
않았다.
다만 그
운명 앞에서 얼마나 고귀하게 사는가, 그리고 얼마나 용감하게 죽느냐,
라는 태도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었다.
- 김민철, 《모든 요일의
기록》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