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끔은 까칠하게 말할 것 - 착한사람들을 위한 처방전
후쿠다 가즈야 지음, 박현미 옮김 / MY(흐름출판) / 2015년 9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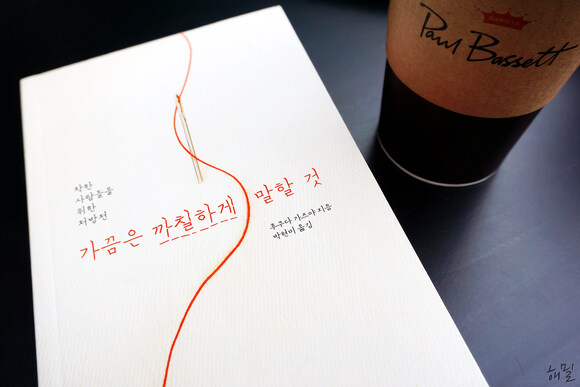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주변에서 당신을 의식하도록 적당한
긴장감을 유지해야 합니다.
방심하게
만들어서 경계심을 풀게해야 하는 상대도 있지만,
보통은
적당하게 경계하도록 만드는 편이 좋습니다.
이
사람에게 바보 같은 말이나 행동을 하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 같다,
창피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인상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p.41)
이 구절을 읽는데 영화
<부당거래>
속
류승범의 대사가 떠올랐다.
‘호이가
계속되면 둘리인 줄 알아요’라며
농담 삼아 바꿔 이야기하곤 하는 그 대사.
여기서
‘호의’는
비단 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데,
그
중에서도 ‘말’을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되는 건 왜일까.
그건
아마도,
말의
영향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누군가에게
어떤 부탁을 받았을 때,
그
부탁을 수락하는 것도 거절하는 것도 결국에는 말로 이루어진다.
나로
예를 들자면 이러하다.
부탁을
승낙했을 때,
내가
감수해야 할 일이 얼마나 고될지 알면서도 거절하는 그 한 마디를 못해서 승낙할 때가 많았다.
또
이런 경우.
누군가
나에 대해 한 말에,
나를
무시하는 뉘앙스가 녹아있음을 알면서도 왜 말을 그렇게 하느냐고 한 마디를 못해서 우물쩍 넘길 때도 많았다.
집에
오면 왜 그때 그 말을 못했을까,
하고
후회하면서도 매번 그랬다.
나쁘게
말하자면 미련한 거고,
좋게
말하자면 가끔이라도 까칠하게 말하는 기술을 모르는 사람이다.
앞서 소개한 구절은 이 책
『가끔은
까칠하게 말할 것』
속
한 구절이다.
‘착한
사람들을 위한 처방전’이라는
게 이 책의 부제인데,
개인으로
‘착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보며 많이 찔렸다.
착한
건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표현이니 둘째치더라도,
영악하지
못한 사람 혹은 답답한 사람을 에둘러 표현하는 것만 같아서.
절대적으로
후자에 속하는 나로서는 위 구절을 비롯해 여러 구절을 읽으면서 공감했지만,
이
책의 모든 부분이 공감이 갔던 건 아니다.
개인적으로는,
8부
‘낯선
사람을 만난다는 스릴’이라는
글이 특히 그랬다.
이
글에서는 인터넷상에서 ‘닉네임’을
두고 신랄하게 비판하는데,
닉네임
사용의 부정적인 예만을 떠올리고 글을 쓴 게 아닐까 싶었다.
닉네임,
다시
말해 익명성으로 인한 여러 문제는 여전히 벌어지고 있지만 아닌 경우도 많다.
10년
가까이 블로그를 해오면서,
나는
내 닉네임에 대한 막중한 책임과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또,
오프라인에서
만날 기회가 생겼을 때 닉네임은 그 사람의 이름을 대신하곤 한다.
자신을
타인에게 드러내는 일을 안이하고 어리석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많은데,
책의
방향성 때문인지 이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처럼 쓰인 것 같아 아쉬웠다.
이 책을 읽는다고 해서 할 아침에
까칠하게 말할 수 있으리라 믿었던 건 아니지만,
수확
아닌 수확은 있었다.
바로,
반성이었다.
나를 돌아보면 늘
그랬다.
때때로
까칠하게 말하는 것은 결국 나에게 좋은 일인 것일텐데,
문제는
그 긴장감을 상대가 아닌 내가 더 부담스러워 했다.
겉으로
표현하진 않지만,
속으론
쩔쩔매고 그래서 더 문제였다.
혼자
마음 고생하고 나면 ‘그래,
이게
내 성격이겠거니-’
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호이’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다가
깨달았다.
아,
결국
상대를 둘리로 만든 것은 나였구나.
그래놓고
둘리인 줄 안다며 혼자 열을 냈구나 하고.
착한사람 콤플렉스를 벗어나게 해주는
고수의 대화법을 읽고 나서도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한 건,
둘
중 하나다.
영악하지
못한 사람도 못 되는 답답한 사람이거나 아직 그럴만한 대화를 할 기회가 없었던 것.
아니,
대화에
있어서 고수가 되지 못해도 좋다.
내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고,
나
역시 귀 기울여 들어주고 싶은 상대가 한 명이라도 곁에 있다면 나는 그걸로 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