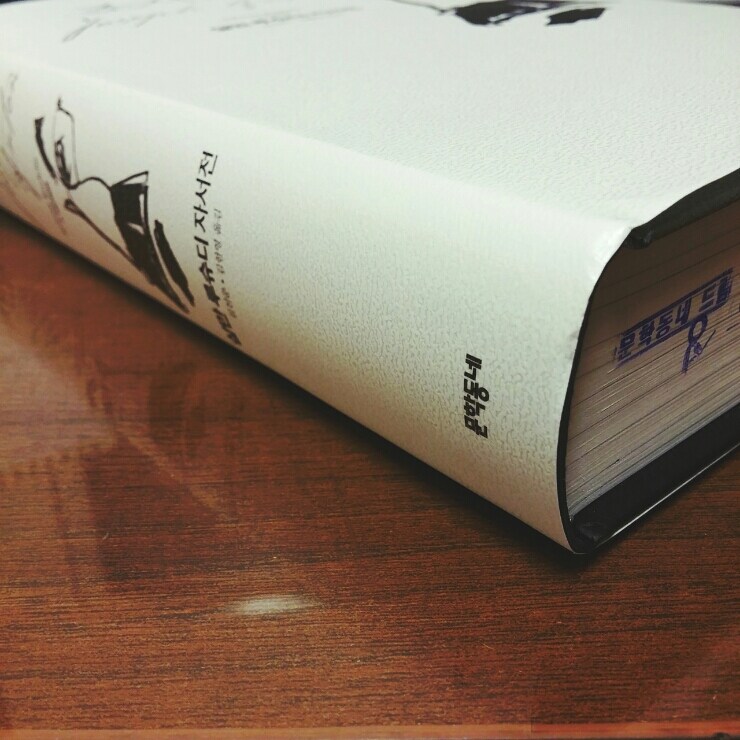
허허... 어쩐지 무겁다 싶더라니. 824쪽, 1240g, 양장.
총균쇠보다 무겁고 쳇 베이커 전기보단 가벼운 무게.
(쳇 베이커 전기, 정말 무거운 책이구나...)
*
1988년 한 편의 소설이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놓았다. 바로 살만 루슈디의 <악마의 시>였다. 이 책은 이슬람교의 탄생 과정을 도발적으로 묘사해 출간 즉시 격렬한 논란을 불렀고, 급기야 1989년에는 이란의 지도자 호메이니가 이 책을 "이슬람에 대한 모독"으로 규정해 작가를 처단하라는 종교 칙령(파트와)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영국 정보부와 경찰의 경고에 따라 루슈디는 기약 없는 도피생활에 들어갔고, 그사이 <악마의 시>와 관련된 출판인, 번역가, 서점, 도서관이 연이어 테러를 당했다. 살해 위협 속에서 자신과 작품을 지키기 위해 루슈디는 그야말로 사투를 벌였다. '조지프 앤턴'은 루슈디가 도피생활을 시작하며 경찰의 권고로 지은 가명이다. 존경하는 작가 조지프 콘래드와 안톤 체호프의 이름을 조합한 것이다. 루슈디는 작품을 발표하거나 기고할 때는 여전히 '루슈디'였지만 은신처에서 신분을 감추고 지낼 때는 '앤턴 씨' 또는 '조'로 불리는 이중생활을 했다. 루슈디는 무장 경찰에 에워싸여 살던 그 시절을 "감옥에 갇힌 기분"이었다고 회고한다.
2002년 '조지프 앤턴'에서 '살만 루슈디'로 돌아온 작가는 한동안 "컴컴한 과거에 셔터를 내리고 새로운 일들만 생각하고 싶었다"고 한다. 하지만 루슈디는 한 편의 소설이 부른 그 엄청난 사건을 극화하려는 상업적 시도에 끊임없이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그는 그 시절을 언젠가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겠다고 고집하며 모든 제안을 물리쳤고 마침내 2012년, 영국 정부의 신변보호에서 벗어난 지 10년 만에 회고록 <조지프 앤턴>을 발표했다.
그는 "이제야 말할 준비가 되었다"고 소감을 밝히며, "스릴러이자 한 편의 서사이며 정치적 에세이이자 사랑 이야기이고 자유에 대한 송가"인 이 책을 완성해냈다. 20세기 문학사상 가장 위험한 책이 돼버린 <악마의 시>의 집필 계기와 작품을 둘러싼 논란,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투쟁한 13년의 기록을 <조지프 앤턴>에서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다.
*
살만 루슈디의 한밤의 아이들을 사두고 아직도 읽지 못했는데, 이 책은 언제 읽을까 싶다.
물론 읽고 글을 써야하니까 어떻게든 읽겠지만...
중혁 작가님이 쳇 베이커 전기를 무슨 마음으로 읽으셨을지 상상이 간다.ㅎㅎ
소개만 읽어도 흥미로운 책인건 알겠는데, 내가 읽을 수 있을까 싶은 마음은 지울 수 없음...
그래도 마음 먹기에 달렸으니까, 이왕 읽게된 거 재밌게 읽어봐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