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독약 - 프랑수아즈 사강의 환각 일기
프랑수아즈 사강 지음, 권지현 옮김, 베르나르 뷔페 그림 / (주)태일소담출판사 / 2013년 6월
평점 :

품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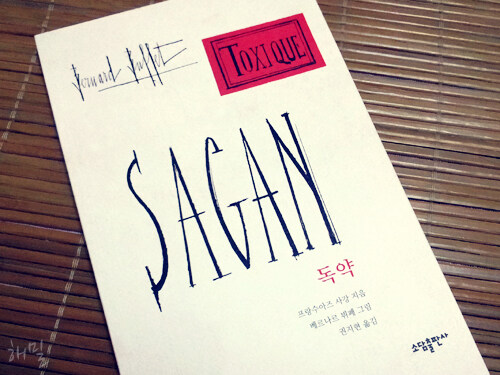
올해, 『길모퉁이 카페』로 처음 만난 프랑수아즈 사강. 나에게 있어서는 그녀의 두 번째 책이었던 『독약』. 1957년 여름, 교통사고를 당한 사강은 석 달 동안 불쾌한 통증으로 인해 ‘875(팔피움)’라는 모르핀 대용약제를 매일 처방받게 되었는데, 석 달 뒤에는 약물중독 증세가 심해져 결국 전문 의료 시설에 입원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입원 기간은 짧았으나 그때, 사강은 일기를 썼고 그 일기를 바탕으로 묶인 책이 바로 『독약』이다.
‘프랑수아즈 사강의 환각 일기’라는 부제답게, 그녀의 일기는 확실히 ‘환각’의 그 어디쯤에서 쓰인 일기임은 확실하다.
결국 간호사는 수간호사를 불렀고(아주 좋음), 나에게 그걸 줬다(앰풀). 하지만 더 이상 이렇게 학대받고 싶지 않다. 다른 방법이 있으니. 통증은 나를 작아지게 한다. 그리고 두려움을 갖게 만든다. (p.3)
일기에서 환각 속을 헤매는 그녀가 느껴졌다기 보다는, 환각 속에서 벗어나려는 그녀의 몸부림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또, ‘나는 나를 감시한다’거나 ‘나는 다른 짐승을 감시하는 짐승’이며 그 짐승은 ‘내 안에 있는 짐승’이라 표현하지만, 그녀는 글을 쓰고 책을 읽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말마따나 ‘나 자신과 함께 살지 않은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자에 팔베개를 하고 비스듬히 누워, 골똘히 생각에 잠긴 채 담배를 입에 문 건강한 작가의 건방진 자세로 마지막 문장들을 고민하는 나를 발견하게 놀란 참이다. (p.18)
약물의 포로가 되었음에도 여느 날의 사강이 그러했던 것처럼 글을 쓸 때 나오는 그녀만의 자세로 마지막 문장들을 고민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기까지, 그녀는 얼마나 노력했을까. 독약뿐만 아니라 독약과도 같은 고독, 독약과도 같은 욕망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사강의 의지. 어쩌면 그 의지는 사강에게 있어 ‘본능’이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런 상황에서 글을 쓰고―일기일지라도―, 보들레르와 샤토브리앙과 아폴리네르와 랭보를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 그 아무리 글 쓰는 것이 천직인 작가라 할지라도 말이다.
이 작은 해독일기는 여기에서 끝난다. 중독치료는 가벼웠고 일기는 유익했다. (p.7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고 쓰려고 했던 그녀의 의지가 약물중독의 늪에서 그녀를 벗어나게 하는 힘이 되었을 것이다. ―훗날, 마약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는 그녀이지만― 또, 그녀의 말마따나 교훈적인 혹은 교훈적이지 않은 마지막 문장을 찾아내지는 못했지만, 그녀는 ‘삶을 살아가고 글을 잘 쓸 것’이라 다짐 할 수 있었다. 고통을 잊기 위해 약물을 투여하고, 그 약물로 인한 고통 때문에 또다시 다른 약물에 의존해야만 했던 그 지독히도 불행한 아이러니 속에서 말이다.
p.s. 사강의 일기가 더 와 닿을 수 있었던 건, 그녀의 글과 묘하게 닮은 베르나르 뷔페의 그림 덕분이었고, 거칠고 날카롭기 짝이 없으며, 창백하고 여윈 뷔페의 그림은 사강의 글로 인해 더 쓸쓸해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