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겠지
1
세상에 나온 날이 가장 늦은 책부터 읽어나가겠다고, 어느새 가득 차 있는 책장을 보며 생각했다. 새 책장을 들여놓은 게 2월쯤이었나. 품도 충분하고 깊이도 있어 책을 두 줄로 꽂아도 낙낙한 녀석이었지만…….

마음속에 약간의 성의만 있다면 아무리 난리 속이라도 반드시 진보할 수 있는 법이다. 너희들은 집에 책이 없느냐? 몸에 재주가 없느냐? 눈이나 귀에 총명이 없느냐? 어째서 스스로 포기하려 하느냐? 영원히 폐족으로 지낼 작정이냐? 너희 처지가 비록 벼슬길은 막혔어도 성인(聖人)이 되는 일이야 꺼릴 것이 없지 않느냐? 문장가가 되는 일이나 통식달리(通識達理)의 선비가 되는 일은 꺼릴 것이 없지 않느냐?
_ 정약용,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2
돈을 벌기 전에는 돈만 벌면 책을 잔뜩 살 줄 알았는데 막상 돈을 벌어보니 책을 사는 데 진짜로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시간이었다. 시간이 없으면 욕구도 없다. 시간과 인간이 이렇게도 유기적인 관계로구나 싶은 요즘이다.

우리는 왜 이렇게 오래, 열심히 일하는가? 그래야만 하는 이유, 일을 하는 데 그렇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는 게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이유만이 신기한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이런 상태에 맞서 더욱 적극적인 저항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신기하다.
_ 케이시 웍스, 『우리는 왜 이렇게 오래, 열심히 일하는가?』
3
세상은 이제 더는 봄을 무시할 수가 없을 만큼 봄이다. 사무실 안이 훨씬 춥다. 공무원들은 점심시간을 최대한도로 사용하여 청사 앞뜰에서 광합성을 시도하고 있다. 사람들은 밝은 햇살 아래, 푸른 식물들 사이에, 그리 넓지 않은 벤치에 어깨가 닿을 듯 말듯 붙어 앉아 조잘조잘 이야기를 나눌 때 제일 아름다운 것 같다. 미소가 볕에 녹아 한들한들 봄 공기를 헤엄치다가 KF94 마스크를 뚫고 타인의 들숨에 섞인다. 햇살에 버무려진 웃음은 금세 옮는다. 못 막는다. 그걸 막을 수 있는 필터가 있었다면 코로나 같은 건 진작에 작살이 났겠지.

풍부한 수목은 도로와 보행로를 편안하고 친근한 장소로 만든다. 그러면 보행자들과 이웃들은 자연히 바깥에서 사람들 틈에 섞여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며, 서로 만나는 횟수도 늘어나고 서로 대화의 물꼬를 트기도 한결 쉬워진다. 아이들은 실내보다 나무가 있는 거리에서 뛰어노는 것을 좋아한다. 여름이면 우거진 수목이 그늘을 드리워 사람들은 뜨거운 햇볕을 피할 수 있다. 대다수 사람들은 건물의 외벽만 줄지어 있는 거리보다 수목이 있는 거리가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_ 마즈다 아들리, 『도시에 산다는 것에 대하여』
4

노인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책을 읽었다. 그의 독서 방식은 간단치 않았다. 먼저 그는 한 음절 한 음절을 음식 맛보듯 음미한 뒤에 그것들을 모아서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읽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단어가 만들어지면 그것을 반복해서 읽었고, 역시 그런 식으로 문장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반복해서 읽고 또 읽었다. 이렇듯 그는 반복과 반복을 통해서 그 글에 형상화된 생각과 감정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음절과 단어와 문장을 차례대로 반복하는 노인의 책 읽기 방식은 특히 자신의 마음에 드는 구절이나 장면이 나올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도대체 인간의 언어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가를 깨달을 때까지, 마침내 그 구절의 필요성이 스스로 존중될 때까지 읽고 또 읽었다.
_ 루이스 세풀베다, 『연애 소설 읽는 노인』
살다 보면 많은 골목길을 만나게 되고, 골목길을 지날 때는 그 골목의 길이와 폭과 밝기에 걸맞은 읽는 법이 있겠다. 어떤 날 어떤 분위기 속에서 어떤 기분으로 읽은 한 구절이, 버릴 것 없는 백만 단어로 채워진 두꺼운 책 한 권보다 멋진 독서의 경험을 안겨주기도 하는 것. 그저 그렇게 믿고 끝까지 읽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협소하고 조도 낮은 골목길을 지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일지도 모른다. 한 권이 힘들면 한 쪽을, 한 쪽이 어려우면 한 문장을, 그마저 벅차면 하나의 단어라도 오래도록 질겅질겅 씹으며, 읽기의 턱 근육을 만들어가며 언젠가 반드시 찾아올 골목길의 끝점을 기다리는 것.
좋은 날, 오겠지.
--- 읽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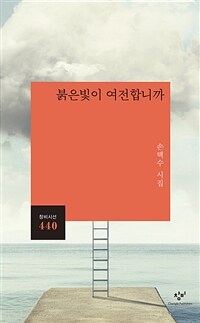
39. 붉은빛이 여전합니까 / 손택수 : 67 ~ 132
그 볼에 내 볼을 맞대고 있던 그때 우리가 우리의 두 볼에 봄볕처럼 번져나가던 붉은빛이 붉은 줄을 깨쳐 알았더라면. 붉은빛은 지나간 기억 속에서 더욱 붉은 옷을 입고 깃발처럼 다시는 잡을 수 없는 손을 내밀어 오늘을 흔드는데, 붉은 줄 모르고 붉은빛을 만지던 어제의 우리는 그저 붉은빛의 안부를 묻는 것밖에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는 오늘의 우리가 되었습니다.
--- 읽는 ---

사랑 밖의 모든 말들 / 김금희 : ~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