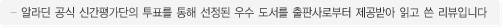[음식 그 두려움의 역사]를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음식 그 두려움의 역사]를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

-
음식 그 두려움의 역사
하비 리벤스테인 지음, 김지향 옮김 / 지식트리(조선북스) / 2012년 8월
평점 :

절판

사실, 사람에게 와닿는 진정한 공포는 음식이 아닐까 생각한다. 전쟁, 기아, 살인, 질병 등 세상에는 수많은 공포가 있지만, 풍요로운 현대에 사는 사람에게 가장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공포는 음식이다. 사람의 입 속으로 들어가는 수많은 음식들은 가장 가깝고 현실적이다.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이 어느날 갑자기 우리 몸에 큰 해를 끼친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외면해버린다. 위의 공포들은 내게 닥치지 않을지도 모르는 희박한 가능성을 갖고 있지만, 음식은 오늘 당장 내가 생존을 위해 해결해야하는 문제이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때떄로 음식 파동이 일어나곤 한다. 쓰레기 만두 파동, 불량 단문지 파동, 심지어 미국 소고기 파동까지. 어느날 갑자기 청천벽력처럼 찾아온 식재료들의 불량함이 들통나면서 사람들은 얼마나 경악했던가. 불량하지 않았던 만두, 단무지까지도 불량하게 취급받고 한동안 외면받아야 했다. 조류독감이 유행하며, 닭과 계란을 생산하던 농가가 풀썩 주저 앉기도 했으며, 불량 라면 사건으로 암묵적인 불매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자각없이 섭취한 음식들이 내게 배신을 때렸다고 생각하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곤 한다. 실제로, 우리는 웰빙을 추구하고 나서 나쁜 성분에 극도로 민감해졌으며, 더 비싸고 까다로워도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한 노력을 마다하지 않는다. 이 원초적인 반응에 기업은 민감할 수밖에 없다. 나쁜 성분을 빼고, 좋은 성분을 넣었다고 광고해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하는 말 뿐이다. 사실, 누구도 솔직하게 말해주지 않는다.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 개인의 판단에 맡길 수 있을 뿐. 용감한 전문가가 폭로하지 않는 한, 아무것도 자각하지 못한채로 먹고 먹고 먹는다.
<음식 그 두려움의 역사>에는 이러한 공포의 뒷면에 대해 말한다. 세균, 쇠고기, 우유, 유산균, 비타민, 지방 등. 어떻게 사람들을 공포에 파뜨리거나, 좋은 것이라고 믿게 했는지. 소비자의 인식은 연구하는 과학자의 말이나 기업의 광고에 이리저리 흔들리기 마련.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정보에 의존한채 음식은 공포의 대상이 되거나 경이로운 대상이 되기도 한다.
세균을 옮기는 주범이 파리라고 생각하며, 파리를 잡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하고, 건강식품이었던 우유가 아이를 죽이는 살인범으로 지목되다 극적으로 회생하기도 하며, 지금까지 광고 마케팅으로 쓰이는 메치니코프의 요구르트는 불로장생의 명약이었다가 다이어트 식품으로 부활한다. 우리에게도 뜨거운 감자였던 쇠고기의 유해함은 정치적인 이해와 맞물려 은폐되고 조작되기도 한다. 비타민 열풍이 불고, 때아닌 티아민 논란으로 강화 밀가루가 등장하며, 통밀보다는 하얀 밀가루가 좋다는 선전은 어이없는 이유로 이루어진다. 가공식품이 인간의 몸에 해를 끼친다는 이론은 장수 마을 훈자로 뻗어나가 자연식품에 눈을 돌리게 되는 계기가 된다. 하지만, 이것도 그 마을의 진실은 들여다보지 않은 채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인간의 어리석음에 따라 움직인다.
음식에 대한 두려움은 잡히지 않는 신기루처럼 이랬다 저랬다를 반복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두려움 뒤에 숨겨진 이해관계다. 거대기업들은 환경이 파괴되든,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인체에 유해한 화학약품 등이 후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유해 식품들을 생산해왔다. 지나친 정제와 가공은 음식의 수명은 늘리나, 인간의 건강한 수명은 줄이고 있다. 하지만, 거대 기업과 유착해 있는 정치는 이 위험성에 대해 스스럼없이 방관한다.
음식물들의 유해성이 공표될 때마다, 그것을 막으려는 거대 기업들의 눈물겨운 노력을 안다면 사실 우리의 소비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도 깨닫게 된다.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줄곧 머릿속에 맴도는 의문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라는 것이다. 그들에 대한 뒷 이야기는 들을 만큼 들었고, 어떤 것을 위해 노력한 과학자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만큼 들었는데, 음식에 대한 두려움의 역사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
배후와 실체는 이제 지겹게 들었으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는 게 옳은 것이냐고 묻고 싶다. 정확한 대안이 아니라도, 읽는 이를 행동으로 이끌 수 있는 작은 팁도 찾을 수 없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것이 잘못된 상식인지, 옳은 상식인지에 대한 구별이 불분명하다. 그냥 '음식에 대한 공포의 역사' 그 자체에 대한 책일 뿐.
자료는 넘쳐 기술되었으나, 결론을 찾을 수 없는 이 씁쓸한 뒷맛.
분명, 이러한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을 것이다. 거대 기업들은 아무렇지 않게 유해한 화학 성분을 첨가해 식재료들을 만들어내고 가공할 것이며, 지금도 콜레스테롤과 지방에 대한 공포는 산재해있다.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의 일이다. 이러한 역사를 바탕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작가의 주관적인 의견도 있었으면 좋았을 아쉬운 책이다. 수많은 정보 뒤에는 분노와 짜증만이 남았다. 나쁜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길 바라는 독자의 마음도 조금 헤아려줬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