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략 8년 전, 20대 초반을 갓 넘긴 시점에서 썼던 오래 된 글을 서랍에서 꺼내 다시 이곳에 옮겨 적는다.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새삼 크게 세 가지 분야의 독서에, 곧 전기(傳記), 자서전(自敍傳), 대담(對談) 문학 등 소위 '주변적'이라 분류될 수 있는 글쓰기 장르에 대한 독서에 다시금 집중하고 있는데, 어쩌면 나의 이 모든 글들은 내 미완의ㅡ그러나 동시에 언제나 '미완'의 것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ㅡ자서전을 구성하는 잡설들일 것이라는 하나의 '뼈 아픈' 가설에 생각이 미치게[及/狂] 된다. 예전에 자서전 문학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올랐을 때 일거에 정리해두었던 묵직한 글 뭉치, 그 갈겨쓴 육필(肉筆) 위로, 지금과는 다른 내 육체의 낯선 한 부분이, 뽀얀 먼지와 함께 퇴적되어 있음을 본다. 미래를 '회고'하면서, 그 기록을 남겨둔다.
1) 자서전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 이 물음은 내게 일종의 '사상사적' 물음의 형식으로 다가온다. 자서전이란, 이데올로기가 가장 개인적이고 심층적으로 작동하는 내밀성의 공간, 그 '존재'의 장소를 이탈하면서 동시에 그러한 '부재'의 장소를 구성해주는 글쓰기의 형식이므로. 자서전 연구의 바이블이라 부를 만한 『자서전의 규약(Le pacte autobiographique)』에서 필립 르죈(Philippe Lejeune)은 이렇게 쓰고 있다: "자서전은 무엇보다도 [저자와 등장인물 사이에] 부과된 동일성(identité assumée)을 언표 행위(énonciation)의 층위에서 전제해야 하며, [이와 비교했을 때] 언표된 내용(énoncé)의 층위에서 산출된 유사성(ressemblance)은 완전히 부차적인 문제"라는 것(원서 p.25, 국역본 35쪽, 번역은 일부 수정함, 강조는 원문). 그렇다면 일인칭으로 씌어진 소설의 경우는 어떠한가. 질문의 형식을 보다 정확히 하자면, '나(je)'라고 자신을 밝히고 있는 화자가 자신의 이름을 결코 드러내지 않는 일인칭 소설의 경우는 어떠할까(일인칭은 언제나 삼인칭의 고유명사로 소급되고 환원되며 또한 대체될 수 있다고 하는 르죈의 논의를 따르자면(원서 pp.21-22, 국역본 29-30쪽 참조), 사실 이 경우 문제가 삼인칭 시점의 소설이 된다고 해도 달라질 것은 없다). 다시 말해서, 주인공이 텍스트 안에서 자신을 부르는 고유명사를 한 번도 드러내지 않고 단순히 '나'라고 지칭하는 경우, 이것은 오히려 저자와 주인공의 동일성이 언표 행위의 층위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형태는 아닐까. 이 경우에 있어서 저자와 주인공이 반드시 같을 수는 없으며 그것이 바로 허구의 형식이 갖는 일종의 당연한 '법칙'이라고 말하는 것이 정당한 일인 만큼, 또한 여기서 저자와 주인공이 같다고 생각하는 것 역시 가장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인식'의 형태는 아닐까. 이 가장 '기본적인' 층위에서의 문제는 사실 르죈이 자서전적 글쓰기의 여러 가능한 조합 형태를 제시하면서 "불명확한(indéterminé)" 것으로 분류하고 있는 "규약 부재(pacte=0)"의 상태, 즉 "2b"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원서 pp.28-29, 국역본 41-42쪽 참조). 개인적으로 볼 때, 르죈의 책을 구성해주고 있는 보이지 않는 핵은 바로 이 '규약 부재' 상태로서의 '제로 지점'에 다름 아니라는 생각이다(르죈이 제시하고 있는 분류의 도표(원서 p.28, 국역본 41쪽)에서 바로 이러한 '제로 지점'이 한가운데에 위치한다는 사실은 이 때문에 더욱 의미심장하게 느껴진다). 뒤집어 이야기하자면, 이 역시 개인적인 인상이지만, 르죈은 자서전 장르의 '어느 정도 정돈된' 정의를 위해서 이 부분을 교묘히 뛰어넘었다는 '혐의'를 완전히 씻을 수는 없을 것 같다. 결국 그는 이러한 종류의 텍스트가 속한 장르와 그 독해 방식에 대한 결정이 전적으로 독자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다소 '상대적인'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



▷ Philippe Lejeune, Le pacte autobiographique, Paris: Seuil(coll. "Poétique"), 1975.
▷ Philippe Lejeune, Signes de vie. Le pacte autobiographique 2, Paris: Seuil, 2005.
▷ 필립 르죈, 『 자서전의 규약 』(윤진 옮김), 문학과지성사, 1998.
2) 그러나 이러한 텍스트에 있어서 독자가 그것에 관한 태도를 결정하게 되는 과정에 작용하는 요소는 과연 아무것도 없는가. 그것은 과연 그 자체로 '자유로운' 선택일 뿐일까. 이러한 질문을 통해 겨냥하는 것은, 자서전에 있어서 "아래 서명한 나(je soussigné)"(원서 p.19, 국역본 25쪽), 곧 서명의 문제가 중요한 만큼이나 텍스트의 성격과 장르에 대한 저자의 '선언'이라는 문제 또한 중요한 것으로 부각된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자면, 저자가 자신의 텍스트를 '자서전'이라고 선언할 것인가 아니면 '소설'이라고 선언할 것인가의 문제가 바로 그것. 즉 이는, 저자 스스로가 독자에게 자신이 쓴 텍스트를 어떤 이름으로, 어떤 분류 기준 하에 공표하고 제시하는가에 관련된 텍스트 '외부적인' 문제인 것이다. 르죈도 물론 이 문제에 관해 언급하고 있기는 하다(원서 pp.44-45, 국역본 66-67쪽). 이것은 곧 책의 출간 행위와 그 형식이 자서전 텍스트의 독서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 대한 고찰이다. 그러나 르죈에게 있어서는 고유명사의 문제가 자서전 독서에 있어 보다 핵심적인 쟁점 사항이 되고 있다. 이러한 '선언' 또는 '공표'의 문제는 자서전의 독서 방식에 있어서 서명의 문제보다 더욱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심급에 위치하게 된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그러므로 또한 자서전 장르는 텍스트 '외부'의 문제를 가장 도드라지게 노출하고 있는 문학 장르에 다름 아닌 것.
3) 그렇다면 만약 저자가 소설을 쓰면서 소설을 쓴다는 사실을 '공표'하지 않고 단지 '나의 인생 이야기' 같은 제목을 그 '소설'에 붙인다면 상황은 어떻게 될까. 물론 르죈은 이러한 가정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할 것이다(르죈의 분류법에 따르자면, 이 경우는 자연스럽게 2b의 항, 즉 저자에 의해서 독서의 방식이 방기되어 그 방식을 선택하는 일이 전적으로 독자에게 부여된 상황에 속할 것이다). 그러나 진실성/성실성(sincérité)의 문제가 자서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진실성/성실성은 최종적으로는 바로 이러한 장르의 '선언' 또는 텍스트 성격의 '공표'라는 문제와 항상 결부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 '자서전 문학' 연구의 대가, 필립 르죈(Philippe Lejeune).
4) 그러므로 이러한 논의가 '역설적으로' 가리키는 지점은, 자서전의 문제가 비단 진실성/성실성뿐만 아니라 속임수의 '효과'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라는 사실이다(그러나 르죈은 이 문제를 단순히 문학적 '사기'와 '위조'의 문제로 치부하면서 간단히 넘기고 있다). 왜냐하면, 르죈 자신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서전의 범주에 속하는 것은 "허구(fiction)의 질서가 아니라 거짓(mensonge)의 질서"(원서 p.30, 국역본 43쪽, 강조는 원문)이기 때문이다. 허구의 질서 안에서 진실과 속임수의 구분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거짓의 질서, 더 정확하게는 참과 거짓의 질서가 작동하는 장 안에서만 그 구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결국 자서전의 문제는 현실성(réalité)의 문제가 아니라 진실성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여기서 내가 특별히 방점을 찍고 싶은 부분은ㅡ르죈의 방점과는 반대로ㅡ바로 '허구의 질서가 아니라'는 표현인데, 이것은 곧, 어떤 텍스트에 자서전이라는 형태적 규정을 부여하는 행위가 다른 장르와의 관계 비교라는 작업을 떠나서는 결코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개인적인 생각에서이다. 다시 말해서 자서전이라는 '자기 규정'은, 결코 '독자적으로는' 생각될 수 없는, 곧 텍스트에 대한 '내재적' 분석의 방법으로써만은 해결될 수 없는, 일종의 '제도적' 형식인 것이다. 그러므로 자서전의 문제는 그 자체로서보다는 오히려 소설이나 여타 장르와의 비교 하에서만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것은 '믿게 만들기'의 문제에 다름 아니다.
5) 자서전 안에서는 결국 속임수의 층위가 문제시된다. 자서전을 자서전처럼 보이지 않게 만들 수 있는 이론적으로 가능한 여러 기법들은 르죈에게서와 마찬가지로 나에게도 논외의 대상이다. 문제는 속임수라고 하는 것이 저자의 의도를 벗어난 곳에서 행해질 때, 곧 저자 자신도 '모르는' 속임수가 바로 그 저자 '자신에 의해서' 행해질 때인 것. 즉 의도적으로 짜여진 '믿게 만들기'의 구조와 기법을 그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는 작은 구멍 또는 틈새가 자서전 독해에서는 중요한 지점으로 부각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속임수의 문제는, 그것이 '의식적인' 지점을 문제 삼지 않는다는 점에서, 또한 '무의식'의 문제이기도 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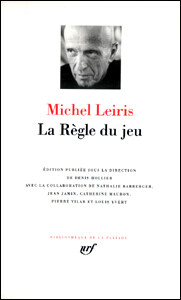
▷ Michel Leiris, L'âge d'homme, Paris: Gallimard(coll. "Folio"), 1973(1939¹).
▷ Michel Leiris, La règle du jeu,
Paris: Gallimard(coll. "Bibliothèque de la Pléiade"), 2003.
6) 덧붙여 둘 것은 『자서전의 규약』 국역본의 문제이다. 대부분 [역자가 생각하기에] '자연스러운' 의역의 방식을 취하고 있어 원문과 다소 뉘앙스 차이가 나는 부분들을 상당수 찾아볼 수 있다. 또한 결정적으로 미셸 레리스(Michel Leiris)의 자서전에 대한 연구 부분을 번역에서 누락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역자는 레리스가 "한국 독자들에게 비교적 생소"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역자 후기, 423쪽), 역자 '자신이' 잘 모르는 부분만을 누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한다. 레리스의 저작들이 어서 국역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ㅡ 襤魂, 合掌하여 올림.
서지 검색을 위한 알라딘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