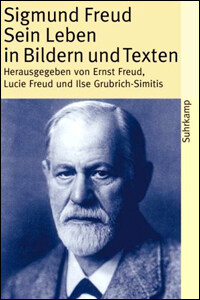
▷ Ernst Freud, Lucie Freud, Ilse Grubrich-Simitis(hrsg.),
Sigmund Freud: Sein Leben in Bildern und Texten,
Frankfurt am Main: Suhrkamp, 2006[revidierte Neuausgabe].
1) 소피아 서점의 백환규 선생님으로부터 며칠 전 이 책(1976년 초판의 개정·증보판)을 선물받았다. 지금껏 혼자서ㅡ누군들 이런 일에 '혼자'가 아니겠는가마는ㅡ고군분투와 악전고투를 거듭해오고 있는 나의 일천한 공부와 빈약한 연구를 묵묵히 응원해주셨던 백선생님인데, 그래서 더욱 '그저 도움이 좀 될까봐' 하고 무심한듯 건네시는 이 선물에 나는 그만 눈물이 핑 돌았다. 한 사람을 오랜 시간 지켜보는 과정이 녹아들어가 있다고 느껴지는 선물에는 언제나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다. 가슴이 찡했다. 벌써 아흔의 나이에 가까워지신 백선생님이 언제나 지금처럼 정정하시고 활달하시기만을 바랄 뿐이다.
2) 소피아 서점은 1950년대에 문을 연ㅡ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내 최고 유일의ㅡ독일어 인문학 서점이다. 내가 스무살 때 백종현 선생님의 소개로 칸트의 『순수이성비판』 독일어본을 처음 구한 곳이 바로 이 서점인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강산이 바뀌고 남을 만큼의 시간 동안 이런저런 '거래'를 계속 해오면서 내가 이 서점에서 입은 '은혜'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서점의 총지배인을 맡고 계신 분이 바로 백환규 선생님인데, 일제시대 일본의 上智대학(소피아대학) 독어과을 나오신 분이다(소피아 서점의 이름은 바로 이 '소피아대학'에서 따온 것인데, 하지만 철학 또는 인문학과 'σοφία'라는 단어가 맺고 있는 저 역사적이고도 상징적인 관계야 굳이 여기서 따로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대학에 다닐 때는 정말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독일어와 씨름하셨다는 추억담을 가끔 이야기하실 때면, 나는 한없이 부끄러워지며 신발끈을 다시 고쳐 매는 심정으로 마음을 다잡곤 한다. 하지만, 여전히, 가도 가도 턱없이 부족한 이 느낌에서는, 아직도, 헤어나올 길이 없다.


▷ Edmund Husserl, Phänomenologie der Lebenswelt. Ausgewählte Texte II,
Stuttgart: Reclam, 1992.
▷ Georg Lukács, Die Theorie des Romans,
München: Deutscher Taschenbuch Verlag, 1994.
3) 조용히 떠올려 보면, 개인적으로 내 공부의 어떤 접점이라 부를 수 있는 시기마다 백환규 선생님으로부터 소중한 선물을 받았던 기억이 있다. 위의 두 책은 바로 그러한 선물들이었다. 한 책은 내가 후설(Husserl)에 빠져 있었을 때, 한 책은 내가 루카치(Lukács)에 젖어 있었을 때ㅡ하지만 이렇듯 과거형 문장을 썼다고 해서 지금 내가 이 두 '거인'들에 대한 애정과 채무감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은 결코 아닌데ㅡ, 각각 백선생님이 주신 선물이었다(특히나 루카치의 저 『소설의 이론』은 내게, 심지어 침대 안까지 갖고 들어가 틈틈이 계속 탐독할 만큼, 딱 그 만큼의 애정과 경배의 대상으로 여전히 남아 있다). 신발끈만 고쳐 매다가 가버린 쏜살 같은 시간들, 누군들 후회가 없을까, 하는 '평등주의적' 위안을 해보지만,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부끄러워지는 것은, 여전히 어쩔 수가 없다. 오직 할 수 있는 일은, 다시 한 번, 신발끈을 고쳐 매는 일, 그뿐일 터.
4) 가끔씩 자신이 '갇혀' 있는 이론의 무게조차 느끼지 못할 정도로 무엇에겐가 짓눌려 있을 때 간과하기 쉬운 것은, 그러한 이론을 품고 굴려갔던 이가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이라는,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사실, 바로 그것이다. 사진과 글로 보는 일종의 프로이트 전기(傳記)라 할 저 소중한 선물을 펼쳐보고 있으면, 프로이트가 한 시대를 말 그대로 치열하게 살았던, 다시 말해, 한 시대와 격렬하게 부딪치고 만났던, 하나의 인간이라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느낌과 관련하여 독서 중 인상 깊었던 한 구절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이것은 프로이트의 삶이 지닌 전경(Vordergrund)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면에서, 그 자신의 나약함과 결점들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둘러싼 씨름 속에서 흔들림 없이 머물렀던 한 인간, 또한 어쩌면 마치 야곱처럼 의기소침과 자포자기 속에서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는다면 나는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라고 부르짖었을 한 인간, 바로 그 인간이 행했던 거인적인 투쟁의 일면을 목격하게 된다."(Sigmund Freud: Sein Leben in Bildern und Texten, p.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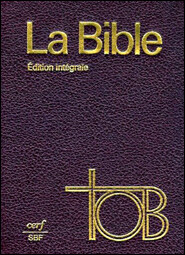
▷ Die Bibel[Luther-Übersetzung],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99.
▷ La Bible[traduction œcuménique de la bible],
Paris: Société biblique française et Éditions du Cerf, 1988.
5) 이 야곱의 '외침'은, 아는 사람은 다 알다시피, 성경에 나오는 저 유명한 야곱과 천사의 씨름 장면에서 나오는 대사, 정확히는 창세기 32장 27절의 내용이다. 다만 국내 개신교 성경에서는 이 부분이 32장 26절로 되어 있는데, 32장이 어디서 시작하는가에 관한 편제의 원칙이 가톨릭과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독일 성서회에서 펴낸 루터(Luther) 번역판 독일어 성경ㅡ그러고 보니 이 성경도 소피아 서점에서 구입했던 것인데ㅡ에서는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옮기고 있다(그리고, 어쩌면 당연하지만, 위에서 인용한 프로이트에 대한 '평가'에 나오는 해당 문장도 이와 동일하다): "Ich lasse dich nicht, du segnest mich denn." 불어 번역 성경에서는 같은 문장을 다음과 같이 옮기고 있다: "Je ne te laisserai pas, répondit-il, que tu ne m'aies béni." 아직 히브리어 공부가 일천하여 정독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예전에 성 바오로 서원에서 구입했던 히브리어 구약의 표지도 함께 올려본다.

▷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97[5. Auflage].
6) 이렇듯 선물이라는 물건에 생각이 미치자, 그리고 다시 이 물건에 꼬리를 무는 다른 연상들에도 생각이 미치자, 어머니의 선물보다 더한 선물이 있을까, 나는 새삼 이런 생각에까지 미치게 되는 것이다(물론, '미치다'의 두 가지 의미ㅡ'reach'/'go mad'ㅡ에서). 일전에 독일 여행에서 돌아오시면서 자식 생각에 사오신 헤르만 헤세(Hermann Hesse)에 관한 이 한 권의 책, 이 역시 프로이트에 대한 위의 책과 마찬가지로 '그림으로 보는 그이의 삶'이라는 형식을 갖고 있음에, 새삼 기이하고 경이롭기까지 한 느낌이 든다. 삶이라는 형식 혹은 삶을 펼치듯 보여준다는 형식, 이는 실로 '선물'이라는 이름에 값하는 형식이 아닌가.

▷ Volker Michels, Hermann Hesse: Leben und Werk im Bild,
Frankfurt am Main: Insel, 1973.
7) 프로이트와 마찬가지로, 헤세 역시ㅡ그 어떤 글쓴이들이 그렇지 않겠는가ㅡ살과 피를 가진 인간이었다는, 굳이 호들갑 떨 필요도 없이, 너무도 당연하고, 지극히 당연하며, 지독하리만치 당연한 이 사실 앞에서, 나는 이렇듯 기이하게 훈훈한 경이감, 이상하리만치 따뜻한 기이함을 느끼고 있다. 그리하여, 반복하지만, 한 인간을 이해하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또 얼마나 고귀한 일인가, 하는 생각, 그리하여 또한, 훌쩍 비약하자면, 한 인간이 세상에 나고 사라짐은, 언제나, 얼마나 매혹적인 일이고 또한 얼마나 슬픈 일인가, 하는 생각, 그런 잡생각 한 자락을, 보이지 않는 신발끈 위에, 슬며시 내려놓는다.
2007. 6. 23.
ㅡ 襤魂, 合掌하여 올림.
서지 검색을 위한 알라딘 이미지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