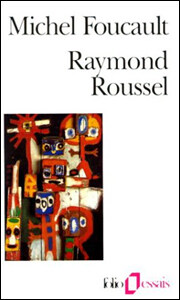
▷ Michel Foucault, Raymond Roussel, Paris: Gallimard(coll. "Folio essais"), 1992.
1) 푸코(Foucault)가 남긴 문학 관련 글들의 양은 다른 철학자에 비해ㅡ푸코가 '순수한' 철학자인가 하는 '곁가지의 중대한'(일종의 형용모순?) 질문은 차치하고라도ㅡ상당히 많은 편에 속하지만, 단행본으로 출간된 글은 오직 이 한 권, 레이몽 루셀(Raymond Roussel)에 관한 책뿐이다(초판은 1963년). 사실 이 책은 푸코의 다른 저작들보다 상대적으로 '부당하게' 낮은 평가와 주목을 받아온 책이라고 할 수 있다. 푸코의 거의 모든 저작들이, 이른바 '지적 유행'이라는 몇 겹의 물결을 거쳐, 그리고 수정에 수정을, 재판에 재판을 거듭하며 국역되어 있는 현재 시점에서도 이 책만이 거의 유일하게 번역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이 그에 대한 방증이라면 방증이겠다. 그렇다면, 왜ㅡ푸코에게 있어 오히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작가들이라고 할 수 있을 바타이유(Bataille)도 아르토(Artaud)도 아닌ㅡ하필이면 루셀인가? 그런데 이 단순해 보이는 질문은 예상 외로 많은 담론의 지형들을 드러낼 수 있는 물음이라는 것이 나의 개인적인 생각이다. 내 일천한 독서 경험으로 볼 때 이 질문에 대한 나름의 답변을 제시하며 푸코의 사상적 궤적 안에서 이 책이 차지하는 위상을 평가하고 있는 이는 그리 많지 않은데, 그 대표적인 논자로는 두 사람의 철학자, 곧 들뢰즈(Deleuze)와 마슈레(Macherey)를 거론할 수 있겠다.



▷ Critique, n° 229, juin 1966, Paris: Minuit.
▷ Michel Foucault, La pensée du dehors, Montpellier: Fata Morgana, 1986.
▷ Michel Foucault, Dits et écrits, tome I: 1954-1969, Paris: Gallimard(coll. "Bibliothèque des sciences humaines"), 1994.
2) 물론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푸코의 문학 관련 단행본으로는 사실 한 권의 책이 더 있긴 하다. 모리스 블랑쇼(Maurice Blanchot)에 대한 책인 『바깥의 사유(La pensée du dehors)』가 바로 그것이다. 푸코의 문학론을 논하는 데에 있어서 바타이유에 대한 글과 함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글로서, 그리고 블랑쇼의 문학론 자체에 대한 탁월한 입문서이자 해설서로서, 일독을 권한다. 하지만 이 글은 원래 블랑쇼에 관한 특집호로 간행되었던 『비평(Critique)』지의 229호(1966년 6월)에 처음 실린 것으로서(나중에 이 글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고 할 푸코의 학문적 일생 동안 축적된 논문과 인터뷰들을 집대성한 책 『말과 글(Dits et écrits)』(전 4권)의 1권에 다시 수록되는데, 이 책에는 『레이몽 루셀』의 근간을 이루는 글 「레이몽 루셀의 작품에 있어서 말하기와 바라보기(Dire et voir chez Raymond Roussel)」와 『레이몽 루셀』 출간 이후 「르 몽드(Le Monde)」에 기고한 관련 글 또한 수록되어 있다), 이 글이 파타 모르가나(Fata Morgana) 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된 해가 푸코 사후인 1986년이었던 것으로 미루어볼 때, 푸코 자신이 이 글을 단행본으로 출간할 의지가 『레이몽 루셀』에 비해 더 확고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글에서 논의되는 블랑쇼의 많은 주제어들ㅡ예를 들어 '체험(expérience)', '문학적 공간(espace littéraire)', '바깥(dehors)', '밤(nuit)', '공백/공허(vide)', '위반(transgression)' 등ㅡ이 바타이유적인 주제들과 공명하고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겠지만, 특히 5장에서 자세히 서술되고 있는 블랑쇼[또는 카프카(Kafka)]의 '법' 개념이 벤야민(Benjamin) 또는 데리다(Derrida)의 법에 관한 논의와 만나게 될 '어떤' 접합의 지점을 찾아보는 작업도 매우 흥미로울 것이다.


▷ 김현(編), 『 미셸 푸코의 문학비평 』, 문학과지성사, 1989.
▷ 김현, 『 폭력의 구조/시칠리아의 암소 』(김현 문학전집 10권), 문학과지성사, 1992.
3) 푸코의 「바깥의 사유」 번역은, 예전에 김현 선생의 편집으로 불문과 출신 여러 역자들의 번역을 통해 출간되었던 『미셸 푸코의 문학비평』에 수록되어 있다. 번역에는 몇몇 수정할 사항들이 보이지만 그리 큰 무리 없이 읽어내려갈 수 있다. 일독을 권한다. 또한 푸코에 관한 김현 선생의 독립적인 연구서로는 「시칠리아의 암소」를 들 수 있겠는데, 이 글은 예전에 문학과지성사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된 적이 있었지만 현재는 김현 문학전집 10권에 르네 지라르(René Girard)에 관한 연구와 함께 수록되어 있다. 물론 김현 이후 그간 푸코에 대한 소개와 연구는 이 화면을 통해 다 소개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방면에서 상당수가 이루어져 왔다. 조만간 나남 출판사에서 간행 예정으로 알고 있는 오생근 선생의 푸코 연구서는 고대하고 있는 책들 중의 하나.
4) 푸코의 루셀論에 대한 마슈레의 글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들 수 있을 텐데, 하나는 일전에 소개했던 그의 문학론집 『문학은 무슨 생각을 하는가?』에 수록되어 있는 글 「루셀의 독자 푸코: 철학으로서의 문학(Foucault lecteur de Roussel: la littérature comme philosophie)」이고, 다른 하나는 위의 책 『레이몽 루셀』 문고판(1992)의 도입에 수록된 해설(présentation)이다. 이 두 글의 기본적인 논지는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는데, 마슈레의 '해설'에서 이러한 논지를 가장 압축적으로 서술한 문장을 하나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이 문장[언어와 (문학적) 공간에 관한 푸코의 문장]은 바타이유와 블랑쇼가 표명하였던 요구, 곧 문학을 전통적으로 문학이 귀속되어 있던 예술의 영역 밖에 위치시키고 또한 문학을 사유의 대표적 형식들 중의 하나로 자리 매김하면서 문학을 진지하게 다룰 것에 대한 요구를 명확하게 정식화하고 있다."(pp.xiv-xv) 곧 마슈레에게 있어서 푸코의 루셀론이 갖는 궁극적인 의미는 '문학의 철학화' 또는 '하나의 사유 형식으로서의 문학'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마슈레는 이러한 푸코의 '철학화된' 문학론이 바타이유의 '체험' 개념과 블랑쇼의 [문학적] '공간' 개념을 배경으로 탄생할 수 있었던 영향사를 간략하게나마 잘 정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마슈레는 『광기의 역사』와 『말과 사물』 사이에서 이러한 푸코의 루셀론이 수행하고 있는 이론적 '가교' 역할에 대해서도 설득력 있는 논의를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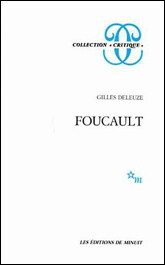

▷ Gilles Deleuze, Foucault, Paris: Minuit(coll. "Critique"), 1986.
▷ Michel Foucault, Dits et écrits, tome II: 1970-1975, Paris: Gallimard(coll. "Bibliothèque des sciences humaines"), 1994.
5) 아마도 들뢰즈는 푸코의 루셀론이 갖고 있는 중요성을 그 누구보다도 일찍이 간파한 철학자들 중의 한 사람일 것이다. 들뢰즈가 푸코에 대해 '들뢰즈의 방식'으로 쓴 위의 책은 아마도, 1970년에 푸코가 또한 들뢰즈에 대해 「철학의 극장(Theatrum philosophicum)」이라는 글을 썼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에게는 특히나(이 글은 푸코의 『말과 글』 2권에 수록되어 있다), 두 사람 사이의 묘한 우정과 교류에 관한 일련의 기록들 중의 하나로 읽힐 수도 있을 것이다. 더욱이 들뢰즈가 푸코의 루셀론을 푸코의 대표적인 개념어들인 언표(énoncé)와 가시성(visibilité)의 관점에서 인용하고 분석하고 있는 부분(pp.59-65)은, 마슈레와는 조금 다른 의미 맥락에서 수행된 푸코 루셀론에 관한 자리 매김이라는 점에서, 일독을 요하는 중요한 글이다. 이 책의 국역본은 예전에 마그리트(Magritte)의 그림을 표지로 해서 한 번 출간된 바 있고ㅡ출판사는 기억나지 않는다ㅡ현재는 동문선 출판사의 판본으로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역본은 소장하고 있지 못한 관계로 번역의 질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 Alain Robbe-Grillet, Pour un nouveau roman, Paris: Minuit(coll. "Critique"), 1963.
▷ 로브그리예, 『 누보 로망을 위하여 』(김치수 옮김), 문학과지성사, 1981.
6) 푸코의 루셀론이 국역되어 소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는, 레이몽 루셀의 작품이 국내에 단 한 편도 제대로 번역되고 있지 못하다는 사정도 한몫하고 있다. 오래 전부터 국내에서 그 소설보다는 오히려 '누보 로망'에 대한 비평으로 먼저 많은 주목을 받았던 로브-그리예(Robbe-Grillet)의 유명한 비평집 『누보 로망을 위하여(Pour un nouveau roman)』(이 책은 푸코의 『레이몽 루셀』이 출간된 때와 같은 해인 1963년에 간행되었다)에는 원래 레이몽 루셀에 관한 비평이 한 편 실려 있었지만, 1981년에 출간된 김치수 선생의 국역본에서는, 루셀의 작품이 국내에 잘 알려져 있지 않아 그 비평적 근거와 자료가 희박하다는 이유로, 그 번역이 누락되었던 바 있었다. 이와 비슷한 '적극적인 배려'의 편역 사례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말이 나온 김에 그 중 대표적으로 아쉬운 사례를 하나만 들어보자면, 필립 르죈(Philippe Lejeune)의 『자서전의 규약(Le pacte autobiographique)』 국역본(윤진 옮김, 문학과지성사, 1998)에서 미셸 레리스(Michel Leiris)에 관한 장의 번역이 누락되었던 예가 떠오른다. 현대의 자서전 문학 혹은 '자기에 대한 글쓰기' 영역에서 레리스가 점유하고 있는 중요한 위치를 생각해볼 때 이러한 누락은 실로 안타깝다고 말할 수 있을 텐데, 해당 작가 작품의 직접적인 번역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그에 대한 주요 비평들이 먼저 번역됨으로써 해당 작가/작품의 이해와 번역을 향한 예비적인 길을 놓아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특히나 이러한 '과도한 배려'로서의 누락은 반갑기는커녕 참으로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 Michel Foucault, Histoire de la sexualité, tome 2: l'usage des plaisirs, Paris: Gallimard(coll. "Bibliothèque des histoires"), 1984.
▷ Michel Foucault, Histoire de la sexualité, tome 3: le souci de soi, Paris: Gallimard(coll. "Bibliothèque des histoires"), 1984.
▷ Michel Foucault, L'herméneutique du sujet, Paris: Gallimard/Seuil, 2001.
7) 내 생각에 푸코에 관한 마슈레의 논의에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점이 있다. 문학적 '존재론'의 문제는 푸코에게 있어서 바로 문학적 '윤리학'의 문제를 수반한다는 명제가 바로 그것(À quoi pense la littérature?, p.190 참조). 이는 무슨 뜻으로 이해해야 할까? 푸코는 『성의 역사(Histoire de la sexualité)』 1권과 2권 사이에서 일종의 '전회'라 이름할 노선 수정을 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주체 문제로의 전회', '미학적[이라 이름할 수 있는] 자기-관리의 윤리학으로의 전회' 혹은 '자기의 테크놀로지 문제로의 전회' 등으로 불리는 논의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이미 수정된 국역본도 나와 있는 『성의 역사』 2, 3권 외에도, 푸코의 콜레주 드 프랑스 강의록의 하나인 『주체의 해석학(L'herméneutique du sujet)』의 일독을 권하는 바인데, 이 책을 통해 이러한 '전회'의 주제와 관련된 푸코의 보다 생생한 논의를 만날 수 있다(이 역시 얼마 전에 번역된 것으로 알고 있다). 마슈레의 논의를 따라가다 보면, 이러한 노선 수정의 단초와 맹아를 푸코의 루셀론에서 '이미' 발견할 수 있다는 가설을 얻게 되는 느낌이다. 루셀에게 중요했던 것은 이른바 '정통적' 초현실주의의 자동기술법과는 대조적인, 무의미와 자유연상에 대한 '관리' 혹은 '통제술'이었던 것. 또한 푸코 혹은 마슈레가 루셀에게서 발견하는 중요한 특징은 재현(représentation)의 논리에 대한 반대, 해방(libération)의 논리에 대한 반발이다. 이는 곧 세계의 무의미에 대한 존재론 혹은 인식론이 그러한 무의미를 관리하고 통제하려는 '자기-존재'의 윤리학 혹은 행동학으로 이행하는 전환의 지점을 가리키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는, 푸코의 루셀론이 비단 광기에 대한 저작과 에피스테메에 대한 저작 '사이'에만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 확장된 형태로 되돌아올 하나의 윤리학에 대한 '씨앗'으로도 독해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함으로써, 푸코의 사상적 여정에 관한 전체 지도를 그리는 데에 있어 하나의 '생산적인'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는 생각 한 자락 밝혀둔다.



▷ 김상환, 『 풍자와 해탈 혹은 사랑과 죽음: 김수영론 』, 민음사, 2000.
▷ 김진석, 『 소외에서 소내로 』, 개마고원, 2004.
▷ 김상환·장경렬 外, 『 문학과 철학의 만남 』, 민음사, 2000.
8) 앞서 언급하였던 '문학-사유' 혹은 '문학-철학'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단독적 저서는 국내에 그리 많지 않다. 두 권만을 꼽아본다면, 김상환 선생의 김수영論 『풍자와 해탈 혹은 사랑과 죽음』, 그리고 김진석 선생의 비평집 『소외에서 소내로』 정도를 이 계통의 수준급 저서들로 거론해볼 수 있겠다. 김상환 선생의 책에서는 김수영의 시와 다양한 철학들 사이의 흥미롭고도 감동적인 만남을 경험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 책의 독서를 통해 한 철학자의 '문학적' 자기고백과도 같은 느낌을 받았던 것을 기억한다. 이러한 '자기고백' 또는 '자기가 자기와 소통하는 대화적 독백'ㅡ여기서 '독백'이라는 단어를 단순히 바흐친적인 의미에서 이해하고 폄하해서는 안 되는데, '대화적'이라는 한정어를 붙인 까닭은 이러한 독백의 '공간'을 사장시키지 않기 위해서랄까ㅡ을 읽는다는 경험은 상당히 짜릿하면서도 중량감이 있다. 더군다나 이러한 전율과 무게가 김수영의 시를 사랑해온 이에게야 오죽할까. 일독을 권한다. 김진석 선생의 비평집 중에서는 우선 김소진論과 박상륭論의 일독을 권한다. 특히나 박상륭에 대한 비평의 환경이 꽤나 척박하다고 할 수 있는 국내 비평계의 상황에서 김진석 선생의 박상륭론은 상당히 참신한 느낌이 있다. 박상륭의 대작 『칠조어론』ㅡ이 책 앞에서 얼마나 많은 독자들이 좌절하고 또 전율했을 것인가ㅡ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그 '소박한' 논의는, 논의의 과정 자체가 상당히 추상적이고 일반적이며 심지어 '개인적'이기까지 하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박상륭의 문학에 관해 사유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을 '물음'의 형식으로 던져준다는 점에서 무시 못할 '장점'을 지니고 있다는 생각이다('포월', '소내', '탈-' 등의 창조적인 철학 개념들을 창안했던 이 '소중하고 빼어난' 한국 철학자 김진석의 다른 책들에 관해서는 다른 기회에 따로 자리를 마련해서 소개해볼까 하는데, 그가 아주 이른 시기부터 서양 현대 철학을 전유하고 자기화한 과정은, 그의 서술이 보여주는 '문체'와 더불어, 어린 시절의 나에게는 경이의 대상이었다는 고백 한 자락, 덧붙여둔다). 덧붙여, 문학과 철학의 관계에 대한 일반적 입문서 내지 다양한 접근방법의 소개서로는 민음사에서 간행된 논문집 『문학과 철학의 만남』의 일독을 권한다. 수록된 글 모두 흥미로운 논문들이지만, 개인적으로는 그 중에서 특히 김우창 선생의 글 「문학과 철학 사이: 데카르트적 입장에 대하여」와 [역시나] 김진석 선생의 글 「제 살 깎아먹는 프로이트」ㅡ이런 제목을 달고 있는 글을 안 읽고 뛰어넘을 재주가 있었을까ㅡ를 추천하고 싶다.

▷ Martin Heidegger, Erläuterungen zu Hölderlins Dichtung, Frankfurt am Main: Vittorio Klostermann, 1996[6., erweiterte Auflage].
9) 아마도 이 시점에서, 이러한 '철학적 문학' 혹은 '문학에 대한 철학적 해석'의 전통을 어디까지 소급해볼 수 있을까, 하는 물음을 던져볼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당연하게도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그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매우 다양한 논의를 포괄할 수 있는 광범위한 것이 될 것이며, 어쩌면 서구의 '문학사' 또는 '철학사' 전체와 동일한 외연을 갖는 엄청나게 거대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특히나 현대에 있어서 철학과 문학 사이의 [권력]관계를 점검해볼 때 결코 빠트릴 수 없는 책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이데거의 횔덜린論(초판은 1944년)이라는 생각이다. 개인적으로는 이 책이 현대의 '철학-문학' 논의 또는 '철학적 문학론' 저술들의 어떤 '무의식'을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다. 일독을 권한다. 이 책을 통해, 엄밀한 철학적 논증보다는 시적 사색으로 접근해가는 하이데거 후기 철학의 '문체' 문제ㅡ여기서 문체는, 단순한 문체의 문제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닌데ㅡ를 시[문학]와 철학의 관계 속에서 추적하고 규명해보는 작업도 매우 흥미로운 연구 영역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개인적인 생각 한 자락 밝혀둔다.
10) 잡생각을 계속 이어가 보자면, 철학에 대해 '문학적[시적/소설적]'이라는 평가가, 혹은 문학에 대해 '철학적[사변적]'이라는 평가가, 하나의 욕설로 사용되던 시기도 있었음을 떠올리게 된다. 예를 들자면, "시를 써라, 시를 써!" 혹은 "소설 쓰고 앉았네!"라는 문장이 "철학하고 자빠졌네!"라는 문장(독일어 동사 'philosophieren'의 가장 '창조적인' 번안 사례?)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이웃하고 있는 풍경, 이제 우리에게 그런 풍경은 낯설거나 혹은 오래되거나, 둘 중의 하나가 되었다.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경계와 배제의 작용 안에서 발생한 와해의 물결, 혹은 'genre'의 구획과 'discipline'의 분류 체계에 불어닥친 해체의 바람, 그 탈-구축의 각종 기상현상들은, 여기, 지금, 나의 글쓰기에 대한 하나의 물음을, 다시금, 재-구축한다.
ㅡ 襤魂, 合掌하여 올림.
서지 검색을 위한 알라딘 이미지 모음 1:





서지 검색을 위한 알라딘 이미지 모음 2:





서지 검색을 위한 알라딘 이미지 모음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