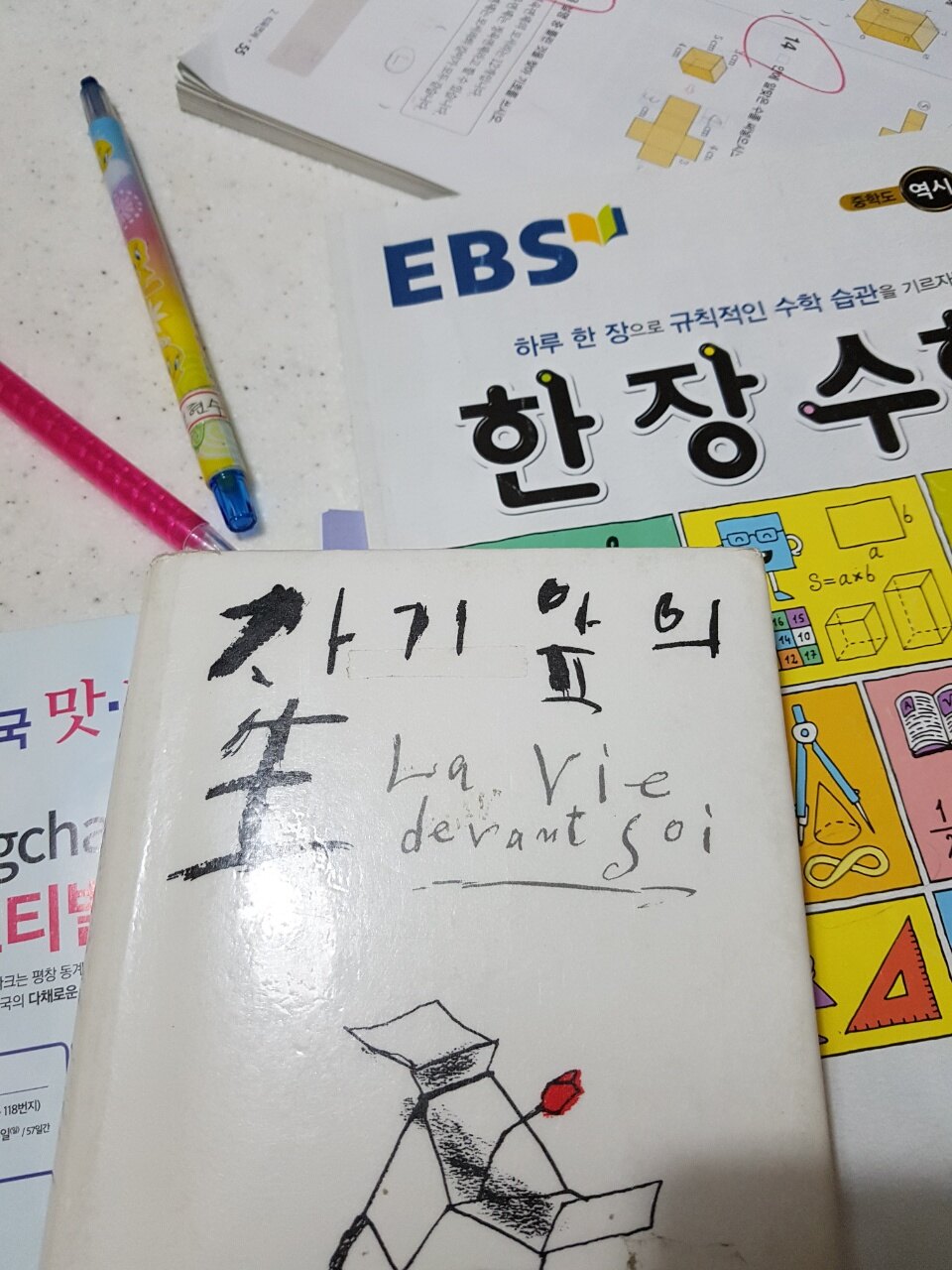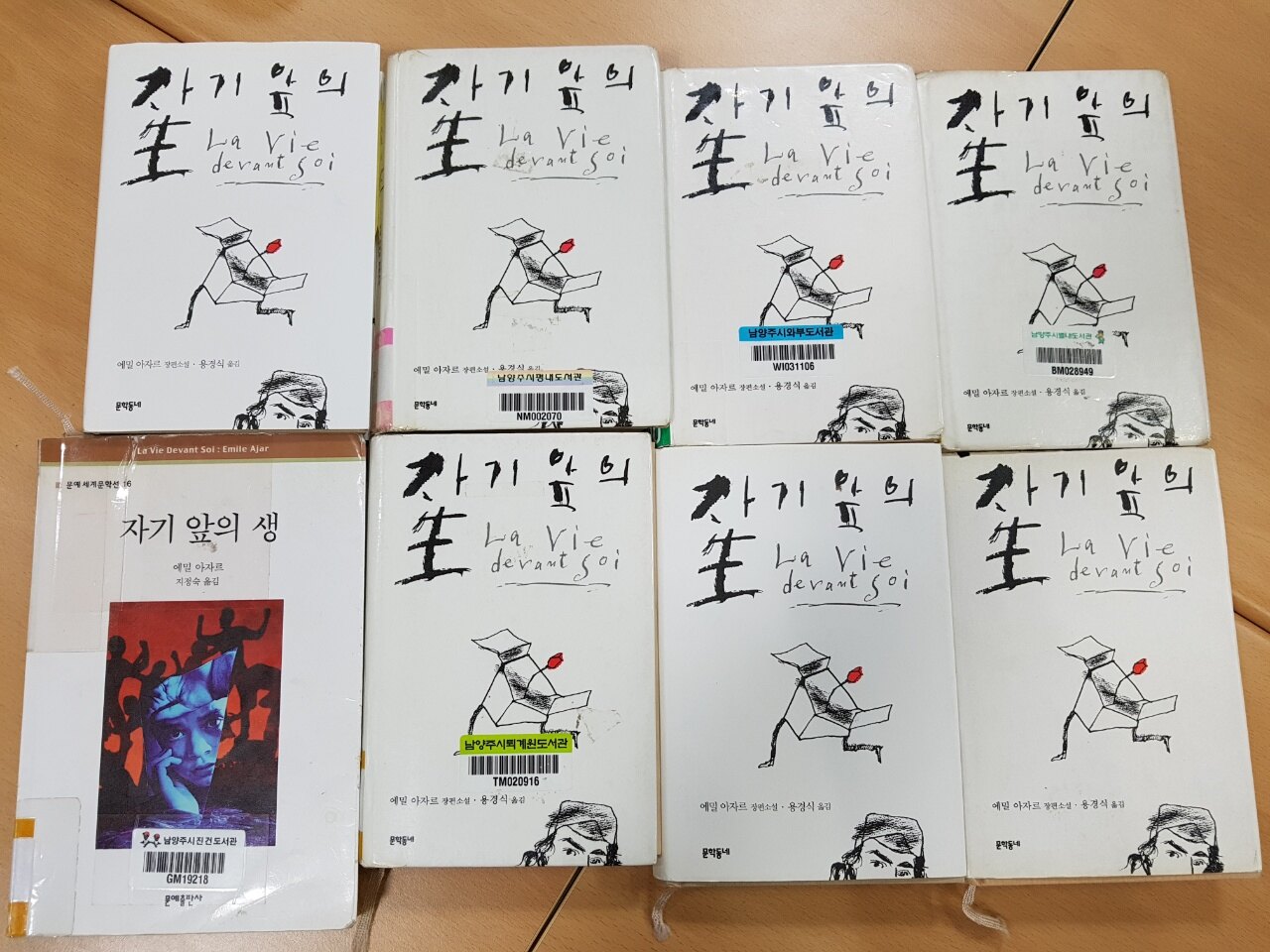-

-
자기 앞의 생
에밀 아자르 지음, 용경식 옮김 / 문학동네 / 2003년 5월
평점 :



독서모임 - 에밀 아자르의 [자기 앞의 생]
읽는내내 울컥하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고 마음 아프기도 하고 그랬다.
세상에 태어나 나를 인지하는 그 어떤 순간에 나를 돌보는 이가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은 모모에게 생애 최초의 커다란 슬픔이었다.
로자아주머니를 사랑하는 모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현실, 모모를 둘러싼 소외된 사람들의 비참한 삶, 그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 들이고, 그들 나름의 울타리가 되어 서로가 서로를 돕는 모습에서도 안타깝고 불쌍하고 비참했지만 그들 각자 자신들의 삶을 마주하는 그 각자각자의 고단함이 그래도 슬프게만 보이지는 않았다.
누구에게도 자신의 마음을 나눌 수 없던 모모에게 아르튀르가 있고, 그걸 찾아다주는 라몽에게서 따뜻함과 애정을 듬뿍 느낄 수 있었다.
프랑스에서 소외된 사람들 여자(창녀), 아랍인, 흑인, 유대인, 아프리카 원주민, 성소수자, 아이들, 노인들...그들의 삶이 비루하지만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프랑스인들과 달리 인간미 넘치고 인정이 남아 있다는 것에서도 울컥했다.
카츠 박사에게 로자아주머니의 안락사를 부탁하는 모모, 심장은 뛰지만 뇌가 죽어 제 힘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삶을 사는 게 아니지 않은가.......
어린 아이에서부터 하밀과 로자아주머니같은 노인들의 삶까지, 인생 전반을 관통하고 아우르는 소설이기에 이 소설이 지금까지 읽힐 수밖에 없고 다시 또 읽게 되는 것 같다.
이십대때 읽었던 느낌과 나이들어 읽는 지금, 소설을 보는 내가 많이 달라졌고, 그땐 모모가 어리다고만 생각하고 그의 치기어린 행동들을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 이해의 폭이 넓어진 걸 느낀다. 그래서 읽는내내 더 울컥울컥 했던 것 같다. 수술을 앞두고 있는 언니도 생각나고,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하는 것,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소설 속 인물들에게서 삶을 배운다.
사랑과 행복 그리고 희망을 읽었다.
소설 속 주옥같은 문장들이 참 많았지만 일일이 옮기지 않겠다.
나딘을 만나고 영화의 음성을 녹음하며 화면을 되돌리는 장면, 우리 인생도 다시 돌려서 다른 상황으로 재생산하고 싶지만 그건 결코 일어날 수 없다. 흘러간대로 흘러갈 수밖에, 마지막 구절 ‘사랑해야 한다‘는 구절에서 희망과 낙관, 따뜻한 미래를 읽은 것 같아서 정말 좋았다. 어떠한 인생이든 사랑이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사는동안 사랑하며 살아야겠다, 누군가를 미워할 시간이 없다. 길다면 길지만 짧다면 짧은 게 인생이니 후회없이 사랑하며 살고 싶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을 지켜주는 모모의 아름다운 사랑이 감수성을 깨운다. 주변을 돌아보며 사랑을 베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