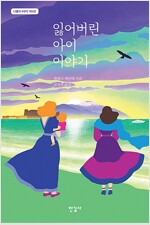나폴리 4부작에 대한 한줄평, 추천사가 많지만 그중 내게 신호를 보내온 말은 브라질의 시사잡지 <베하>의 것과 영국 <가디언>지의 것이다.
- 자전소설을 쓴 노르웨이의 칼 오베 크나우스고르와 이탈리아의 엘레나 페란테의 소설은 정말로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우리는 지금 그들에 대해 토론해야만 한다. (베하)
- ‘나폴리 4부작’은 활기차다기보다는 매우 열정적이다. 특히 2016년 맨부커 인터내셔널 후보작에 오른 ‘나폴리 4부작’의 마지막 권 잃어버린 아이 이야기는 정말 최고다. 페란테는 여성의 성과 그것이 갖는 모순적 충동성에 대해 당황스러울 정도로 노골적이고 솔직하게 썼다. (가디언)
엘레나 페렌테라는 필명으로 대중에게 드러내지 않으며 작품활동을 하는 작가로 알려졌는데 이 나폴리4부작은 자전적 소설이라 할만하다. 자신의 모든 게 이 소설에 들어있다고 밝혔다 한다.
칼 오베 크나우스고르가 1968년생인데 엘레나 페렌테의 출생연도는 알 수 없다.1992년에 첫작품을 발표했다. 크나우스고르의 데뷔는 1998년이다. ....
칼 오베 크나우스고르의 [나의 투쟁]은 1권을 읽다가 중단한 상태인데 비교하며 읽어볼만 하겠다.
(두 작가의 작품 모두 공교롭게도 한길사에서 출간한다. 기획을 잘 잡은 것인가.)
또 프루스트와 톨스토이와도 비교한다는 페란테. 나 역시 3권 [떠나간 자와 머무른 자]를 읽으면서 톨스토이의 [안나카레니나]를 떠올렸다. 두 작품 모두 불륜을 다룬다. 시간을 견뎌온 고전과 동시대의 작품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는 뭘까 고민해볼만하다고 생각했다.
더불어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와도. 자전적이며 지독히 내밀한 의식의 밑바닥까지 훑어가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가디언지의 '여성의 성과 그것의 모순적 충동성'도 생각해볼 여지가 많은듯하다
피에트로가 레누를 평했듯이, '어중간한 페미니즘, 어중간한 마르크시즘, 어중간한 프로이트주의, 어중간한 푸코이즘, 어중간한 체제전복주의'(잃어버리 아이 이야기, 552)에 근접할 것이다.
평생 릴라를 쫓고 릴라가 뭘 하는지 궁금해하며, 그녀를 평하는 기준으로 자신을 학대하고, 혹여라도 자신을 뛰어넘고 그때문에 자신의 발밑이 허물어뜨릴 수 있는 무언가를 들고 나타난날지 모른다고 상상하며 초조해하는 마음을 안고 사는 레누. 끝까지 이러한 질시를 놓치지 않고 묘사해내는 걸 읽으면서 지독하다는 생각을 했다.
장르소설로 가지 않고 이런 주제로 써낸 소설이 또 어디 있나. 과문해서, 언뜻 떠오르는 게 없다.
차라리 장르를 차용해 썼다면 더 솔직하고 더 지독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다.
릴라의 얘기를 보고 싶다. 그런면에서 레누의 얘기는 옮긴이가 '변명'이라고 했지만 솔직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도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나의 눈부신 친구'란 .. 얼마나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지.
질투(嫉妬)와 질시(嫉視)의 질'嫉' 모두 계집녀변이 들어간다는 게 참 .. 생각해볼 일이다.
질투의 투'妬'에도 계집녀변이 들어갔으며 두 낱말 모두 시샘하다는 뜻이 들어있다.
'질시'라고 나는 썼지만 릴라와 레누의 관계를 질시라고 부르는 게 맞는지. 파우스트와 메피스토펠레스로 읽는다는 건 남의 다리 긁는 느낌이기도 하고. 좀더 생각해볼 일이다.
<베하>의 말처럼 우리는 당장 '토론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