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스파게티 먹고 싶다. 맥주 한 캔 (330ml) 마셨는데, 속이 아무렇지도 않다. 다 .....나았다!
에릭 사티의 노래를 우울짜하게 틀어두고, 아마도 지금 읽는 책들이 1월의 마지막 책들이 되지 싶다.
 엘리자베스 문 <어둠의 속도>
엘리자베스 문 <어둠의 속도>
정말 지지리도 오랫동안 읽을 폼만 잡았던 책인데, 막상 읽기 시작하니, 속도가 휙휙 나간다.
자폐아인 '루'가 주인공. 루의 시각으로 이야기를 끌고 나간다.
'루를 잊을 수 없다. 그는 모든 독자의 시야를 끊임없이 변화시킬 보기 드문 캐릭터 가운데 한 명이다.' 라는 평이 책 뒷면에 실려 있는데, 그 비슷한 느낌이다.
루는 마저리를 좋아하는데, 마저리가 "루 안녕," 등뒤에서 말하면 '중력이 작아진 듯 따뜻하고 가벼운 느낌이 든다' 고 하는 사랑스러운 캐릭터다. 곰곰이 씹어보라, 이 문장. 중력이 작아진 듯 따뜻하고 가벼운 느낌이래. 어우- 어떤 기분인지 알 것 같아. 뒤에 가면, 깃털 말고, 풍선 같은 기분.이라고도 한다.
이건 딱히 로맨스 이야기는 아니고, 나는 200쪽 정도를 읽었을 정도지만, 다른 메모해 둔 부분은 좀 진지한 이야기이니, 또 다른 로맨스 이야기를 옮겨 보면, 루가 마저리에게 저녁식사를 청해도 될지 말지를 고민하며 생각하는 장면.
'마저리는 나를 좋아한다. 그녀가 나를 좋아한다고 확신한다. (...중략...) 하지만 이런 좋아함과 저런 좋아함이 있다. 나는 음식으로서 햄을 좋아한다. 내가 씹을 때 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신경 쓰지 않는다. 햄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씹어 먹어도 불편하지 않다. '
그러니깐 몇 안되는 요런 장면들이 되게 귀엽다. 그 외에는 루의 시각으로 본 소위 '정상인' 들의 이야기에 '어, 그러네,' '어 그렇군' , '그러고보니' 이러면서 읽고 있다. 그러니깐, 위의 평이랑 비슷한 느낌. '독자의 시야를 끊임없이 변화시킬'
자폐라는 소재를 강요하지 않고, 과장하지 않고, 재미를 놓치지 않으면서 잘 쓰고 있는듯 하다. 계속 쭉쭉 읽어야지.

마이클 루이스 <머니볼>
우끼~! 우끼끼! 아, 이거.
이제 한 챕터 읽었지만, 서문을 보니 휘릭 생각나는 이야기들이 많다.
우리는 우리의 단장을 '빌리상구' 혹은 '바보상구'라고 한다. 본색은 바보상구고, 비꼬아서 빌리상구라고 하는데, 작년에 홍성흔 데려와서 그 비꼰 별명이 진짜인줄 아는 강민호 올림픽때 99마일로 미트 던질 때 부터 야구 본( 롯빠한) 애들이 좀 있다.
그러는 나도 메이저리그는 잘 모르고, 그냥 빌리상구가 된 유래 정도랑 빌리 빈이라는 유명한 단장이 있다. 는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이 책이 바로 그 '빌리 빈'에 대한 이야기! 우꺄-! (이상한 신음환성 자제요, )
빌리 자신이 굉장한 5툴 유망주였다가 (잘 달리고, 잘 치고(멀리 치고, 잘 맞추고), 잘 던지고, 수비 잘하고 : 여기에 6툴이라고 미모 혹은 법력까지 포함해서 우리 주처님 (롯데 자이언츠 김 주우차안~)을 꼽기도 한다. 믿거나 말거나) 계약이 스무스하게 안 되고, 결국 그냥 좀 잘하는 마이너리거인 현실. 까지 읽었다. 아, 이거 어서 본 이야기. 얼마전 읽었던 <이노센트맨>의 그 찌질이. (미안) 무튼, 억울하고, 불쌍하게 감옥생활하다 11년만에 폐인되서 풀려 난 그 사람의 시작과 비슷하다. 그리고, 그 <이노센트맨>의 론 윌리엄슨이 실제로 오클랜드 어슬랜틱스(빌리 빈의 전설이 시작된) 와 면접을 보던가, 안 보던가. 이노센트맨에서 읽으면서, 그 때 읽던 어떤 책에 또 '오클랜드 어슬랜틱스'라는 괴짜팀 이야기가 나와 있어서, 여기도 나오네. 했는데, 그 책까지는 생각 안 나네.
무튼, 이건 경영서에 속하는데, 야구단 이야기다보니, 아아아아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다!
 프랑수아즈 사강 <고통과 환희의 순간들>
프랑수아즈 사강 <고통과 환희의 순간들>
언젠가 사강을 읽는 것은 (그 중에서도 특히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 길티 플레져다. 라고 얘기한 적 있다. 페이퍼 쓰다 만거 언젠가 완성해서 올리겠지만, 아, 진짜 여자로 태어나면 한 번 사강같이 살아봐야지, 하는 로망이 절절한 인생이다.
진정 현존했던 팜므파탈이다. 그녀가 무얼 하던 나는 그냥 무조건 좋아할 것만 같으니 말이다.
실제로, 전혀 좋아하지 않았던, 아니 싫어하는 편에 가깝던 도박이 멋있어 보이는 (아, 역시 사강은 길티 플레져 맞어;;) 지경이었으니, 불법이 아닌 이상, 남한테 폐끼치는 일이 아닌 이상, 얼마든지 멋있게 할 수 있다.고 덧붙여 본다.
무튼, 그녀의 데뷔작부터 성공작이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스물 한살때 억만장자였다. 라던가, 무슨 왕하고 도박하고, 빌리 홀리데이의 죽음릐 예언을 듣는다거나, 아, 진짜 세상에 이런 여자가 있을까.
 사강의 소설은 대충 번역된 건 몇 번씩 다 읽은 편인데, 또 다른 느낌이다. 이 책에는 에세이 격의 짧은 글들이 모여 있다. 근데, 어쩜 툭툭 던지는 글들이 아주 복잡미묘한 감정을 풀풀풀풀 일으킨다. 그러니깐, 이건 사강에 대한 나의 특별한 감정이니, 너무 낚이지는 마시길.이라고 일단 경고.
사강의 소설은 대충 번역된 건 몇 번씩 다 읽은 편인데, 또 다른 느낌이다. 이 책에는 에세이 격의 짧은 글들이 모여 있다. 근데, 어쩜 툭툭 던지는 글들이 아주 복잡미묘한 감정을 풀풀풀풀 일으킨다. 그러니깐, 이건 사강에 대한 나의 특별한 감정이니, 너무 낚이지는 마시길.이라고 일단 경고.
내가 엄청엄청 동경하는 것 한가지가 있다면, 그건 사강이나 뒤라스 같은 프랑스 여자. 그리고, 저 사진들처럼 커트머리에 앞머리 짧은거!
(미안, 이런 사소한거라.그러나, 저 짧은 앞머리와 얼굴과 그녀들의 글과 삶 전체를 나는 무한동경한다구.)
이런거. 아, 멋져.멋져.
동경하는 프랑스 여자. 라고 했지만, 그냥 이 두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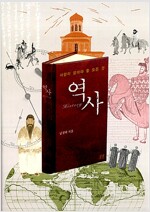 남경태의 <역사>를 읽고 있다.
남경태의 <역사>를 읽고 있다.
그리스도교의 탄생, 이슬람교의 탄생 부분 읽고 있는데, 아주 재미있다.
콘스탄티누스가 종교를 통일하려고 했을 때 예수를 신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논란이 벌어졌고, 거기서 소수파인 서방(로마)이 선기를 잡게 되나 동방의 다수는 여전히 유일신을 주장하고, 신의 아들인 그리스도는 예언자보다는 높고, 신은 아니지만, 일단 예언자로 보고, 또 다른 예언자 마호메트를 내세워 이슬람교를 만들게 되고, 가장 공격적인 포교활동 (전쟁)을 시작하는 부분.을 읽고 있다.
카톨릭의 교리가 플라톤의 교리에서 온 것이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서방에서 무시되고, 동방에서 연구되어 역으로 들어와 아퀴나스가 자연신학(과학)으로 정리하고, 아리스토텔레스를 재발견.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다.
읽다보면,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이름이나 전쟁 등이 툭툭 튀어나온다. 대체로 시간순의 이야기이긴 한데, 동과 서를 왔다갔다 하면서 굵직굵직한 '역사'들의 의미, 현재와 연결되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 일단 달필이라 술술 넘어가는 것이 극장점인데,

 지금 이 두 권 읽다가 나는 너무 화가 나 있어서 남경태의 글이 더 눈에 쏙쏙 감사시럽게 들어온다. 동문선 ㅅㅄㅄㅂㅄㅄㅄㅄㅄㅄㅂ
지금 이 두 권 읽다가 나는 너무 화가 나 있어서 남경태의 글이 더 눈에 쏙쏙 감사시럽게 들어온다. 동문선 ㅅㅄㅄㅂㅄㅄㅄㅄㅄㅄㅂ
앞으로, 레이몬드 챈들러가 무덤에서 나와서 동문선에서 책을 낸다고 해도 나는 그 책을 안 살꺼다. 내가 5년동안 존 버거를 읽었는데, 주로 열화당것과 원서 읽다가, 이번에 동문선 두 권을 집었더니만, 진짜 열받는다. '그래도 내 준게 어디야' 따위의 생각 전혀 들지 않는다.
결국, 어제 애닳아 했던 <애도하는 남자>던가 <블러드워크>는 모셔만 두고 (아침에 교보 다녀와서 가방에서 꺼내지도 않고, 한 권은 어디 그림책 사이 바닥에 쌓여 있고;;) 읽지도 않았다.
 히가시노 게이고 <교통경찰의 밤>
히가시노 게이고 <교통경찰의 밤>
이거 표지 예쁘다고 이야기한 적 있는데, 실물을 보면,
앞에 투명한 발자국이 엠보로다가 찍혀 있다. 꽤 신경쓴 디자인의 귀여운 문고판.
단편집에도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 아닌가 모르겠다. 그나저나 저 빨간밤하늘의 눈알없는 여자얼굴의 의미는 아직 불명.
앞에 단편 3개 정도를 읽어 보았는데,
각각의 재미에 별을 매기면, 별 다섯개, 세개, 네개.
일단 교통경찰이라는 소재 자체가 무척 특이하니 재밌다.
히가시노 게이고의 단편을 읽어보았던가. 가물가물하지만 (맨날 욕하면서도 은근 많이 읽었다는;) 단편 꽤 괜찮잖아.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