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뭐랄까.. 읽으면서 계속 1980년대 풍이란 생각이 계속 들었달까. 인상이나 감정선이나 이 픽션-논픽션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모든 게. 배경음악으로 카펜터스나 프린스라도 튀어나올 것 같은.

이전에 스티븐 킹이 썼던 단편집을 엄청나게 즐겁게 읽었었기 때문에 그만큼 기대를 갖고 봤는데, 정말 재미없었다. 상하권 둘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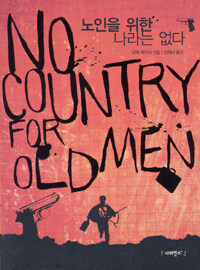
지독하리만치의 답답함과 건조함. 영화가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직 안 본 상태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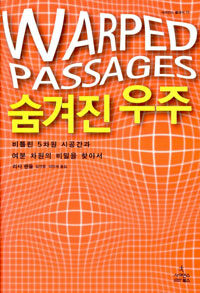
중요하게 할 얘기만 착실하게 선뵈면서도 어렵지 않게 길을 열어준다. 두껍고(내용적으로나 보이는 걸로나) 충분히 흥미로운 입문서. 내년에 예정된 강입자 충돌기 실험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결과가 확인되면 개정판이 나올지도. 혹은 거의 모든 걸 뒤집어야 하거나? 현명하게도 이 책의 머릿말에는 자신의 학설에서 이미 발견되어 있거나 제시된 상태인 다음 단계의 이론들을 선입견 때문에 무시하거나 부정하려고 무던히도 애썼던 과학자들의 이야기가 나온다.

사실 이 책의 할 말은 앞부분에 거의 다 나와있다. 그러나 주제면에서 동어반복이지만 차근차근 풀어내는 마지막장까지의 이야기들이 재미없었다고 말하긴 힘들 것 같다. 다만 역자 글에서도 지적되듯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일본의 문화와 관련된 판단이 좀.

이 시리즈에 대해 요약해 얘기하자면, 소위 요즘 취향의 입문서? 어째 좀 성이 안 차는 건 입문서이기 때문인 건지.

[크립토노미콘]을 처음 손에 들었던 게 2003년이었는데, 그때 느꼈던 감상이나 지금 느끼는 감상이나 동일하다. 뭐 이리 산만하지, 라는 거. 생각해보면 닐 스티븐슨의 다른 작품인 [스노크래쉬]나 [다이아몬드 시대]도 비슷한 느낌이었는데 [다이아몬드 시대]는 거기에 더해 작중 내내 보이던 다소 괴이쩍은 오리엔탈리즘에도 불구하고 어찌어찌 읽어낸 걸 보면 [크립토노미콘]의 내공이 그보다 더 심원해서 내가 못 읽어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