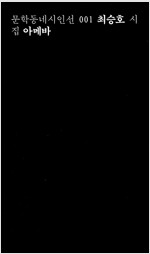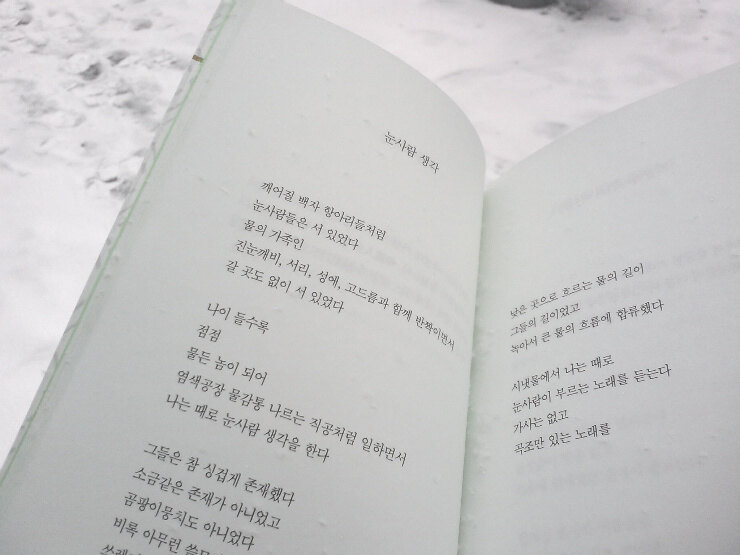
(2011년 1월)
김경주 시인은 "나는 이 세상에 없는 계절"이라 말했지만 내 계절은 하루에도 여러 번 바뀐다. 누가 더 힘겨운 지구살이인지...내 그로테스크한 기분을 잘 말해주는 시인이 있다.
1.
생일
탯줄이 가위에 잘린 날
먹는 미역국,
탯줄 먹듯 먹는 미역국.
그렇게 살면 못 살 것 같은데
그렇게 살았다
붉은 털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서
톱니들이 맞물려 돌아가고
수난절도 정부미도
돌아갔다 떡국도 붙박이별도 돌아가고
판박이 삶 속에 생일이 돌아와도
그럭저럭 헛 살고 늙어간다는 느낌뿐.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별수없이 이렇게 산다.
자궁 속의 강낭콩만한 태아가
부풀어오른 엄청난 육체,
그리고 전진하는 나의 갱년기,
나의 종언, 나의 재,
나 없는 나의 무덤,
無는 대체
나이를 몇 살이나 먹었을까,
내가 다시 0의 나이로
어려져서 충실하게 들어앉을 無는.
詩 최승호 (《대설주의보》, 민음사)
툭툭 일갈하는 최승호 시인의 문체에서 시적 재능이 뛰어나 너무 쉽게 쓰는 게 아닐까 하는 인상을 받곤 한다. 한국 시인 중 상당한 다작을 보여준 것만 해도 그렇고. 《대설주의보》 시집 해설을 맡은 김우창 선생의 정공법적인 시선과 비평이 대비를 이루며 돋보인다. 현학적인 수사와 철학(자)를 동원하지 않으면서도 깊다. 이건 최승호 시인과 비슷하다.
"실감은 무엇이며 어떻게 얻어질 수 있는가? 손쉽게는 그것은 어떤 일을 겪는 사람의 생생한 체험을 재생하려고 노력하는 데에서 생겨난다고 여겨진다. 또 이것은, 단적으로 작가가 그리고 있는 대상과 작가와의 일치, 특히 심정상의 일치로 인하여 가능해진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달리 말한다면, 사회 의식을 중요시하는 작품의 경우, 실감의 결여는 흔히 억압적 체제에 의해 희생되는 민중과의 보다 긴밀한 심정적 일치에 의하여서만 극복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그러나 형상화의 관점에서 볼 때 심정적 일치의 기능은 이와 같이 긍정적인 것이라고만 보기는 어렵다. 형상화는 알아볼 수 있는 모양을 만든다는 것이고 이것은 객관화 작용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주체적 일치는 이 객관화 작용에 역행하는 것이다. 우리가 아픈 사람과 심정적으로 일치한다고 할 때, 아픈 사람의 아픔이 크면 클수록, 또 그 사람의 커가는 아픔에 일치하면 할수록 언어로써 말할 수 있는 것은 신음과 외침에 한정될 것이고, 그런 경우 아픔의 내용 특히 그 객관적 정황에 대해서 전달하거나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아픔의 내용과 정황을 말로 표현한다는 것ㅡ그것을 전달하고 진단하며 또는 형상화한다는 것은 아픔으로부터 거리감을 유지한다는 것을 뜻한다. 물론 아픈 사람과의 일치를 전제로 하지 않고는 그것의 객관화는 있을 수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문학에서 기대하는 바의 직접적인 전달 또는 형상적 직관을 유발하는 것일 수는 없다. 그러나 예술가가 이러한 일치 상태에 머무는 한, 그는 인식이나 형상화에 나아갈 수 없다. 예술은 대상과 일치하며 동시에 이것으로부터 멀리 있는 역설을 그 조건으로 한다. 예술가가 반드시 관찰자, 제3자여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대상과 그 대상을 예술적으로 인식하는 자가 같은 사람일 경우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상태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그가 단순한 수난자로 수난의 와중에 있는 한, 그는 예술적 표현을 얻어낼 수 없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민중이라면, 민중은 예술가가 아니다. 민중적 예술가는 민중이면서 민중을 객관화할 수 있는 자, 그런 의미에서 민중을 넘어선 사람이다(이것은 민중과 예술가를 갈라놓는 이야기가 아니다. 민중이 스스로의 상태를 깨닫고 스스로의 힘을 안다는 것도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과한다는 것을 말한다)."(p138~140)
"사람이 진실에 의하여 움직여질 수 있는가? 여기서 진실이라 함은 어떤 특정한 진실, 즉 직접적인 이해 관계에 의하여 나에게 결부되어 있는 진실이 아니라 인간 일반의 보편적인 진실을 의미하는 것이겠는데, 문학은 우리의 현실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사람 모두가 인간 존재의 진리에 직관적으로나, 또는 반성과 교육을 통하여 참여할 수 있다고 믿고자 한다. 이것은 문학이, 직접적 명령이나 교훈을 통한 전달이든, 어떤 객관화된 심상의 제시를 통한 전달이든 그것도 물리적 강제력이 없는 마당에서의, 전달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은 데에서 드러난다. 물론 사람의 참다운 모습 또는 그것에 비친 바 비뚤어진 모습이 일거에 제시될 수 있고, 또는 그것이 제시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대로 설득력을 가지고 실천적 활력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우리가 순진하게 믿고 있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근본 바탕에 그러한 순진한 믿음을 갖지 않고는 문학이 성립되기 어렵다는 것이다."(p142)
2.
모래인간은 일찍이 없었고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모래가 된 인간은 많지만 모래로 된 인간은 없다. 모래는 잘 뭉쳐지지 않는다. 모래는 흩어진다. 모래는 흘러다닌다. 모래들이 물어뜯은 것 같은 움푹한 미라는 있지만 모래로 빚은 태아는 없다. 사막에 사는 모래쥐도 그렇다. 모래가 되는 모래쥐는 많지만 모래로 빚은 모래쥐는 없다.
ㅡ 최승호 詩 「모래인간」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