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울지도 못했다 ㅣ 문학과지성 시인선 513
김중식 지음 / 문학과지성사 / 2018년 7월
평점 :




소설가들은 새 작품 집필에 들어갈 때마다 처음 같은 난관에 봉착한다고 토로한다. 새로운 세계를 구축하고 탄생시키려니 그럴 수밖에 없다. 시인은 어떨까. 알다시피 시는 관찰과 묘사로 완성되는 게 아니다. 시집은 단지 시 묶음이 되어서도 안 된다. 시는 단순히 허구의 이야기를 짓는 창작이 아니다. 시적 자아가 있더라도 한 권의 시집은 시인이자 한 인간이 살아낸 삶의 여행기이자 기록의 변형이기도 해 우리는 소설보다 시를 더 진솔하게 느끼기도 한다. 시는 당위가 아니라 삶의 난처를 말하기에 우리의 공감을 더 끌어낸다. 세계를 보는 뛰어난 통찰을 드러낸 시의 선례가 있었기에 독자들은 시인에게 선지적 역할 부담을 지우기도 한다. 독자의 공감을 끌어내는 생활 시를 쓰며 만족하는 시인이 아닌 이상 시인으로 사는 건 죽을 맛일 거 같고 한 편의 시를 쓰는 건 지옥에서 보내는 한철이자 편지 같을 거 같다. 1993년 『황금빛 모서리』 시집 이후 김중식은 25년 만에 두 번째 시집 『울지도 못했다』를 냈다. 첫 작품의 성공 이후 두 번째의 어려움을 말하는 소포모어 징크스란 말이 있지만 『울지도 못했다』를 읽고 나니 김중식 시인은 세 번째가 더 어려울 거란 생각이 들었다. 첫 시집에서 보여준 거침없는 비관주의를 25년간 이겨 내려 한 노력이 두 번째 시집에 역력한데, 종교적 응축으로 가득한 단장(短章)을 앞으로 효과적인 시어로 보여줄 수 있을까. 시인은 이런 의지를 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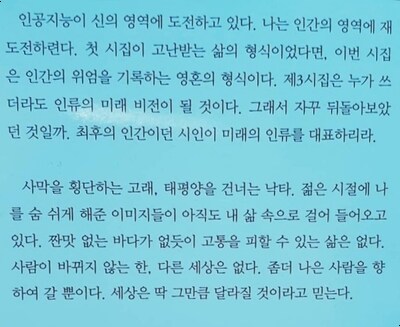
첫 시집에 대해 차창룡 시인이 “매우 실험적인 듯하면서도 시의 전통을 버리지 않았고, 시의 본령을 지키면서도 자유로웠다. 구어체가 주류인 듯하면서도 문어체도 근사하게 구사하였고, 서정적이면서도 풍자적이고, 격정적이다가 자조적이다가 냉정해지거나 차분해지기도”(p108) 한다는 평에 나도 동의한다. 두 번째 시집에서도 그 성향은 변함없으나 구조화에서는 다소 실망스러웠다. 그러나 차창룡 시인의 애정 어린 해설은 이 시집과 시인에 대해 좋은 보충 설명을 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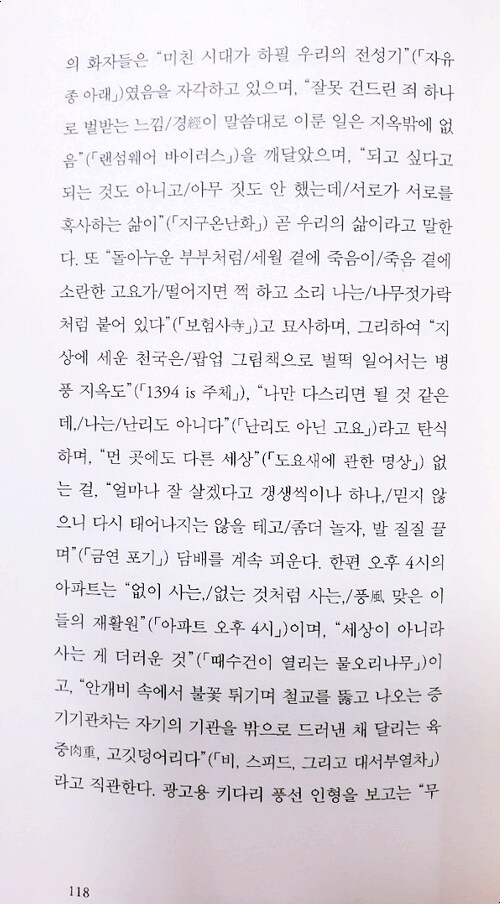


인간이 왜 종교, 종교적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나는 자주 생각한다. 창작이 다른 세계의 구축으로 현실을 말하듯이 종교도 이 세계의 극복을 위해 제3자의 관점에서 필요한 좌표일지도 모르겠다. 2차원에서는 3차원을 볼 수 없으니 말이다. 어느 차원의 어떤 존재로 있든 끝과 시작의 삶을 가진다면 고통의 번뇌를 피할 수 없으니 우리는 그것이 사라지는 천국이나 해탈을 희망한다.
시인은 “우는 이유를 잊을 때까지 우는” “우리는 가끔씩 울어야 한다”(「물결무늬 사막」)고 말하고 있다. 삶도 시도 마찬가지 아니던가. 우리는 망각보다 더 심각한 상태인지도 모른다. 이유도 모른 채 '어떻게'에 골몰하며 살아가는데 익숙하다. 그래서 깨달음이 어려운 것이겠지만. 부질없음, 덧없음, 그 극복에 대한 노력이 우리를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하는데 시를 쓴다는 것은 한층 더 어려운 힘이 필요하다.
“단 한 번의 궤도를 이탈함으로써 두 번 다시 궤도에 진입하지 못할지라도 캄캄한 하늘에 획을 긋는 별, 그 똥, 짧지만, 그래도 획을 그을 수 있는, 포기한 자 그래서 이탈한 자가 문득 자유롭다는 것을”(「이탈한 자가 문득」, 『황금빛 모서리』)
김중식 시인의 이 문장은 그의 시들의 함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시인의 말」에서 “지상에 건국한 천국이 다 지옥”이었고, “천국은 하늘에, 지옥은 지하에, 삶과 사랑은 지상에” 라고 했다. 삶을 지옥으로 보든 천국으로 보든 우리는 삶에서 삶으로 이동하며 끝도 이곳에서 맞는다. 울지도 못하겠을 때 시가 함께 있어 그나마 다행 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