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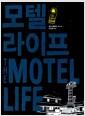
-
모텔 라이프
윌리 블로틴 지음, 신선해 옮김 / Media2.0(미디어 2.0) / 2009년 9월
평점 :

품절

<모텔라이프>에서 이야기를 이끄는 것은 프랭크다. 프랭크에겐 미안하지만, 내 경우 그 이름이 떠오르지 않아 책을 다시 열어봐야 할 정도로 프랭크는 그저 화자 정도로밖에 안 느껴진다. 대신 책을 덮고도 끊임없이 떠올라 나를 계속 괴롭히는 건 프랭크의 형, 제리 리이다. 제리 리라는 이름이 프랭크보다 더 쉬운 단어이기 때문은 결코 아니다.
제리 리가 소설 내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빌어먹을" "가련한 자식" "내 잘못이야." "끝장이야" 따위의 말들이다. 그는 실수로 한겨울에 외투도 제대로 입지 않고 자전거를 타던 한 소년을 치었고, 속도를 30km도 안 냈지만 그 '빌어먹을 가련한 자식'은 죽었고, 소년을 응급실에 데려가려 했지만 소년의 심장은 이미 멈췄고, 자수를 하려했지만 아주 조금 술을 마신 상태라 두려웠다.
그후로 제리 리는 끊임없는 죄책감에 시달린다. 술을 마신 것도, 자신처럼 하찮은 사람이,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자신이 치지 않았으면 행복하게 살았을 소년을 죽인 것도, 자신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자체도, 그리고 동생까지 끌어들여 본의아닌 뺑소니에 동참시킨 것도 너무나 괴롭고 두렵다. 그리하여 스스로를 벌하지만 그마저도 두려움 때문에 어설프게 끝이 난다.
미안해하고 또 미안해하고 자책하고 또 자책하는 제리 리의 모습이 정말 잊혀지지가 않는다.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수십 명이 다치고 아무 죄 없는 사람이 죽어도 양심의 가책은커녕 오히려 큰소리치는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사는 세상에서 양심의 가책으로 그토록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너무도 인상에 남는다. 제리 리는 비록 일찍이 부모를 잃고 학교도 그만두고 모텔이나 전전하는 하류인생이지만, 한 사람이 또다른 사람의 목숨을 앗는다는 것이 얼마나 말이 안되는 끔찍한 일인지를 엘리트코스를 밟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이 실수였건, 상대의 부주의함에서 비롯된 것이건, 단순히 불운 때문이건, 끔찍한 건 끔찍한 거고 말이 안되는 건 말이 안되는 거라고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다. 바로 그 지점에서 진짜 불운이 시작되고, 그건 어떻게해도 잊혀지거나 사라지지 않는 것이었다.
지극히 상식적인 양심에 내가 이토록 감동하고, 그래서 어떤 나라의 법으로 봐도 범법자가 분명한 제리 리를 동정해 오히려 숨겨주고 싶게 만든 걸 쉽게 이 세상 탓으로 돌리고 싶진 않다. 하지만 그것이 제리 리의 탓이라고, 결국은 제 할 탓이라고 무책임하게 말하고 싶지도 않다. 그저 너무 평범하고 너무 겁이 많고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지도 못하지만 결국은 그렇게 죗값을 치르는 것이, 겨우 제리 리밖에 없다는 것이 화가 난다. 제리 리는 끝끝내 자신이 느끼는 가책과 죄책감의 진정성을 증명했고 난 그저 그것이 너무 슬펐다.
누군가는 이 책이 불안과 그 반면에 있는 희망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 이 책은 이 세상에 거의 유일하게 존재하는, 아마 마지막이었을지도 모르는 순수한 양심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래서 제리 리는, 비록 하류인생이고 그의 삶은 '모텔라이프'에 불과하지만 결코 'loser'는 아니다.
+ 아, 제리 리를 묻은 무덤이나 뼈를 태우고 남은 재를 뿌린 바다나 강이나 유골을 모신 납골당이 실제로 있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