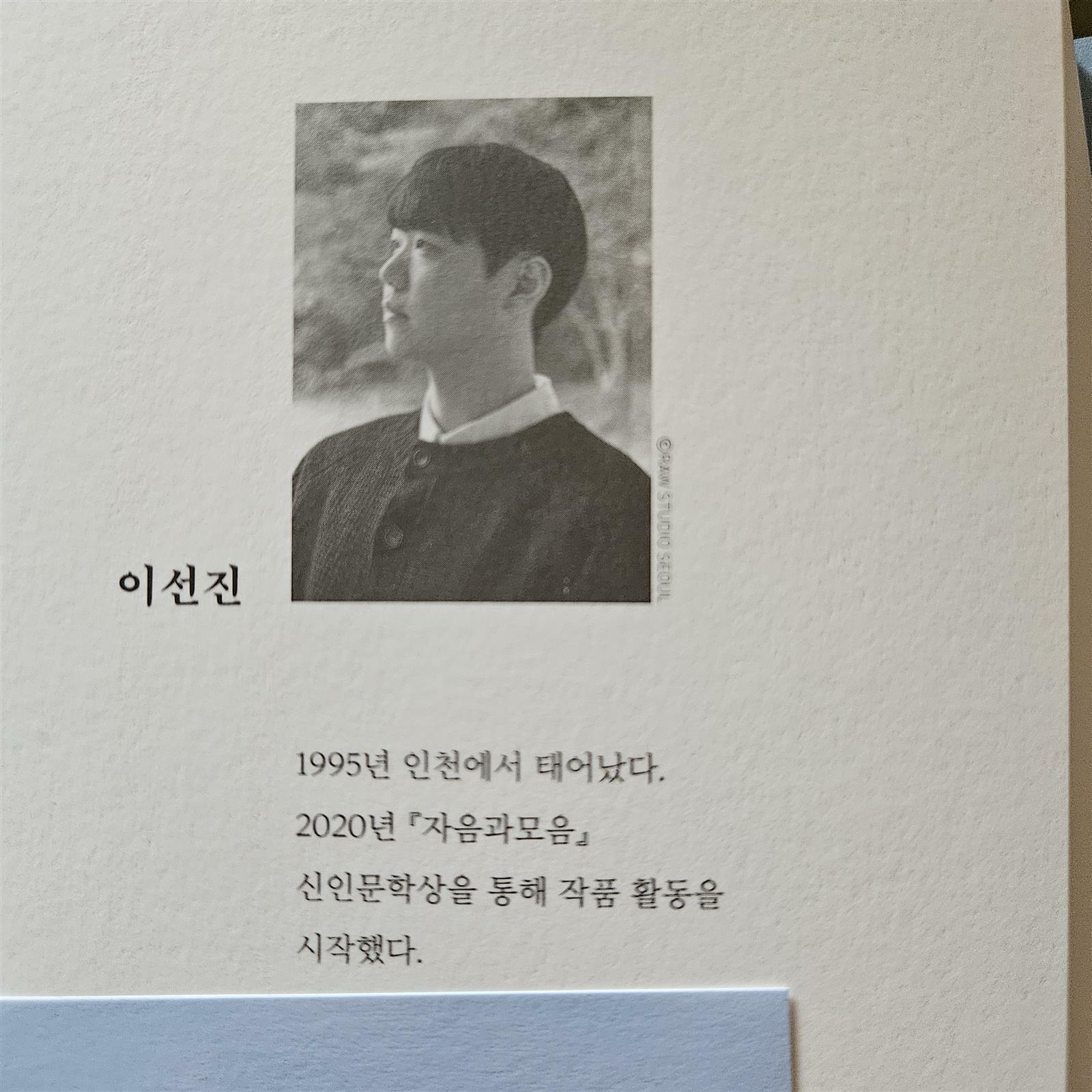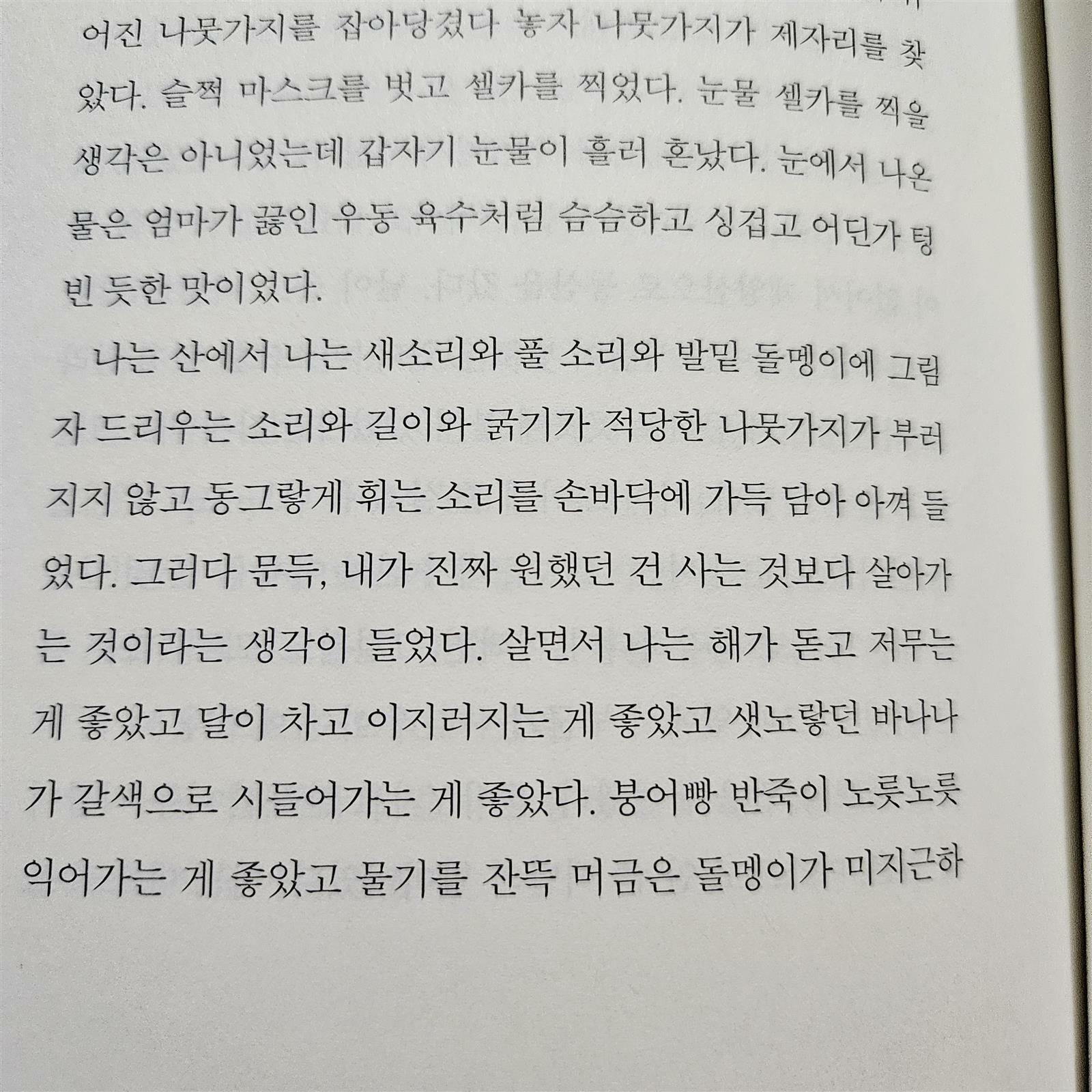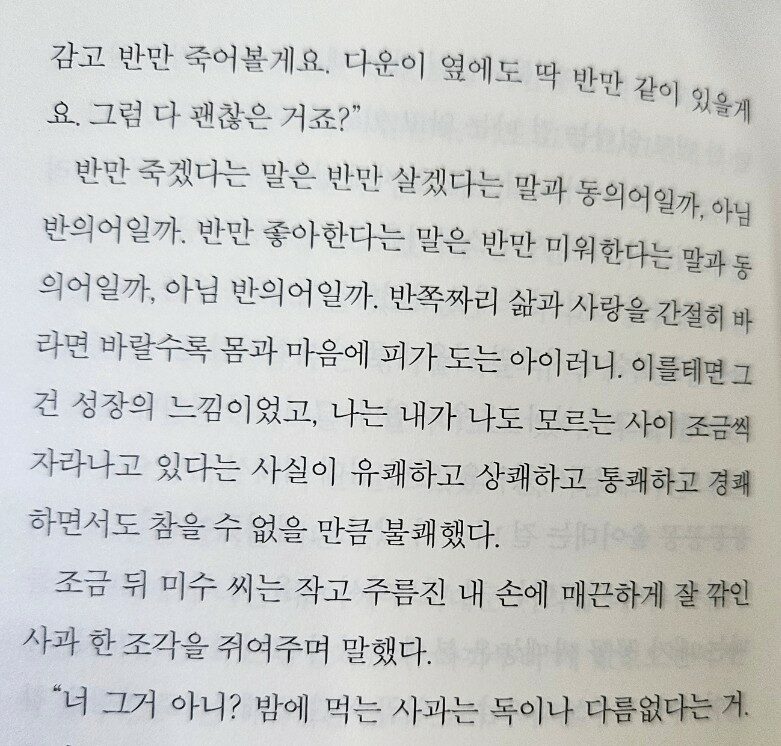늘 그렇고 그런 문장이 지루하다 생각된다면 신인작가 이선진의 소설, 밤의 반만이라도를 만나보시길, 새로운 감각에 눈이 번쩍 뜨이게 된다.
단편 소설 모음집이다. 글은 동성애가 기본으로 깔려 있다. 여자와 여자의 사랑이야기라고 해야할까, 그치만 거부감이 들거나 하지 않는다. 여자 남자를 떠나서 그냥 인간과 인간의 만남과 헤어짐 그 안에 당연하게 존재하는 사랑이야기다. 내가 이런식으로 헛소리를 떠들게 된건 순전 작가 탓이다.
첫번째 단편 부나와 나, 도서관에서 일하는 부나와 이지의 이야기에서부터 놀란다. 작가의 작명센스가 남다르다. 글속에 이름에 담긴 의미와 에피소드가 또 재미지다(책을 읽으면 알게 된다). 도서관에서 하는일의 특징이 잘 실려있다. 도서관에서 사라진 책을 분실도서로 분류하지 않으려하는 부나의 이야기에 옛일이 생각났다. 빌려온 책 한권이 반납일을 넘기다 결국엔 기억에서 잊혀졌으며 한참을 우리집 책장에 짱박혀 있던 어느날 그걸 발견하고 도서관에 반납하러 갔던 일, 그런데 희안하게도 대출해간 기록이 없단다, 그럼 내가 책을 훔쳐 나온게 되는건가? 했던 당혹스러웠던 일, 어쨌거나 도서관 입장에서는 분실된 책이 맞을텐데 분실도서로 분류되지도 않았고 책은 다시 제자리로 잘 돌아갔으니까 그냥 없었던 일이 된거다. 어쩌면 부나도 그럴거라 믿었는지도 모른다. 이렇듯 어쩌면 있을 수 있는 일을 소재로 삼는 작가의 남다른 이야기 센스가 매력적이다.
‘있지, 우리 처음 만났을때, 집이랑 너무 몰었잖아. 환승 막 세번씩 해랴 됐잖아. 사람이 어찌나 많은지 집 어면 완전 녹초 돼 있고,
그래도 그땐 지금보다 따뜻했던거 같애.‘- p77
옛친구의 장례식장엘 가면서 옛일들을 이야기하던 나니나기의 연휘와 나니의 티키타카(역시 이름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다),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러웠지만 옛날이 더 좋았다고 느낄때가 분명 있다. 둘의 팩트를 날리는 엉뚱한 대화를 듣고 있자면 작가의 남다른 표현력과 문장력에 감탄하게 된다.
책을 읽다가 작가가 궁금해지는 일은 참 오랜만이다. 띠지를 펼쳐본다. 작가가 95년생이라니, 아직 새파랗게 젊은 청년이다, 게다가 신인이다. 한데 소설을 오래 써본것 같은 감각은 어디에서 온걸까? 짧은 생동안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한걸까, 아니면 책을 많이 읽은 탓일까, 등등 작가에 대해 무척 궁금해진다. 게다가 남자의 입장에서 여자들끼리의 사랑을 이야기하다니 의외라고 여기는건 편견일까?
‘너는 말했고, 나는 몰랐다는 말 밖에는 아는 게 없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이름은 언덕인 샘이야:
언덕, 네가 이야기를 이어가는 동안 나는 네가 내 귓가에 부려놓는 야트막한 이야기를 느릿느릿 오르고 있었다. 물론 정상에 가 닿기도 전에, 꼭대기에 다다라 우리가 무언가를 교환하기도 전에 미수씨는 어떻게 알고 훼방놓기 일쑤였지만‘
작가의 문장 표현력은 이런식이다. 그냥 단순하게 끝맺지 않고 긴 여운을 남긴다. 긴꼬리 여우 원숭이 같달까, 긴꼬리 도마뱀 같달까, 아무튼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문장이지만 나쁘지 않다. 게다가 ‘이야기를 느릿느릿 오르고 있었다‘는 이런 문장을 쓸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이작가의 필력에 속수무책으로 끌려가고 만다.
‘반만 죽겠다는 말은 반만 살겠다는 말과 동의어일까. 아님반의어일까. 반만 좋아한다는 말은 반만 미워한다는 말과 동의어일까, 아님 반의어일까. 반쪽짜리 삶과 사랑을 간절히 바라면 바랄수록 몸과 마음에 피가 도는 아이러니. 이를테면 그건 성장의 느낌이었고, 나는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 조금씩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이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하고 경쾌하면서도 참을 수 없을 만큼 불쾌했다.‘- p206
단어와 문장을 가지고 노는듯한 작가의 글담, 반만이라는 표현에 담긴 역설과 반어등 우리말을 참 지혜롭게 잘 써먹는다. 게다가 유쾌 상쾌 통쾌한데 불쾌하다니, 이 작가는 도대체 어느 별에서 온걸까?
각각의 개성강한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여덟편의 이야기, 짧지만 그 여운은 길게 남는다. 때로는 안타깝지만 우습기도하고 불쾌할 수 있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읽게 만드는 작가의 놀라운 필력, 정말이지 사랑할 수 밖에 없는 소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