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퀘백주에 사는 오십 대의 그녀는 구순이 넘은 노모와 순리에 따른 작별을 하게 된다면 중앙아메리카 지역으로 떠나는 꿈을 꾼다고 했다. 맑지만 차가운 공기, 단풍나무 꿀, 그녀가 마침내 여장을 꾸리고 녹슨 스페인어를 갈고 닦을 그날을 상상하는 것만으로 마음이 몽글몽글해졌다.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그녀가 한편 부러웠다. 이미 다 읽어버린 책처럼 나는 이제 꿈을 꾸지 않는데... 가고 싶은 곳을 떠올려 본 적도 오랜 일인 것 같다.

성 빅토르의 후고가 1128년경에 쓴 <디다스칼리콘>을 통한 이반 일리치의 읽기에 대한 통찰이 쉽게 와닿는 것은 아니었다. 후고는 "읽기를 존재론적인 치료 테크닉으로 인식하고 해석했다."는 문장에 표시를 한다. 또는 "읽는 사람은 모든 관심과 욕망을 지혜에 집중하기 위해 스스로 망명자가 된 사람이며, 이런 식으로 지혜는 그가 바라고 기다리던 고향이 된다."는 대목에도 잠시 멈춘다. 888년 전 수도사에게 읽는 일은 생 그자체였으며 그의 앞의 경전은 육화하였다. 그 앞에서 읽는 일은 "자신의 '자아'에 불이 붙어 빛이 반짝이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었다. 책은 추상적이 아닌 구체적이고 육체적이고 살아 움직이는 말씀 그 자체였다. 여기에서 읽는 일은 부차적인 여흥거리가 아니라 살면서 자신을 발견하고 점화하여 실현하는 일로 승화한다. 이러한 책의 존재론적 지위와 읽기에 대한 존중이 경건하게 느껴진다. 읽고 해석하고 배우고 체화하는 일은 매우 엄중하고 지엄한 일이었다.
문화대혁명이 끝나고 마침내 책이 돌아왔을 때 위화는 고등학생이었다. 그는 친구에게서 "사랑에 대한 책", <춘희>의 필사본을 받아들고 친구와 그 책을 함께 읽으며 필사하여 자신들만의 <춘희>를 소유하기로 한다. 친구가 가지고 온 아버지의 공책에 둘은 릴레이식으로 마침내 이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를 베끼기 시작한다. 꼬박 하룻밤이 걸려 둘의 협동 작전으로 베껴낸 <춘희>는 서로의 필체는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느 불완전인 책이라 반드시 함께 읽으며 자신이 필사한 대목을 이야기해 주어야 했다. 그렇게 위화는 친구와 함께 <춘희>를 읽어냈다. 당시에 읽는 일은 때로 반혁명으로 곡해되었다. 대자보를 읽고 정부의 홍보물을 통해서만 읽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었던 시기가 끝나가며 마침내 위화는 위대한 작가의 초입인 본격적인 읽기의 여정에 힘겹게 가까스로 합류한다. 그 여정은 코믹하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하면서도 '읽기'가 가지는 개인의 성장의 혁명적인 역할에 대하여 생각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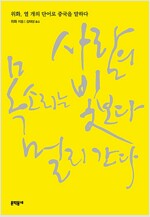
오늘의 텍스트는 본질적인 것이 아닌 것으로 폄하된다. 그것을 밀고 이미지가 떠오른다. 즉각적이고 말초적인 감각을 자극하는 숱한 이미지, 영상들이 읽기가 점유했던 혹은 숙성되어야 했던 공간을 차지하고 성장과 퇴락을 좌지우지한다. 이것에 대한 도덕적 판단은 더이상 관심을 끌지 못한다. 세태는 한편 분명 수긍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그것이 거대한 진실의 눈을 가리고 있다는 점을 자각한다면 무조건적으로 그것에 압도되는 것은 분명 지양되어야 할 지점일 것이다.
여전히 읽는 일은 유효하고 지엄하고 생을 좀더 덜 저질적인 것으로 만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