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 옆 협탁을 정리하다 우연히 에메랄드색 예전 다이어리를 발견했다. 온라인으로 주문한 노트는 기대보다 작아 몇 달을 쓰다 그만 둔 채 뒷부분은 텅 비어 있었다. 일상의 짧은 단상이 마치 다른 사람이 쓴 것처럼 낯설어 놀라웠다. 기록하지 않았더라면 도저히 기억조차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나의 이야기였다니... 무언가를 끄적거린다는 게 그리 쉽게 폄하될 일은 아닌 듯싶다. 그마저도 없다면 과거는 형체 없이 가뭇 없이 사라져 버리고 말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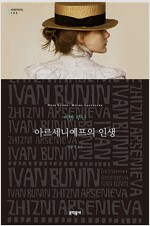
말 그대로 주인공 알렉세이 아르세니예프가 스무 살까지의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서술하는 형태의 인생의 압축이다. 묘사의 밀도가 어찌나 촘촘한지 간만에 문장이 그려내는 풍경 안에 직접 초대 받은 느낌이 황홀했다. 작가 이반 부닌이 볼셰비키 혁명에 반하여 망명한 프랑스에서 집필한 이 장편 소설에는 많은 부분 작가 본인의 인생의 경로가 투영되어 있어 쉽게 장르를 규정짓기 어려워 보인다. 이반 부닌은 러시아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라니 생각보다 우리나라에 덜 알려져 있는 셈이다.
나는 또 아름다운 달밤을 기억한다. 달 아래 남쪽 지평선은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부드럽고 밝았으며, 드높은 창공에는 보기 드문 감청색 별들이 아름답게 반짝였다. 형들은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름답고 행복한 세계이며, 언젠가 우리도 그 세계로 가게 될 거라고 말했다. 이런 밤이면 아버지는 집이 아닌 창 밑의 짐마차나 마당에서 잠을 잤다. 짐마차 위에 건초가 깔리고, 건초 위에 이부자리가 깔렸다. 아버지는 유리창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며 쏟아지는 달빛을 받으며 따스하게 잠을 이룰 수 있는 것 같았다. 그렇게 잠이 들면서 밤새 달빛과 시골 밤과 낯익은 주변 들판과 저택의 평화와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이 최상의 행복이란 생각이 들었다.
이런 대목을 발견하면 나도 어느새 그 아름다운 달밤에 짐마차 위에서 쏟아질 것 같은 감청색 별들을 올려다 보다 까무룩 잠이 드는 상상을 하게 된다. '인식'이 깨어나는 그 순간부터 충실히 복원해 낸 중부 러시아의 몰락한 귀족가문 태생의 소년의 성장기는 그의 눈으로 관찰한 모든 것들의 장막을 뚫고 들어간 예리한 펜이 그려내는 하나의 그림, 움직이는 나날 그 자체다. 두서없이 얘기하는 것 같은 그의 삶에 일어나는 눈부신 모험, 환희, 실망, 사랑, 상실 들의 틈새마다 읽는 이들 나름대로 어떤 기시감을 느끼게 되는 단서들이 흩뿌려져 있다. 지나고 나 미처 언어로 형상화하거나 기억의 창고에 저장해 놓지 못한 수많은 공감의 순간들이 작가의 고백으로 되살아나는 경험은 놀라운 것이다.
나는 사람의 모든 일 가운데 '글쓰기'라고 불리는 가장 이상한 일을 위해 뭔가를 기대하고 생각해내는 생활이 아니라 예정된 일과 걱정거리로 가득찬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오래전부터 부러워했다.
천부적인 시인이었던 작가의 내심이 투영되어 있는 고백 같다. 전심을 다한 관찰을 통해 그것을 언어로 하나하나 옮겨 보려는 처절한 시도는 때로 화자를 지치게 한다. 재능은 때로 천형이다.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 관찰의 대상이 되는 그들 삶의 일상성에 부러움을 표시하는 모습이 안쓰러우면서 작가가 가져야 하는 태도와 책임에 대하여 각성시키는 부분이다. "써야만 한다!"는 강박은 그가 러시아 민중의 모습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일들로 끊임없이 돌아오게 한다. 몰락한 집안, 실패한 사랑의 개인적인 삶과 그가 응시하는 조국 러시아의 모습을 끊임없이 왕복하는 이야기는 지루할 새가 없다.
작가는 이따금씩 이미 늙어버려 조국을 떠난 자신의 현재를 상기시킨다. 그러고 보면 독자는 이 젊은이의 이야기가 노작가 자신의 고백인 건가 싶은 혼란스러움으로 어리둥절하게 된다. 진실은 어디까지인가,는 이 이야기의 핵심이 아니지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은 감각의 향연들이 시간의 경계를 넘나들며 현재의 언어와 만날 때 비로소 듣게 되는 삶의 지도는 그 누구의 것이든 뭉클하다.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 속에서 그것을 발견하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 시간들을 다시 사는 듯한 환각이 결국 현실 그 자체는 아니라는 거리의 탐지 속에서 아득해지지 않을 도리가 없다.
너무 아름다워서 아까운 이야기. 이반 부닌의 이야기를 더 찾아봐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짧게라도 매일의 단상과 인상을 챙겨
야 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