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을 잘 모르고 미술 시간에 데생을 못해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거의 유일하게 항상 볼 때마다 경탄하는 그림이 있다. 이 화가의 그림은 나 같은 회화의 문외한에게도 직관적으로 즉각적으로 와 닿는다. 유심히 들여다 볼 때마다 수많은 의미와 상징이 떠올라 밀려온다. 보는 것만으로 심오한 생과 사랑과 섭리의 메시지를 한꺼번에 전달받는 느낌이다. 도저히 언어로 형상화하기 힘든 감동이다.

클림트 <키스>
클림트. 그의 그림은 도처에 깔려 있다. 퍼즐, 벽, 심지어 가전들에도. 특히 이 <키스>는 너무 흔해서 하찮게 여겨질 법도 한데 생명력이 끝이 없다. 반복해서 보아도 그렇다. 클림트에 대해서는 언젠가 꼭 제대로 알고 싶다고 생각했고 우연히 '빨간책방'에서 소개된 이 책으로 바라던 바를 얻었다. 클림트와 그가 태어나고 살다 죽은 빈을 분리해서는 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사족이 아니다. 실제 저자 전원경은 클림트의 행적을 좇아 빈을 방문하며 그의 생애를 풀어나간다. 클림트는 그림 이외에는 스스로를 표현하거나 기록하는 데에 인색했던 사람으로 그의 생을 재구성하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다. 그럼에도 그가 그린 그림을 실제로 보고 그가 살고 그렸던 곳들을 직접 방문하며 형상화해 낸 한 거장의 삶은 저자의 대상에 대한 정과 존경에 기대어 더없이 생생하다. 지나치게 넓지 않고 과하게 깊지 않아 듣기에도 보기에도 좋다. 클림트를 전혀 몰랐던 관심이 없었던 사람일지라도 이 책을 통해 장식예술가의 아들로 태어나 해체되어 가는 조국의 세기말에 자신의 창조력과 예술적 영감을 묵묵히 표현해 낸 한 남자의 삶과 그의 그림을 보는 일은 즐겁고 뭉클한 일이 될 정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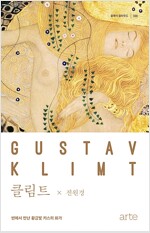
클림트에게 빈은 츠바이크에게 그러했듯 삶의 무대라기보다는 삶의 견인력이자 중추였던 듯하다. 쇄신과 혁명과는 멀리 떨어져 비잔틴의 황금이 발산하던 빛에서 끝내 돌아서지 못했던 모습은 제국과 예술가가 공유했던 옛것에 대한 향수이자 집착이었다. 클림트의 시선은 머나먼 과거로 향했지만 그가 그려낸 여성들의 모습은 지극히 혁명적인 것이었다. 도발적이었고 도전적이었고 농염했다. 그림 속 여자들은 클림트만이 클림트여서 가능한 여전사들이었다. 그의 뒤에는 평생 결혼하지 않았고 일부일처제의 관습 밖에 있었던 에밀리라는 여인이 있었다고 한다. 에밀리는 그녀 자신이 당시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였다. 그녀와 관계는 평생을 끌었고 죽음 뒤에 클림트가 남긴 것들을 수습하는 일도 그녀의 몫이었다.
클림트의 그림을 가지는 일은 불가능하다. 천문학적인 숫자의 금액. 그의 그림의 소유권을 둘러싼 오스트리아와 미국의 개인 소장가의 다툼은 영화화되기도 했다. 대신 그의 그림을 직접 볼 수 있는 날을 꿈꾼다. 그는 죽음을 몹시 두려워했다. 그것은 그의 후기작들에 찬란한 생명력과 대비되는 지점에 그려낸 무자비한 파괴의 징조로 잘 나타나 있다. 그럼에도 그는 불멸을 이루었다. 그림에서는 설명하기 힘든 그가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둥둥 떠다니는 느낌이다. 당시 상류층 여성들이 클림트의 그림 속에 들어가기 위해 그렇게 애를 썼다는 에피소드들은 비슷한 이야기를 암시한다. 그 그림과 그 그림 속에 그려진 자신의 모습은 남을 것이라는 직감에서 그러지 않았을까. 예술은 감히 불멸을 꿈꾸는 죽음을 극복하고자 하는 인간의 열망의 최전선에 있다. 그게 무용한 시도라고 할지라도 그런 것을 꿈꾸는 통로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무의미를 뛰어넘는다.
이미 정점에 선 클림트는 소년 화가 지망생을 만난다. 그는 자신의 재능이 궁금했고 거장은 답한다.
"재능이 많아, 너무 많아"
- 전원경 <클림트> 중
그 아이는 에곤 실레였다. 정점에서 이제 서서히 내려가야 할 사람은 떠오르는 신예를 질투하거나 깎아내리는 대신 아낌없는 찬사를 들려주었다. 이 장면을 상상하면 왠지 가슴이 아릿하다. 자신이 존경하는 사람에게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돌아가는 길, 소년의 가슴은 벅차 올랐을 것이다. 저무는 세상과 이미 완성한 것들이 내어주어야 하는 자리에 대한 이야기다.
클림트가 죽은 모습을을 스케치로 남긴 에곤 실레는 그가 퇴장한 세계를 완성하지 못하고 죽는다. 가슴 먹먹한 후일담이 결론은 아닐 것이다. 황금의 시대를 함께 누리고 그 시대의 퇴로를 함께 걸어간 예술가가 남긴 그림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다. 오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