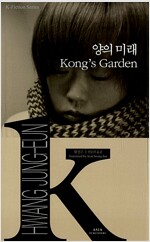황정은 작가의 새책 <연년세세> 사인본에는 이런 글귀로 인사를 전한다.
책 제목도 뭔가 年年歲歲 이렇게 한자로 쓰야 할 것 같은 느낌이다.
해마다 해마다 해마다 해마다.....
이렇게 제목을 읊어보면서 조금씩 조금씩 아껴가며 책을 읽는다.
황정은 작가는 글씨도 예쁘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여기서'라는 저 사인은 뭔가 의미심장한 것 같다.
맞다. 의미심장한 말이었다.
어른이 되는 과정이란 땅에 떨어진 것을 주워 먹는 일인지도 모르겠다고 하미영은 말했다. 이미 떨어져 더러워진 것들 중에 그래도 먹을 만한 걸 골라 오물을 털어내고 입에 넣는 일, 어쨌든 그것 가운데 그래도 각자가 보기에 좀 나아 보이는 것을 먹는 일, 그게 어른의 일인지도 모르겠어. 그건 말하자면, 잊는 것일까. 내 아버지는 그것이 인생의 비결이라고 말했는데.- P146
누구나 삶속에 비밀 한가지쯤은 가지고 있고, 아픈 기억 몇가지쯤은 가지고 있는 것이 산다는 것일게다.
그래도 사람들은 살아가고 그 과정은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아서 땅에 떨어진 것 중 그나마 덜 더러운 것을 골라 먹는게 삶이라는 저 말이 마음에 와 박혔다.
어릴 적 부모를 잃고 동생의 죽음을 겪고, 그 죽음에 죄책감을 가지고 평생을 아둥바둥 살아왔을 순자씨의 삶은 순자씨 개인에게는 스펙터클하고 고난에 찬 행군같은 삶이었겠지만 그 시절 한국인의 보편적인 삶을 생각하면 그리 특별할 것이 없는 삶이다.
그녀의 이름 순자가 그러하듯이.....무수히 많은 순자들이 또한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있다.
개인의 아픈 삶과 고통이 평범한 삶이 되어버리는 지점에 우리 역사가 지나온 시간의 잔임함이 있지 않을까?
나는 가끔 나의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의 삶에 깊은 비애를 느낄 때가 있다.
그분들은 도대체 무슨 재미로 무슨 의미를 가지고 그 신산한 삶을 이어왔을까?
지금은 평범한 할머니로, 그럭저럭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듯해 보이는 두분이 사실은 자신의 삶에서 가장 편안한 황금기가 지금이라는 사실을 문득 문득 깨달을 때마다 한없는 연민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함께 앉아 있을 때면 지나온 이야기들을 지금은 웃어가며 이야기 하시지만 그 되풀이 되는 이야기마다 느껴지는 울분과 슬픔과 억울함이 가슴을 먹먹하게 만든다.
순자씨에게 말하니 못한 이야기가 있듯이 그분들도 차마 말하지 못한 무엇이 있을까싶어 살짝 두려울 때도 있다.
나는 그 이야기들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걸까?
그러나 한영진이 끝내 말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걸 이순일은 알고 있었다.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거라고 이순일은 생각했다. 그 아이가 말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나도 말하지 않는다.
용서를 구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이순일은 알고 있었다.
순자에게도 그것이 있으니까. - P142
그래서 황정은 작가의 저 사인본 메시지는 위로가 되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여기서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다행이지 않은가?
자신의 삶을 살아오지 못하고 늘 누군가에게 무엇인가에 떠밀리며 살아왔을 앞선 세대의 어른들을 생각하면 말이다.
황정은 작가의 책의 3권째 읽었다.
아직 특별히 우와 우와 하게 되는 책은 솔직히 없었다.
그럼에도 계속 읽게 되고 지난 작품들을 다시 찾아서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그녀의 이런 위로 때문인듯하다.


사실상 황정은 작가의 책은 모두가 폭력과 그 폭력에 의해 희생당하는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다.
<야만적인 앨리스씨>에서 앨리시어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일단은 사적인 폭력이다.
물론 그 사적인 폭력이 쏟아지는 조건에는 다른 사회적인 폭력들이 얼기설기 엮여 있다.
폭력은 하나의 폭력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폭력으로 이어진다.
앨리시어는 그 쏟아지는 폭력에 씨발 씨발을 연발하는 것 외에 대항할 무기가 없다.
폭력에 노출된 이가 겪는 고통이 너무 절절해서 이 책을 읽는 것은 고통스러웠다.
같이 씨발 씨발을 읊조리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
<디디의 우산>에서는 폭력과 함께 무엇인가를 잃은, 또는 상실의 순간을 예감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얘기하고 있다.
상실의 고통 역시 폭력에 기반하고 있다.
<야만적인 앨리스씨>의 직접적인 폭력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차별을 전제로 깔고 있는 사회적 시선,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배제되어지는 사람들, 예측하지 못한 사고 등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어디든지 널려있다.
소설은 이들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담담하게 그러나 절절하게 보여주고 있다.
소설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나의 아픔과 그들의 아픔을 동일시하게 함으로써 고통의 연대를 조심스럽게 제안한다.
<연년세세>는 <디디의 우산>에서 그렇게 많이 나아가지는 않은듯하다.
좀 더 일상적이고(그래서 더 비극적이기도 한), 좀 더 삶의 구체적인 순간들을 포착하고 있다.
그래서 이 책은 누구나가 맞아 나도 그렇게 느낀 적이 있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
황정은 작가의 3권의 책을 읽으면서 어쩜 이 작가는 시인의 감수성을 가진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다.
삶의 모든 순간들과 인간의 모든 면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촉각을 곤두세우는 느낌이 있다.
소설가의 감수성이라기보다는 시인의 감수성에 더 맞닿아 있는 느낌이다.
앞으로 어떤 책을 더 써줄까, 작가는 어디까지 더 나아갈 수 있을까를 기대하게 된다.
더더욱 내게는 아직 읽지 않은 작가의 책이 더 남아있다는 것도 감사하다.
문득 황정은 작가가 에세이를 쓰면 어떨까 싶어 찾아봤지만 에세이는 단 한권도 없다.
거기에도 나름 이유가 있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