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이 좀체 갈피를 잡지 못한다. 대통령이 탄핵 되고 이제 순리를 따르듯이 그렇게 기본적인 국민의 의무만 하며 내 생활을 정돈해야지 했는데 이게 뭐 끝이 안 난다. 정신없는 3월과 4월을 보내고 이제 조용히 책도 좀 읽어가며 지내야지 하는데, 손에 책을 잡았다가도 어느 순간 내 손은 또 스마트폰을 들고 온갖 뉴스와 유튜브 영상들을 찾아 헤맨다. 그러다보니 읽고 있던 책도 지금의 사태와 자꾸 연결짓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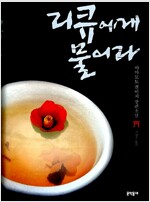
야마모토 겐이치라는 작가의 <리큐에게 물어라>를 읽고 있다. 예전에 서재 지인이 추천해주신 책이다.
소설의 기본 대립 구도는 당대의 권력자 토요토미 히데요시와 센 리큐라는 다도의 대가이다. 정치 권력과 예술 권력의 대립이랄까? 3분의 1쯤 읽은 책이 재미있는데도 자꾸 안 읽히는 건 생각이 자꾸 딴데로 흘러 가서다.
소설 속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주 공간은 주라쿠테이라는 성이다. 정치권력자의 공간은 위압적이고 화려하다. 특히나 칼을 든 무가 권력 중심이었던 일본 중세는 더 그러하다. 교토의 옛 건물들을 보면 제일 먼저 몸체보다 더 커 보이는 지붕으로 방문자를 누른다. 관광객이야 화려한 모습에 감탄할 뿐이지만 최고 권력자를 배알하러 가는 낮은 자들은 일단 입구부터 기가 죽고 들어가는 것이다. 당대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올랐지만 출신성분에 열등감이 있었을 토요토미 히데요시라면 아마 더 그러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란 또 얼마나 섬세한 존재인지 자신조차도 짓눌릴 화려함과 압도적인 권위 속에서만 살아지지는 않는다. 어딘가 편안하게 숨 쉴 공간, 내가 나로서 존재할 공간은 필요한 법이다. 그래서 그들은 엄격한 규율과 압도적인 공간 속에 정말 어울리지 않는 조그만 다실을 만든다. 교토의 웅장한 건물 안에 있는 소박하다기 보다는 초라하다고 말해야 할 공간이 바로 그곳이다. 하지만 토요토미 히데요시에게 그 공간은 자신의 공간이 아니다.
그 작은 다실-4명이 앉으면 무릎이 닿는 1첩 반의 공간은 센 리큐의 공간이다. 그는 일본 다도의 틀을 세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책에 의하면 미의 절대적인 판별자다. 천 개가 넘는 물품 중에 단 하나 명품을 어떻게 알아보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제가 결정할 일입니다. 제가 고른 물품에서 전설이 태어납니다." 라고 답하는 인물이다. 머무는 공간은 외형적으로 소박할 지 모르지만 그가 휘두르는 것은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정치 권력에 맞먹는 예술 권력이다. 그의 권력은 1첩 반의 작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기에 작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는 그 공간에 이르는 길과 그 공간 속에 정교하게 배치한 작은 기물과 그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다도의 과정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무장 해제 시킨다. 그럼으로써 그는 무형의 권력자다.
전국 시대라는 난세기에 이 두 권력이 부딪힌다. 정치 권력은 자신 이외의 권력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 예술 권력 역시 속되고 저질스러운 정치 권력에 굴복하고 싶지 않다. 토요토미는 센 리큐가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고 소중히 여기는 향합을 빼앗음로써 리큐를 굴복시키고 오로지 혼자의 권력의 꼭대기에 존재하고싶다. 그러나 리큐는 가소로울 따름이다. 비록 내가 너의 힘에 무너져 할복할지언정 그것은 굴복이 아님을 굳건히 한다. 이것이 권력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저 리큐는 "이 물건은 저의 옛 연인의 하나 뿐인 유품입니다. 그저 간직할 수 있도록 부디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납닥 업드리면 될 것이다. 그러나 리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연인의 유품이 문제가 아니라 너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는 우월감과 권력이 진정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서 대부분의 국민이 그러하듯 '아 저들은 진정으로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에 진정코 그들의 그 권력욕이 두려워졌다.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직업 윤리조차도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구나. 나의 위치와 권력과 엘리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마지노선도 저렇게 버릴 수 있구나. 그런 이들이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었구나. 어떤 의미에서는 내게는 느닷없었던 계엄령보다도 대법원의 이번 조치가 더 충격적이었다. 삼권 분립을 지켜야 할 그들이 행정부의 선거에 이런 방식으로 개입을 하고 삼권 분립을 정면에서 배신한다고?
정치권력이든 사법권력이든 결국 권력의 속성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우위에 서있다는 우월감이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발버둥이다. 그들에 대한 비판에 대해 네 까짓 것들이 감히라는 그 우월감이 뼛속까지 들어 차 있는 것이다. 자기 세력 이외 모두를 타자로 만들어버리는 저 권력을 위해 그들은 토요토미처럼 치졸한 짓을 서슴치 않고 있고, 또 어쩌면 리큐처럼 목숨걸고 덤빈다는 생각이 들었다. 원래 권력이란 그런 것인가? 하지만 설사 권력의 속성이 그렇다 하여 그것이 옳은 것은 결코 아니다.
선거가 무사히 치러지기를 바랄 줄은 몰랐다. 선거에서 이겨야지 하는 생각만 했지, 그 선거 자체에 이렇게 깽판을 놓을 줄이야....
책을 샀다. 정치인의 책은 산적도 읽은 적도 없었는데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