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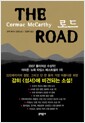
-
로드
코맥 매카시 지음, 정영목 옮김 / 문학동네 / 2008년 6월
평점 :



로드 (Cormac McCarthy, The Road)
이 책을 처음 만났을 때, 저자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란 작품을 썼다는 사실이 내게 매우 고무적이었다. 즉, 이 책을 꼭 읽어 보고 싶었다. 책을 펴서 반쯤 넘긴 후에 내용을 읽었을 때, 아빠와 아들이 함께 매우 위험한 곳에서 피난하는 내용인가 생각했다. 제목의 로드에서 미루어 짐작하니 ‘아 피난길을 뜻하는 것이구나’ 하고 막연히 생각했었다.
드디어 320여 페이지의 역작을 읽기 시작했다. 나는 저자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다. 그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란 영화 속 모습처럼 승자도 패자도 없는 뭔가 허탈하고 ‘모든 인생사 뭐 다 그런 것이지’ 식이 되려나 하면서 한 장 두 장 금세 읽게 되었다. 다른 여느 작가와 달리 장막 구분이 없고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여백도 없다. 꽤나 특이하다. 그런데도 읽기는 참 수월했다. 문장이 짧았고, 긴박감과 궁금함에 연신 집중하게 만들었다.
글에는 시간적 순서가 없다. 시점 또한 고정되어 있지 않다. 대화인지 독백인지 속마음인지도 구분이 없다. 주인공 남자가 한 말인지 남자의 아들인 소년이 한 말인지 구분도 없다. 그저 악몽 속에서 허우적대는 주인공의 의식 흐름에 맡겨진 것 같다. 소설은 확실히 비현실적이다. 영화로 만들자면 너무 참혹하다. 집중이 잘되는 글이지만 아침부터 읽기에는 너무 슬프다. 감정 이입도 잘된다. 꼭 내 아내와 아이와 나 셋이서 3차 대전인지 대지진인지 이후에 살아남아 막연한 희망의 장소 해안으로 향하는 그런 답답한 상황이 계속 그려진다. 하늘의 해는 뭔가에 덮여 항상 우중충하고 땅은 모두 재로 덮여있다. 길에는 온통 문제의 그 사고에 직격탄을 맞고 죽어있는 시체들과 녹아내린 모든 것들. 물도 재로 더럽혀져 있다. 길에서 사람을 만나면 그것이 가장 큰 공포이다. 빈 총이라도 쏘는 시늉을 해야 지나칠 수 있다. 먹을 것이라고는 빈 집을 털어 겨우 찾아낸 곡식의 낫알 몇 개와 유통기한을 알 수 없는 녹쓴 캔. 날씨는 춥고 연료는 없다. 설상 있더라도 불을 여유있게 피울 수 없다. 알 수 없는 적들이 노릴지도, 내일 닥칠 비와 바람을 생각하면 아껴야 돼서... 정말 궁금해진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어 이런 상황이 왔는지. 하지만, 저자는 거기에 대해 전혀 이야기가 없다. 오히려 이런 끔직한 상황에서 시간이 어떻게 가고, 뭣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길을 찾아 나아간다. 아내는 얼마전 자살했다. 총알 3개중 한 개를 쓰고 죽었다. 어차피 좋아지지 않을 상황에 음식도 물도 곧 사라지고 살아남아 남의 밥밖에 못 될 상황에서 그녀는 그렇게 선택했다. 남은 총알 2개. 너무도 의미심장하다. 남자와 소년. 남자는 늘 소년에게 이런다. ‘우리는 지금 불을 옮기는 중이야’ ‘불이 어딨어요’ ‘네 안에 있잖니’ 눈과 비를 해치고 그들이 가는 길에는 3군데 정도의 피난처가 있었다. 안전을 약속할 수 없지만 깨끗한 물과 깨끗한 옷, 음식이 있는 그런 공간이 이동 중 세번 만난다. 나라면? 그곳에서 편하게 지내다가 약해진 의지력에 차츰 다가오는 끝을 생각하면 나도 그곳에 오래 있진 못할 것이다. 남자는 한동안 체력이 떨어지더니 피를 토하는 일이 많아졌다. 설상가상으로 길을 가다 어디선가 날아온 화살로 인해 다리에 10cm 정도의 상처가 났다. 파상풍이 걸린 건 아닐까? 피를 토하니 폐결핵이나 심한 폐렴인가? 죽어가는 남자는 소년에게 ‘불을 옮겨’라고 말한다. 소년은 한참을 울다가 행운과 마주쳤다.
책을 읽는 중에 짤막한 정리를 해보았다.
길은 있는 걸까?
길을 찾아야 하는 것일까?
길을 만들어야 하나?
과연 그 길의 끝은...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은? 즉, 목적지는?
|
책의 끝에 《옮긴이의 말》이 나온다. 저자의 연대를 잠시 이야기 하면서 이 소설과 저자의 인생을 비교한다. 한 가지만 잠시 소개해 본다. 저자의 나이 70세에 늦게 가지 그의 아들은 현재 10살 정도. 소설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소년의 나이를 짐작하게 한다. 소설 속에 『콜라캔』을 처음 본 소년의 모습이 나온다. 이 또한 저자의 인생과 연관이 있다고 한다.
아, 첫 페이지에서 의식 없이 지나친 사실이 있다. 외국 작가들이 보통 작품의 서두에 친구나 가족에 대한 사랑이나 죽은 친지에 대한 그림움을 표현하는데, 저자도 그랬다.
이 책을 존 프랜시스 매카시에게 바친다.
아들이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