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학과 영화는 자주 만난다. 그런데 정작 독자들은 그러한 책의 단단한 이음새들을 즐겁게 맞이하기엔 시간이 녹녹치가 않다. 시간이 남아 돈다고 또 누가 그런 쉽지 않은 눈의 노동을 택하겠냐만은. 그래도 필요하고 어쩔 수 없는 만남들은 꾸준히 이어지는 법이다. 그리고 그러한 만남을 주선하는 작가들에게도 더운 여름 짧은 경의를 표한다.





<영화분석과 기호학>
<영화분석과 기호학>은 어떻게 보면, 기호학과 영화의 FM적인 만남과 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 같다. 메츠의 영화기호학과 히쓰의 마르크시즘적 영화기호학인데, 스티븐 히쓰에 대해선 메츠에 대한 익숙함(단지 이름이라도)에 비해선 생소하다. 영화는 물론 영화포스터를 기호학적으로 분석했다는 책이 있다. <영화, 그 기호학적 해석의 즐거움>인데, 저자(백선기)는 미디어와 기호학에 대한 책을 여러 권 썼다. 이론은 외국 이론이지만, 주로 다루는 영화들은 우리나라 영화들이다. 특히 2장은 기호학과 라캉의 정신분석을 가지고 분석을 시도하는데, 구미가 당기는 부분이다.
기호학보다는 그래도 사람의 정신, 심리와 관련된 건 덜 딱딱한 느낌을 준다. 그러한 정신분석의 은밀한 시선이 영화를 훑는다면 영화는 어떤 신음을 낼까?




라캉의 눈이 되어 영화를 본다는 건 이젠 너무 자주 상영되는 책의 광경이긴 하다. 그러나 누가 어떻게 라캉의 눈을 새로운 카메라 기법처럼 활용하느냐도 중요할 것이다.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이 쓴 글이라면 좀 더 응원을 해주고 싶은 마음도 생긴다. <정신분석의 은밀한 시선>은 임상 경험이 있는 정신과 의사의 책인데, 차례를 꼼꼼히 보니까, 정신분석 그리고 라캉과 궁합이 잘 맞는 영화들이 눈에 들어온다. 저자가 균형 감각이 있어서일까? 외국영화와 동양 그리고 우리나라 영화들이 적절하게, 거기다 흔히 말하는 예술 영화쪽과 대중 영화쪽의 비율도 잘 맞춰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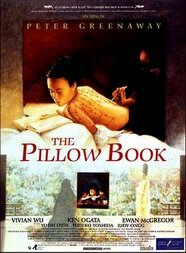
데이빗 린치의 '멀홀랜드 드라이브', 피터 그리너웨이의 낯설고 도발적인 화면 구성이 인상적인 '필로우 북(왼쪽 영화 포스터)', 크로넨버그의 '스파이더', '플라이'와 '데드 링거', 가스파 노에의 '돌이킬 수 없는' 그리고 알마도바르의 '귀향'과 '나쁜 교육'이 무게감 있게 자리잡고 있다. 정신분석과 어울릴 영화인데, 그 씀씀이가 적었던 빠르고 도발적인 츠카모토 신야의 영화들, '6월의 뱀'과 '악몽탐정'도 눈에 띈다(츠카모도 신야 영화에 나오는 여배우들은 다들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 우리나라 영화로는 '장화 홍련', 김기덕의 '시간'과 '활', 홍상수의 '해변의 여인'과 '극장전' 그리고 괴물 같은 흥행작 '괴물'이 있다. 그리고 줄리엣 비노쉬가 나오는 미하일 하네케 감독의 영화 '히든'도 보인다.
***잠깐 딴 길
미하일 하네케 감독이 나온 김에 이 책에는 나오지 않지만, '미지의 코드(Code Unknown)'도 (몽타쥬에 관심이 있다면) 한번쯤 볼 필요가 있는 영화다(여기에도 히든처럼 줄리엣 비노쉬가 나온다). 영화 편집이 우리 입맛(눈맛)과 다르게 움직일 때, 우리가 재구성해야 할 그 황량함은 매우 낯설고도 기이해진다. 그 '편집의 날것'이라는 영화의 거친 살결을 이 영화를 통해 구경할 수 있다. 그리고 앞서 잠깐 언급한 피터 그리너웨이의 '필로우 북'은 일본 문학 작품의 이름이기도 한데, 탐미적인 기호들이 규칙적인 운율을 띠고 입체적으로 살아난다. 특히 프레임 안으로 새로운 프레임들이 생성하는 그 낯선 침입은 처음에 감당하긴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피터 그리너웨이 영화의 또 다른 절정이 담긴 매력적인 영화임에는 틀림없다. 2000년 이후에 만들어진 '털시 루퍼 가방(The Tulse Luper Suitcases)'에서도 이러한 화면 분할 구성을 노골적으로 숨기지 않는다.
잠깐 딴 길 끝***
부제가 '라깡의 카우치에서 영화를 보다'인데, 그러한 생생함과 은밀함이 느껴질만한 친밀감이 날지 또한 궁금하다.
----------------------------------
이 책과 연관된 영화, 감독의 영화들을 몇 개 골라 옮겨본다.
[책과 직접 연관된 영화들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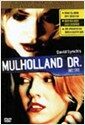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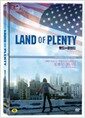


[책에 나온 감독들의 영화 말고 다른 것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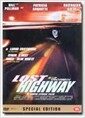
데이비드 린치(David Lynch)의 영화들도 여기 알라딘에 꽤 살아있다. 데이비드 린치를 처음 접한다면, 스트레이트 스토리는 피하는게 좋을 것이다. 너무도 이례적인 린치 영화이므로(갑자기 전원일기 같은 영화를 만들고 싶었나?).. 역시 (좀 어둑컴컴하고 지독한 영화이긴 하지만) 이레이저 헤드를 먼저 보는게 순서가 아닐까. 블루벨벳, 로스트 하이웨이는 다 문제작들이고 정신분석학적으로 감상하기 더 없이 좋은 영화다. 트윈 픽스는 TV 시리즈물에 비해 영화로 만들어진 것은 아무 사전 지식이 없다면, 감을 잡기 어렵다[그외 광란의 사랑(여기에 진짜 니콜라스 케이지가 담겨 있다), 엘리펀트 맨. 듄(사구)도 린치다운 영화들이다. 그러고 보니 린치의 페르조나 카일 맥라클란은 영화 '쇼걸'이후 무기력해진 것 같다].

'요리사, 도둑, 그의 아내 그리고 그녀의 정부(The Cook The Thief His Wife & Her Lover)'라는 영화는 그래도 많이 알려진 편이다. '영국식 정원 살인 사건', '건축가의 배', '차례로 익사시키기', '8과 1/2 우먼' 등 피터 그리너웨이의 영화들은 감독 이름값을 충분히 해내는 것 같다. 아버지는 건축가고 자신은 미술학도 출신 인데, 영화에도 그러한 것들이 반영되는 듯 하다.






 어떤 영화 평론가가 홍상수 감독의 영화가 점점 브뉴엘을 닮아 간다고 한 소리를 들었다. 근데 나로서는 도저히 수긍이 안간다. 물론 성이라는 걸 숨기지 않고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들춰내긴 하지만, 홍상수 감독이 일상에서 개인과 개인의 틈을 탐색한다면, 브뉴엘은 개인과 사회라는 틈을 비집고 들어가지만 그것이 급한 전복을 꾀하기보다 귀족적이고 대가다운 여유가 있다. 즉 브뉴엘은 세속적인 것들을 건드려도 그 방식에서 미학의 궤도를 밑으로 떨구진 않는 것으로 보인다[무엇을 꼭 바싹 다가가서 건드릴 필요는 없다. 강박적으로 좁히는 거리감은 그냥 말 그대로 '일상'이 되고 만다. 그걸 굳이 카메라에 담는 게 무의미해진다. 즉 예술도 '양자(역학)적 긴장'이 유효할 때가 있는 것이다. 어떤 것을 완전히 까발리려는 욕망은 다른 편의 무언가를 여지 없이 놓칠 수 있다].
어떤 영화 평론가가 홍상수 감독의 영화가 점점 브뉴엘을 닮아 간다고 한 소리를 들었다. 근데 나로서는 도저히 수긍이 안간다. 물론 성이라는 걸 숨기지 않고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들춰내긴 하지만, 홍상수 감독이 일상에서 개인과 개인의 틈을 탐색한다면, 브뉴엘은 개인과 사회라는 틈을 비집고 들어가지만 그것이 급한 전복을 꾀하기보다 귀족적이고 대가다운 여유가 있다. 즉 브뉴엘은 세속적인 것들을 건드려도 그 방식에서 미학의 궤도를 밑으로 떨구진 않는 것으로 보인다[무엇을 꼭 바싹 다가가서 건드릴 필요는 없다. 강박적으로 좁히는 거리감은 그냥 말 그대로 '일상'이 되고 만다. 그걸 굳이 카메라에 담는 게 무의미해진다. 즉 예술도 '양자(역학)적 긴장'이 유효할 때가 있는 것이다. 어떤 것을 완전히 까발리려는 욕망은 다른 편의 무언가를 여지 없이 놓칠 수 있다].
오! 수정을 뒤늦게 봤는데, 여배우 이은주에 대해 아련한 감정이 들었다. 이 영화와 주홍글씨라는 영화가 번갈아 가며 이은주의 이미지를 맥박치듯 연결짓는데, 영화 배우 이은주가 아닌 여자 이은주가 그녀에게 더 크질 않았을까하는 생각을 해본다. 여자로서도 배우로서도 참 아까운 사람이다.
*덧붙임* 브뉴엘(루이 브뉴엘, 루이스 부뉴엘.. 정확한 발음을 알고 싶다!)의 <안달루시아의 개>를 시중에서 구할 수 있다니 놀랍고도 다행스럽다. 살바도르 달리와 같이 작업한 이 영화는 첫 장면에서 직접 출연한 브뉴엘을 만나 볼 수도 있다. 그리고 눈알을 베는 전설이 되어 버린 장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