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퀀트]를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퀀트]를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

-
퀀트 - 세계 금융시장을 장악한 수학천재들 이야기
스캇 패터슨 지음, 구본혁 옮김 / 다산북스 / 2011년 7월
평점 :




2008년 9월 미국에서 촉발되어 전세계 경제계를 뒤흔든 금융대공황은 그 규모나 파급력에 있어서 1929년의 대공황 이후 근 100년 만의 최대 규모의 경제적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연방 준비 위원회가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마구잡이로 찍어서 뿌린 천문학적인 달러가 얼마 전 결국 미국 자체를 지급 불능 위험에서 비롯된 신용 등급 강등이라는 초유의 사태로까지 몰아넣었고, 당시에 뿌려진 막대한 달러들은 3년 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여전히 전세계 경제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위협을 두텁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1929년의 대공황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과거의 대공황이 생산과 소비의 심각한 불균형에서 비롯된 현상이었던 데 비해, 2008년의 공황은 ‘금융’이라는 단어가 앞에 붙어있는 데에서 단적으로 알 수 있듯이 실물 경제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실문 경제 이전에 전산화-디지틀화된 자본의 움직임인 금융 시스템에서 발생했다는 것이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2008년 금융대공황의 실질적인 촉발점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부실과 붕괴였지만, 이런 서브프라임 대출이 붕괴된 것은 사실 대공황을 일으킬 정도의 파급력을 가진 문제는 아니었고, 서브프라임 부실 대출이나 대출 회수 불능이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점 자체도 아니었습니다. 대공황의 배후에 존재하면서 대공황으로까지 사태를 확대시킨 근본적인 문제점은 바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을 채권으로 변환시켜 유통시키면서 촉발된 파생 채권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디지틀화, 전산화된 현대 금융 제도라고 하더라도, 은행과 증권사는 물론 연준과 금융 감독 관청들조차 그 규모와 실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을 만큼 실체가 불분명하고 형태도 오리무종인 파생 채권을 비롯한 파생 상품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어져 어떤 경로로 유통되었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스캇 페터슨은 금융대공황의 근본적인 문제점인 파생 상품 문제를 뿌리까지 세밀하게 파고들어간 끝에 현대 금융계와 증권계를 좌우해 온 하나의 세력을 발견해 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샅샅이 분석하여 규명한 책이 바로 < 퀀트 The Quants >입니다.
퀀트는 수학과 통계학을 비롯한 계량적인 방법을 주식 거래에 응용하여 투자 법칙을 찾아내고, 이를 토대로 컴퓨터를 이용해 프로그램을 구축해 투자를 하는 일단의 트레이더들을 말합니다. 2000년대 초에 월스트리트를 장악한 이들 퀀트들은 이전까지 월스트리트에서 투자의 전설을 이룩했던 워렌 버핏이나 피터 린치 같은 전통적인 가치투자자들과는 정반대로, 기업의 가치나 실적, 발전 가능성 같은 실질적인 경제 지표나 기업의 이미지, CEO의 능력, 직원들의 사기, 소비자들의 인식 같은 다양한 요소들을 일절 무시하고 오직 수치와 통계에 입각한 기계적인 분석만으로 월스트리트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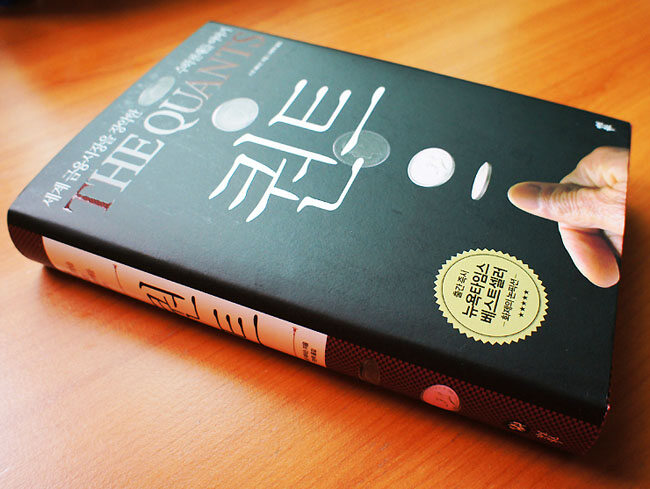
이 책은 1960년대에 처음으로 수학적 통계 방식을 투자에 적용함으로써 퀀트들의 대부가 된 에드 소프를 필두로 하여 르네상스 테크놀러지의 대표인 제임스 시몬즈, 모건 스텐리의 피터 밀러, 시타델 인베스트먼트의 대표인 캔 그리핀, 도이치 뱅크의 파생상품 트레이더인 보아즈 웨인스타인 등 1990~2000년에 대학에서 수학과 통계학을 연구하던 탁월한 수학적 두뇌들이 자신들의 수학적 재능으로 월스트리트의 주가와 주식 움직임을 종합하고 분석하여 철저한 수학적 분석을 토대로 투자 전략을 세우고 운용함으로써 순식간에 막대한 부를 거머쥐는 과정을 전반부에서 보여줍니다.
하지만 기업의 실적과 경제의 실질적인 움직임을 반영해야 할 주가가 그런 실질적인 요소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단지 수학적인 통계와 수치로만 치환될 때 그것은 이미 경제적 사고가 아닌 도박이 되고 맙니다. 실제로 퀀트들의 상당 수는 카드 도박에 수학적인 논리를 사용했던 인물들이기도 합니다. 퀀트들은 시장은 스스로 균형을 유지한다는 ‘효율적 시장 가설’을 신봉하지만, 실제 시장은 전혀 효율적으로 균형을 유지하지도 않고, 때로는 ‘검은 백조’가 출현하기도 합니다.
살아 움직이는 사람들에 의해 운영되는, 역시 살아 움직이는 시장을 멀리 떨어진 실험실에서 수치와 통계로만 파악하고 통제하려는 퀀트들의 야심은 결국 롱텀 캐피틀의 부도를 시작으로 예정되었던 거대한 파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들이 단순한 개인 투자자들이 아니라, 모건 스텐리나 도이치 뱅크 같은 거대 금융 회사와 거대 해지 펀드들에서 막대한 자본을 주무르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이고, 이들의 투자 실패는 결국 초거대 금융사와 펀드들의 연쇄 도산과 그로 인한 전세계 주식 시장의 붕괴를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 퀀트들이 한결같이 시카고 대학 경제학과에서 수학했다는 사실입니다.
밀턴 프리드먼이 이끄는 시카고 학파는 효율적 시장 가설을 신봉하며 무제한적인 자유 시장 정책을 강력하게 주장해 왔습니다. 문제는 이들의 주장이 단순히 하나의 경제학파의 주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보수파들과 연계하여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의 강력한 이론적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해왔다는 점입니다. 자본가들에 대한 무제한적인 혜택과 국가의 역할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과 거부, 복지와 사회 간접 자본의 축소 등의 극단적인 자본의 논리에만 입각한 주장은 결국 빈익빈 부익부의 경제 양극화를 낳았고, 부시 정권 하에서 미국 경제를 극도의 부실함으로 밀어 넣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시카고 학파는 자본가들의 이익을 위해 가상의 자본을 창출하는 장치를 고안해 냈는데, 그것이 바로 주식 선물 시장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선수금으로 주식을 공매도-공매수함으로써 실체하지 않는 금융의 흐름을 가상으로 창출해 내는 이런 주식 선물 거래소가 처음 문을 연 것이 시카고였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카고 경제학파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퀀트들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명백한 부실 채권이나 증권을 이리저리 합하고 변형시켜 멀쩡한 우량 주식이나 채권으로 탈바꿈하여 유통시키는 파생 상품이라는 극도로 기이하고 위험한 물건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1929년 대공황 이래 최대 규모인 2008년의 금융 대공황이었던 것입니다.
이 책은 금융 대공황의 바탕에 있는 1990~2000년대 초반 월스트리트를 휩쓸었던 계량주의적 분석 투자자들의 탄생과 성장, 그들의 전략과 시스템을 초창기부터 샅샅히 조사하여 정리해 넣음으로써 금융 대공황의 뒤에 존재하던 실질적인 원인과 월스트리트의 위험한 경향을 생생하게 묘사해 들려줍니다. 경제와 주식에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올해의 필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haj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