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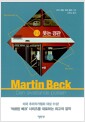
-
웃는 경관 ㅣ 마르틴 베크 시리즈 4
마이 셰발.페르 발뢰 지음, 김명남 옮김 / 엘릭시르 / 2017년 11월
평점 :



이 소설로 이 두 사람의 작가들에게 완전히 빠지게 되었다. 경찰이 주인공인 소설, 추리소설을 좋아하지만 그렇다고 다 내 마음에 들 건 아니었고, 주인공인 마르틴 베크가 아주 매력적이고 영웅적인 인물로 그려진 게 아니라 좀 떨떠름했는데, 이 책으로 나를 완전히 사로잡은 셈이다. 마르틴 베크는 여전히 뚱하고 스웨덴의 스톡홀름은 마냥 춥고 스산하게만 여겨지는데도 나는 그곳에 가 보고 싶어질 지경이다. 그리고 형사들이 수사를 하기 위해 떠돌던 거리거리들을 한 곳씩 헤매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소설일 줄이야.
마르틴 베크 시리즈 중 아직 안 읽은 작품으로 세 권이 남아 있다. 사라진 소방차, 폴리스 폴리스 포타시스모스, 잠긴 방. 한꺼번에 빌려서 연달아 읽으려고 한다. 이번에는 읽으면서 메모를 해야겠다. 수사하다가 얻은, 이게 도움이 되는 것일까 어쩔까 싶은, 그러나 분명히 아무 역할 없이 등장시킨 것은 결코 아닐, 단서로 쓰이는 자잘한 소재들을 무심히 넘겨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전 같았으면, 다른 작가의 글이었으면, 기억이 나면 나는 대로 잊으면 잊은 대로 그냥 봤을 텐데, 이 작가들의 글에서는 하나하나 붙잡고 따라가고 싶어졌다. 이게 또 읽는 재미 하나일 테니까.
같이 일하던 부하 경찰이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 왜 죽었을까, 왜 거기 있었을까. 사건은 여기서 시작되고, 길고 긴 시간이 노력이 든다. 소설 마지막에 이르러 발견된 소재마저 황당하고 놀라워서 더 재미있었고. 경찰은 어떤 이들인가, 이 소설을 보는 동안에는 경찰에 대해 존경심을 잃지 않을 수 있어 좋았다. 능력 있고 훌륭한 경찰이 세상에는 훨씬 많겠지만 그렇지 않은 소수의 나쁜 경찰 때문에 전체의 이미지를 떨어뜨린다는 게 안타까울 뿐. 비단 경찰만 이러한 것도 아니겠지만.
마르틴 베크 주변의 동료 경찰들. 시리즈를 이어 읽다 보니 다들 멋진 전문가들이다. 직업 현장에서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인데 가정에서는 그렇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도 참 인간적으로 다가온다. 스웨덴 남자나 우리나라 남자나 1960년대 남자나 2020년대 남자나, 반대로 여자의 사정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무조건적인 영웅의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닌데도 나는 반한다. 사람에 대한 매력을 느낀다는 건 살아가는 데 참 중요한 요건이 되는 것 같다. 매력 있는 사람을 만나는 만큼 생이 풍요로워질 테니까. 소설 속 세상에서라도. (y에서 옮김2023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