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신작이 나왔다.
우선,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신작이 나왔다.
예전에 그의 소설을 몇권 읽어 준적이 있다. 이를테면, <개미>나 <뇌>, 또는 <나무>,<타나타노트> 같은.(그래도 제법 읽었네) 



하지만 난 오래 전, <나무>를 읽은 후 그의 소설을 더 이상 읽지 않고 있다. 교양 과학 소설쯤으로 읽혀지고 있는 듯한데, 그는 우리나라에 제법 인기가 많은 작가다.
 몇년 전, 르 클레지오가 노벨 문학상을 받기 1년 전, 나는 그의 <혁명>출간 기념 강연회에 간적이 있었다. 그때 새롭게 안 건,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아시아인인지, 한국 비하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어쩌다 그런 발언을 하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확실히 유감이긴 하다. 한국이 그토록 좋아하는 작간데 말이다.
몇년 전, 르 클레지오가 노벨 문학상을 받기 1년 전, 나는 그의 <혁명>출간 기념 강연회에 간적이 있었다. 그때 새롭게 안 건,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아시아인인지, 한국 비하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어쩌다 그런 발언을 하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확실히 유감이긴 하다. 한국이 그토록 좋아하는 작간데 말이다.
꼭 그 이유만은 아니겠지만 난 어쨌든 읽지 않는다. 뭐, 싫으면 그 사람을 싫어해야지 작품까지 싫어할 이유는 없지 않은가? 그러고 보니 책에서는 이렇게 적용이 되는 구나. 법에선, 그 사람의 죄를 싫어해야지 그 사람 자체를 싫어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말이다.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최근 안중근의 일대기를 연재하고, 책으로 출간한 이문열도 똑같이 
 적용해 줘야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다. 사실 이문열은 사람에 대한 평가는 별개로 그의 작품에 대해선 뭐라고 불평하기 힘들다. 나 역시도 그의 이번 작품은 읽고 싶은 생각이 든다. 그것은 솔직히 이문열이기 때문이라기 보단, 안중근이란 인물을 알고 싶단 욕구가 더 크다. 그런데 그게 다른 작가가 썼다면 또 어땠을까? 분명한 건, 난 이문열이 썼다고 해서 읽기를 망설이거나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단지 시간이 허락되지 않을 것이 안타까울 뿐이지. 오히려 이문열이기 때문에 읽고 싶은 마음이 더 들기도 한 건 사실이다. 어디까지나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차치하고 말이다.
적용해 줘야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다. 사실 이문열은 사람에 대한 평가는 별개로 그의 작품에 대해선 뭐라고 불평하기 힘들다. 나 역시도 그의 이번 작품은 읽고 싶은 생각이 든다. 그것은 솔직히 이문열이기 때문이라기 보단, 안중근이란 인물을 알고 싶단 욕구가 더 크다. 그런데 그게 다른 작가가 썼다면 또 어땠을까? 분명한 건, 난 이문열이 썼다고 해서 읽기를 망설이거나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단지 시간이 허락되지 않을 것이 안타까울 뿐이지. 오히려 이문열이기 때문에 읽고 싶은 마음이 더 들기도 한 건 사실이다. 어디까지나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차치하고 말이다.
말이 조금 빗나가긴 했지만, 베르나르에 관해서 얼마 전 새롭게 안 사실은 그는 매일 새벽에 읽어나 하루 4시간 반씩 글을 쓴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몸에 밴 것으로 30년 이상 해 온 거란다. 습관이 무섭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글을 내는 것이겠지. 그의 작품이 어떤 평가를 얻건, 난 이런 사람 보면 존경을 보낸다.
 교양 과학 소설이라면, 이책은 어떨까?
교양 과학 소설이라면, 이책은 어떨까? 
우리에게 잘 알려진 <한밤중에 개에게 일어난 의문의 사건>의 작가 마크 해던의 작품이라고 하는데, 이책에 대한 여러 수식어가 많지만, 옥스포드 타임즈의 드라마에 빠진 어른들과 게임에 중독된 청소년들을 책 앞으로 불러 앉혔다!란 말이 눈에 확 들어온다. 도대체 어떤 책이길래...?

페미니즘 소설가로 알려진 이경자씨가 <빨래터>란 소설을 냈다고 한다. 이건 작가가 이제까지 추구해 온 페미니즘과는 달리 얼마 전, 위작 논란이 있었던 '빨래터'를 그린 박수근 화백과 그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라고 한다. 이를테면, 아버지와 아들이란 애증의 관계를 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썼을지 궁금하긴 하다.

내가 지난 주 발견한 엄청난 가격의 소설이다. 무려 정가가 36,500원이다. 10% 디씨해도 3만4천원 대. 두께는 600쪽이 조금 안되는데. 왤케 비싼 것일까?
그나마 이건 1권에 대당하는 것이고, 아직 2권이 나오지 않았다. 말에 의하면, 20세기의 유럽문화의 대표적 미완성 소설이라고 하는데 그러고 보면 조이스나 프루스트가 생각나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조이스나 프루스트만큼 읽을 엄두는 나지 않는다. 그냥 눈도장만 찍는 수 밖에.(게다가 이책은 일시 품절이고, 4월에 다시 나올 거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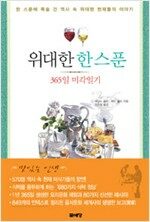
책 소개를 보면, 타이타닉호 침몰 직전 최후의 성찬, 도망치면서도 갈비를 포기하지 못한 루이 16세와 마리 앙트와네트의 마지막 식사 등 역사 속 위대한 천재들의 음식문화 세계사를 담고 있다고 한다.
365일 미식가 일기를 통해 풍성한 요리 레시피뿐 아니라 삶의 지혜, 문학적 쾌락, 역사의 순간에 감춰진 음식 일화 등 요리에 울고 웃었던 천재들의 성공과 재앙까지 엿볼 수 있다고 하니 급땡긴다.
그에 비해 책표지는 그다지 땡기지는 않는 편.
 이책은 몇년 전 사 놓고 읽지 못한 책이다. 사실 내가 말하려 하는 것은 이책에 관해서가 아니다. 반대로, 빨리, 빨리가 인간을 어떻게 만들어 놨는지 알고 싶은 것이다.
이책은 몇년 전 사 놓고 읽지 못한 책이다. 사실 내가 말하려 하는 것은 이책에 관해서가 아니다. 반대로, 빨리, 빨리가 인간을 어떻게 만들어 놨는지 알고 싶은 것이다.
이것은 지난 주, 나는 예스24를 통해 책 한권을 주문 했었다. 그짝 동네도 알라딘과 똑같이 당일 배송 시스템을 자랑하고, 나 같은 경우 하루 늦은 배송을 시켰는데 무슨...개뿔! 이틀만에 도착했다. 결국 알라딘과 별반 다를바 없는 배송 시스템을 자랑한다고나 할까? 도찐개찐이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가 왜 이것에 대해 열받아 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예전에 내가 처음 알라딘을 이용했을 때 이틀은 기본이었고 3,4일만에도 받았던 것으로 안다. 그 시절엔 또 그래야만 하는 줄 알고 느긋하게 기다렸었다. 그런데 당일배송하고 나서는 덩달아 마음이 급해졌다. 그래서 약속한 시간에 도착이 안되면 화가 나고, 비난하고 싶은 것이다. 이건 아무래도 회사나 고객 둘 다에게 그다지 좋은 것은 아닌 듯 하다. 적어도 고객인 나로선 이것 때문에 혈압 올릴 필요 없지 않은가?
나중에 마케팅 연구하는 사람들 <당일배송 시스템이 고객의 정서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뭐 이런 논문 하나 쓰게 되는 것은 아닐까 싶기도 하다. 그건 정말 고객이 원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말이다.
이를테면, 고객이 원하는 건 (전에도 말했지만) 속도전이 아니다. <마춤형 고객 서비스>였지. 아무 때 건 고객이 원하는 날 배송하는 것. 그것이 당일이건, 다음 날이건, 일주일 후건 간에 말이다. 시간까지 마쳐주면 금상첨화겠지.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몇년 전, 알라딘 내에선 '생일 이벤트'라는 것을 했었다. 즉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자기가 읽고 싶은 책 몇권을 올리고 생일을 빙자하여, "이책 사주세요!" 떼 쓰는 것이다. 그러면 친한 알라디너가 책을 사주고, 또 그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이벤트를 하면 서로 사 주는 것이다. 뭐 나름 재미 있는 이벤트였다고 생각한다. 나 역시도 그 이벤트 대열에 끼어 책 받는 즐거움을 톡톡히 누렸는데, 덕분에 쌓이는 건 알라딘 책상자였다. 그것을 보면서 이것을 한꺼번에 취합해 한날 받아 볼 수는 없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지금은 그런 게 없어져 아쉽긴 한데, 대신 <오늘 딱 하루만 반값>이라는 것도 그렇다. 물론 나는 해당사항이 없긴 하지만, 예를들어, 내가 원하는 책을 월요일에 반값으로 살 수 있는데, 화요일에도 사야한다. 같은 배송 연짱 이틀 시키는 거 좀 미안하기도 하고, 번거롭기도 하다. 그게 아니더라도 배송되는 날 내가 받을 없는 상황일 수도 있지 않은가?
어쨌든 내게 맞는 마춤형 서비스라면 좋을 텐데, 누가 시키지도 않고 '당일 배송' 스스로 자랑하고 지키지도 못하면서 대신 고객들 혈압 올리는 거 확실히 고려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난 더 이상 이놈의 배송 문제 가지고 왈가왈부 안하기로 했다. 그냥 천천히 살아 볼란다.
추기: 나는 며칠 전, 중고샵에서 책을 두 권 샀다. 이건 알라딘 배송이 아니고, 회원간 직거래로 샀다. 예정대로라면 토요일 도착 예정인데, 오늘 도착했다. 생각 보다 빠른 배송이다. 차라리 느긋하게 기다리니 오히려 괜찮다는 생각이 든다. 몇번 이용하지는 않았지만, 알라딘 중고샵은 참 마음에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