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우리 영화 <기생충>이 세계 주요 영화제를 석권하고 마침내 미국의 아카데미까지 넘보고 있을 때, 미국의 한 원로 배우가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그는 다름 아닌 커크 더글라스다. 향년 나이 103세. 고인에겐 예의가 아닌 줄 알지만 난 그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줄 알았다. 그도 그럴 것이 그와 비슷한 시기에 영화 활동을 같이했던 영화인들이 이미 오래전에 타계했기 때문에 그도 그러려니 했던 것이다.
커크 더글라스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글쎄, 우리나라에 TV가 보급되기 시작하고 외국 영화를 안방에서도 보는 것이 가능해졌을 때(대략 1970년대에) 우리에겐 <주말의 명화>와 <명화 극장>이라 일컫는 세대가 있었다. 바로 그때 자신의 존재를 부각했던 1 세대 배우라고 하면 설명이 가능할까. 아무튼 그의 부고 소식을 들으니 같은 시기에 활동했지만 이미 이 세상을 떠나간 배우들이 필름처럼 뇌리를 스쳐지나갔다. 이를테면 앤서니 퀸이나 록 허드슨, 엘리자베스 테일러, 오드리 헵번 등등의 배우가. 그들은 정말 화면 안에서 빛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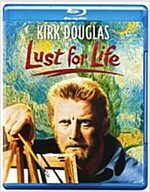 그가 빈센트 반 고흐로 분하고 나왔던 1956년작 <열정의 랩소디>란 영화는 정말 볼만하다. 사실 이 영화 이후에도 고흐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는 이렇게 저렇게 생각보다 많이 만들어졌다. 드라마도 있는 것으로 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러빙 빈센트>가 아닌가 싶다. 이 작품에 찬사를 아끼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나 개인적으론 실사에 고흐의 필치를 살렸다는 측면에서 기술의 승리를 보여준 건 맞지만 때문에 오히려 감동은 좀 반감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 보단 모든 고흐 전기 영화의 아버지 격인 이 <열정의 랩소디>가 오히려 인물에 충실해 보인다. 특히 커크 더글라스가 연기한 고흐는 정말 그가 살아 있다면 과연 저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게 몰입도가 상당히 좋다.
그가 빈센트 반 고흐로 분하고 나왔던 1956년작 <열정의 랩소디>란 영화는 정말 볼만하다. 사실 이 영화 이후에도 고흐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는 이렇게 저렇게 생각보다 많이 만들어졌다. 드라마도 있는 것으로 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러빙 빈센트>가 아닌가 싶다. 이 작품에 찬사를 아끼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나 개인적으론 실사에 고흐의 필치를 살렸다는 측면에서 기술의 승리를 보여준 건 맞지만 때문에 오히려 감동은 좀 반감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 보단 모든 고흐 전기 영화의 아버지 격인 이 <열정의 랩소디>가 오히려 인물에 충실해 보인다. 특히 커크 더글라스가 연기한 고흐는 정말 그가 살아 있다면 과연 저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게 몰입도가 상당히 좋다.
우리는 흔히 고흐를 두고 고독의 화가라고 말한다. 왜 그를 두고 그렇게 말하는 걸까. 잘 알다시피 그는 그림을 그리는 것 외에 모든 것이 서툴렀다. 친구와의(화가 세잔) 우정을 지켜나가는 것도 서툴렀고, 사랑은 더더욱 그랬다. 고흐는 사촌 여동생을 사랑했지만 그녀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몰라 아쉽게도 사랑을 고백하는 순간 잃어야 했다. 누가 보면 사랑은 밀당인데 그런 테크닉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비웃고 싶은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사랑이 어디 테크닉만 가지고 되는 것일까. 사랑을 고백했다 거절당한 그를 보면서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데 못해도 한 번 정도는 더 노력해 봐야 하는 건 아니냐고 한다면 그건 어쩌면 그는 물론이고 상대에게도 모독하는 말인지도 모르겠다.

그 영화를 봤을 때 나는 문득 <봄. 봄>과 <소낙비>의 작가 김유정을 떠올렸다. 그는 대지주의 아들로 태어났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죽고 서울로 이사를 하면서 집안이 급격히 기울었다. 그는 7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난봉꾼인 형과 고집불통에 수전노의 아버지가 서로 불화하는 것을 보며 우울한 소년이 되어갔다. 그러다 아버지가 사망하고 만다. 어머니를 여읜 지 2년 만의 일이다. 그는 아버지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이나 마찬가지로 받아들였다고 한다. 아직 죽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나이었을 텐데 그러고 보면 그는 소년 시절부터 감수성이 유달리 예민했던 것 같다.
형은 아버지와 불화했지만 유정에게만큼은 잘해 주었다고 한다. 형이 술과 여자에 빠져 가족들을 못살게 굴었을 때도 그만큼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다. 형이 재산을 거덜내고, 고향인 강원도 실레 마을 이혼한 둘째 누이 집에 얹혀사는 신세가 되었을 때 사랑이 찾아왔으니 상대는 박녹주였다. 박녹주는 김유정 보다 나이 많은(그래 봐야 두 살 연상이다) 화류계 판소리 명창이다. 하지만 둘은 어울리지 않은 짝이었고, 그의 유일한 친구였던 소설가이자 평론가인 인회남은 악몽에서 깨어나라며 충고를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김유정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박녹주에서 열정을 쏟아부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담배 연기 가득 찬 방에서 밤낮없이 연애편지에만 매달렸고, 나중엔 자신을 안 만나 준다고 그녀에게 협박과 공갈까지도 서슴지 않았다. 게다가 '박녹주를 사랑한다'라고 혈서까지 써서 일기장에 간직하기도 했단다. 이쯤 되면 집착을 넘어 광기가 느껴지기도 한다. 훗날 그의 집착적 짝사랑은 끝나긴 했지만 몇 년 후, 박봉자라는 여인을 사진만 보고 반하여 열렬한 구애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고 한다. 물론 결과는 실패다.
이런 김유정에 대해 이 책의 저자는 아마도 그가 일찍 어머니를 여읜 데서 온 외로움 때문일 거라며, 실제로 그는 평생 어머니의 사진을 가슴에 품고 다니면서 어머니를 그리워했다고 한다. 뿔뿔이 출가해버린 누이들에게서는 예전과 같은 애정을 기대할 수 없기도 했으니 한편 이해할 것도 같다. 그렇다면 사진으로만 본 박봉자란 여인에게 사랑을 퍼부었던 것도 그녀가 그의 어머니를 닮았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이 정도라면 고흐는 김유정에 댈게 아닌 것 같기도 하다.
김유정의 집착이나, 고흐가 훗날 자신의 귀를 자르는 광기까지 둘의 공통점은 우리가 미쳐 다 헤아릴 수 없는 고독 속에서 자신의 예술 세계를 구축해 갔다는 점일 것이다. 고독이 예술에 절대적인지 그건 알 수가 없다. 하지만 둘은 우리가 인정해 줄 만한 예술가임엔 틀림없다. 하나는 미술에서, 하나는 문학에서. 그리고 이들의 생애는 그저 하나의 이야기로만 접할 수 있는 우리는 그저 쓸쓸함으로 그들을 기억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