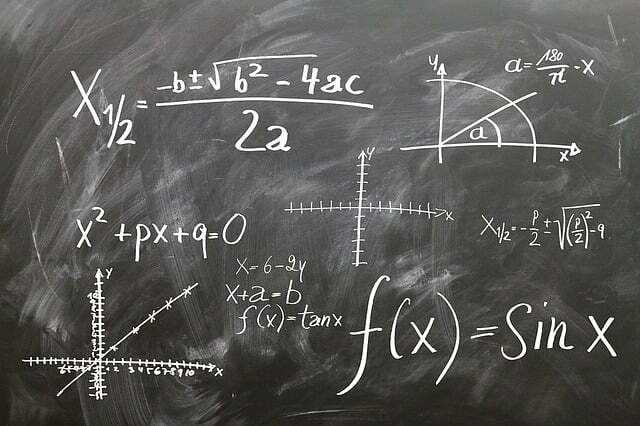우선 저자가 말하는 ‘종교’가 무엇인지부터 설명해야 한다. 책 초반에 길게 이 내용이 설명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 부분에서 많은 반박이 있었기 때문인 듯하다. 흔히 종교라고 하면 무슨 종교적 의식에 참여하고 하는 것들을 떠올리는데, 우리가 (피타고라스의 그의 신자들처럼) 숫자나 양자를 그런 식으로 숭배하지는 않으니까.
먼저 저자가 말하는 신적인 것의 핵심은 그것이 인격적인 것인지, 선한지, 예배를 받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그것이 “무조건 실재하는 것으로 간주되는지”다. 어떤 것이 “종교적”이라는 말은 이런 “근원적 실재”를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게 종교적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것은 증명을 통해서가 아니라 일종의 전제로서 우리의 사고에서 작동하기 때문이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 1+1=2라는 공식을 바라보는 관점들에도 분명 차이가 존재한다. 수-세계 이론에 따르면 이 수식은 실제 세계 속에 존재하는 어떤 것(진정한 실재)을 가리키는 상징이다. 라이프니츠는 이것이 “영원하고 필연적인 진리로, 세계가 파괴되어 계산될 수 있는 물체와 그것을 계산할 수 있는 인간이 사라지더라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서 “진정한 실재”는 분명 종교적인 전제/믿음이다.
반면 존 스튜어트 밀은 숫자를 감각적 지각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오직 인간이 감각할 수 있는 것만 존재한다고 보았기에, 1+1=2라는 공식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우리가 관찰할 때마다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의 라이프니츠와 달리 숫자를 계산할 사람과 계산될 수 있는 사물이 사라지면 이 공식은 무의미해진다. 밀의 주장에서는 인간의 감각이 신적인 존재로 올려진다.
버틀런트 러셀은 또 다른 설명을 한다. 밀처럼 러셀 역시 그는 1+1=2라는 수식의 배경에 영원한 무엇이 있다는 식의 설명을 거부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를 단지 감각적 경험의 문제로 보면 여기에서 확실성이 흔들린다는 점을 포착했고, 결국 수학을 감각이 아닌 논리로 정의하려고 했다. 즉, 수학은 논리를 개진하는 방식이라는 것. 러셀에게 신적인 것은 논리적 양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