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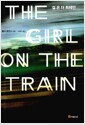
-
걸 온 더 트레인
폴라 호킨스 지음, 이영아 옮김 / 북폴리오 / 2015년 8월
평점 :

구판절판

소설을 읽는 내내 주인공의 행동, 일상, 생각에서 도무지 발을 뺄 수가 없었다.
이토록 처절하게 자신을 방임하는 여자가 있을까 싶을 정도다.
매일 아침 기차를 타고 어딘가를 갔다가 정해진 시간에 돌아온다. 그런데 그 생활 자체가 불안불안하다. 의미가 없다.
레이첼의 삶이 이렇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생각했던 것이 언제인가 싶은 여자이다.
레이첼의 일상을 쫓아가는 독자의 눈은 자꾸만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고 싶다.
그럴 정도로 레이첼의 삶은 의미 없는, 그리고 스스로 바닥을 치는 인생을 살면서도 그것이 절망이라는 것조차 느끼지 못하는 레이첼의 무덤덤함과 현실 회피에 짜증이 난다.
과거의 레이첼은 그렇지 않았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인가 삶이 꼬였다. 남편과 이혼을 하였고, 친구에게 겨우 얹혀사는 삶이 되어버렸다. 알코올중독자가 되었고, 직장에서는 해고가 되었다.
자신을 일으키기 위한 도움도 생각하지 못하는 미련퉁이로 살아가고 있다.
그런 레이첼의 시선을 끄는 유일한 것이 기차 차장 밖으로 보이는 집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끔 등장해주는 배우(레이첼이 이렇게 여긴다)를 보면서 자기만의 스토리를 이어가는 정말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유일한 낙이다.
<걸 온 더 트레인>에는 또 다른 두 여자 메건과 애나가 있다.
그들은 그들 나름의 삶을 살아간다. 때론 행복하게, 때론 무의미하게, 그리고 때론 아주 못된 비밀을 안고서 말이다.
메건이 실종되고, 매일 지나치던 기차에서 메건 부부를 바라보던 레이첼이 얼떨결에 그 사건의 중심이 되어 버렸다. 알코올중독자인 레이첼은 자신의 삶조차 좌지우지 못하는 넋을 놓고 사는 여자인데 실종사건에 휩쓸리게 되고, 독자들은 생각지도 않던 사건을 들여다보게 되고, 이 세 여자의 얽힌 인생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
<걸 온 더 트레인>은 수많은 평론가와 유수 매체들에게서 작품성과 대중성의 이상적인 결합을 보인 작품이라는 극찬을 받고 있는 소설이다.
저자 폴라 호킨스를 서스펜스 스릴러의 대가 히치콕 감독에게 비유를 하고 있기도 하다.
사실 작품에 대한 극찬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 소설의 무엇이 그렇게 매력이 있는가를 생각을 하게 된다. 레이첼과 메건, 애나를 화자로 두고 시간차별로 그들의 삶을 보여주는 초반에는 약간의 지루함도 있다.
하지만 그들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어떤 사건을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독자는 책을 읽어가면서도 눈치를 못 챈다.
그저 삶의 나른함 때문에 일탈을 하는 여자들의 삶이 부담스럽게 느껴진다.
결코 정상적이지 않는 삶을 들여다봐야 하는 독자들의 마음이 불편하다는 말이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든 같은 시간 속을 살고 있었고, 그들도 모르는 그 사이에 사건을 서서히 진행이 되고 있었다.
물론 그 사건의 범인이 이 세 여자의 공통된 교집합인데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한다.
독자들도 그 범인을 소설 마지막에 가서야 발견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 소설의 치밀함에 놀랄 뿐이다.
독자들이 극찬을 하는 이유는 또 있다.
바로 알코올중독자인 레이첼이다. 소설 속의 레이첼도 자신의 기억을 믿지 못한다. 술에 찌들어 살면서 술을 피하려는 생각조차 없다. 그녀는 자신이 어떤 사건의 목격자여서 그 장면을 기억을 하는 것인지. 자신의 공상 때문에 기억에 남은 것인지조차 구분하지 못한다.
온몸에 상처가 생겼는데도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녀가 아주 결정적인 목격자라는 것이다.
보일 듯 말 듯, 기억날 듯 말듯한 레이첼의 독백에 독자들은 인내의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도대체 이런 여자가 왜 주인공이 되었을까.
자신도 추스르지 못하는 이런 여자가 왜 사건의 중요한 실마리를 쥐고 있을까?
차라리 아예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의 도움을 받으면 동정 표라도 줄 텐데 레이첼은 그것도 아니다.
그래서 <걸 온 더 트레인>이 손에 쥐면 책을 덮지 못하는 것 같다.
이 여자가 어떤 말을 할지, 어떤 생각을 떠올릴지 독자는 빨리 결론을 보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우연히 남의 삶을 엿보게 된 레이첼.
일정한 시간에만 움직이는 기차에 몸을 싣고 어디론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레이첼.
독자들은 모두 이런 레이첼을 내 속에 담아두고 있지 않을까?
누군가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만족하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한다.
쓸데없는 오지랖에 스스로를 깎아버리는 멍청함을 저지르기도 한다.
이 책을 읽으면서 주인공이 이런 결말을 보여줬으니까 독자들도 이런 점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라는 말은 정말 가식일 수밖에 없다.
삶은 내 생각처럼 되지 않는다.
남들처럼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었고, 나와 내 옆에 있는 사람과 그 순간이 어긋났을 뿐이다.
소설은 계속적으로 독자들의 삶을 되돌아보게 한다.
나는 과연 레이첼보다 뭐가 나은지 물어보게 한다.
메건과 애나 역시 한 면으로 본다면 정말 인생을 가볍게 보는, 그렇게 몰고 가는 여자들이다. 하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본다면 자신의 상처를 제대로 위로받지 못했고, 그것 때문에 삶의 방향을 제대로 짚어내질 못했다는 점을 눈여겨봤으면 좋겠다.
레이첼, 메건, 애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잠시의 선택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독자들은 충분히 공감하게 된다.
어제의 적이 오늘은 동지가 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인생을 보게 된다.
거짓으로 포장된 사람과 그것을 참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삶을 보게 된다.
결론은 없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결론은 인생에 대한 결론은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소설의 마지막을 읽어가면서 과연 우리는 레이첼이 그저 실패한 루저라고 말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게 된다.
누가 누구에게 실패라고 말할 수도 없고, 루저라고 말할 수도 없다.
이 책이 그렇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오랫동안 남는 감정이 그렇다는 말이다.
참 인생과 거짓 인생... 어떤 것이 먼저인가, 어떤 것이 참인가 거짓인가에 대해서 독자들은 오랜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