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픈 몸을 살다
아서 프랭크 지음, 메이 옮김 / 봄날의책 / 2017년 7월
평점 :



사실 나는 이 책이 삶을 살아가는 얘기일 줄로 알았다.
살아가면서 병을 얻게 되고,
그 병을 얻은 채로 치료받고 회복되는 과정에 관한 책인 줄로만 알았다.
그래서 '아픈 몸을 살다'라는 제목도 참 그럴 듯 하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이 책은 그저 아픈 몸으로 살아가는 얘기가 아니다.
저자는 자신이 의사라는 특수한 신분인 채로 아프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적어도, 아니 절대적으로 일반인의 입장이라고는 할 수 없다.
자신이 병에 걸리게 되어, 검사(?)-이 책에는 조사라는 말로 나온다.-를 받고, 화학적 요법을 취하고, 그런 과정에서 대하게 되는 의사와 의료인들, 그런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자신이 어떤 느낌을 받았고, 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는데,
이건 저자가 의사였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던 것이지,
아니 지금 이 책을 통해서 라도 뭐라고 투덜거릴 수 있는 것이지,
일반인이었으면 꿈도 꿀 수 없는 부분이었다.
이 모든 얘기를 이끌어 나가기 이전에,
저자가 미국 의사라는 것과,
미국의 지독한 의료보험제도에 대해서 한번쯤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그는 살아 남아 지금 70세가 넘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바다 건너 미국이라는 나라의 의료보험제도나 의료윤리 따위가,
그게 한명의 의사이자 환자 입장에서 어떻게 느껴졌는지 따위가, 궁금한게 아니고,
지금 현재 이 땅에서,
병이 걸렸거나 병이 나서 아픈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한번쯤 주목했으면 싶어서 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의 번역을 한번쯤 애기할 수 밖에 없겠다.
이 책에 나오는 용어들이 어렵거나 생소한 단어는 아니지만,
의학 용어가 되는 순간 다른 뉘앙스로 해석되는 것들이 있다.
여러가지가 있지만 하나만 예를 들자면 '사회적 역사'라고 번역한건 social history 정도 될 것 같다.
이런 경우 영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는 것만으론 부족한 것 같은데,
영어를 곧이 곧대로 해석했을때와,
의학용어로 취급하여 그 규칙대로 번역했을때,
그 뜻이 완전히 달라지기도 한다.
때문에 이 책의 내용들은 좀 모호하게 둥글려진 느낌이 든다.
또 한가지 영어권 번역을 하면서 종종 문제가 되는,
무생물 주어에 관한 문제,
여기선 질환을 주어로 놓아 능동과 수동의 문제로 번역하는 꼴이 되어버렸다.
앞에서 언급한 의사는 "이건 조사가 있어야겠네요"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이 무대 중앙을 차지하고 이루 이어질 드라마의 각본을 짰다. 내 몸 안에 존재하는 한 인간은 그저 수동적으로 관람만 하도록 객석으로 보내졌다.(88쪽)
위 문장은 좀 아이러니컬 한데,
주어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조사를 해봐야겠네요'라고 할 수 있을텐데...
'조사가 있어야겠네요'가 되는 순간,
주체조차 모호해져서,
말을 하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조사'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모호한 존재가 될 수 있을테니 말이다.
살아있는 몸이 아픈 몸이 되는 순간, 생물(=생명체)이 무생물이 되는 듯 여겨진다.
암튼 이 책에는 아픈 사람들이 겪게 되는 많은 감정들이 나온다.
그리고 이 감정들은 저자 아서 플랭크는 의사여서이면서 동시에 아픈 사람이어서 경험하고 크게 체감했을 감정들이다.
다른 아픈 사람들은 겪지 못했을 감정이라는게 아니라,
일반인들은 수동적으로 당하는 입장이어서 자각하기 힘들었을 수 있을테니까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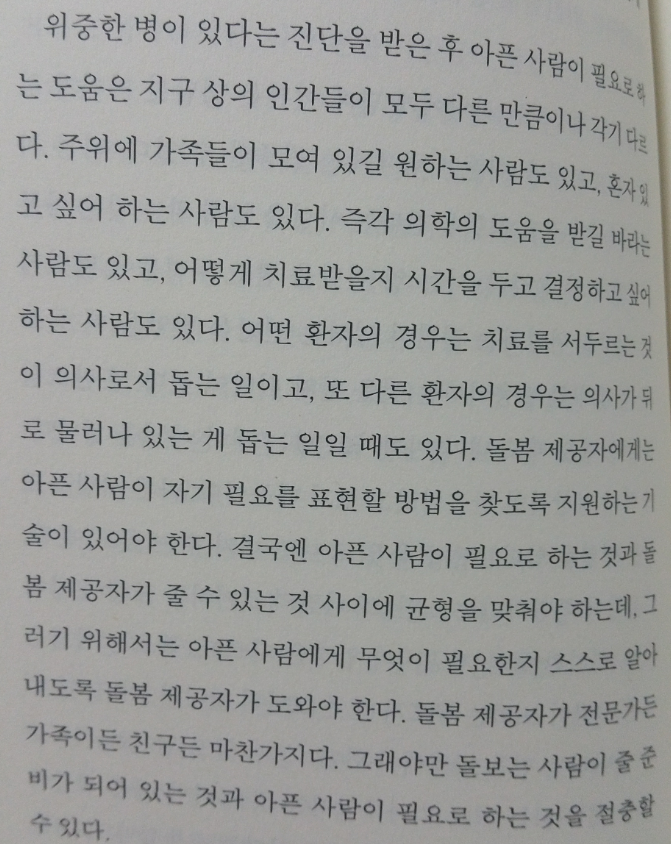
미국의 경우라서 그런것인지,
저자 아서 프랭크가 의사여서 자신의 질환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었던 것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내 주변의 얘기는 아닌것 같다.
내 주변에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많은 경우 병 앞에선 소심해질 수밖에 없고,
본인이 느낄때쯤엔 일이 많이 진행되어 버려 손 쓰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
이책에서 읽을만 했던 부분은 '개정판 후기'였다.
의료종사자들이 언제 좌절감을 느끼고 언제 자부심을 느끼는지 들었고, 이들의 옹졸한 면과 고귀한 면 모두를 관찰했다.
ㆍㆍㆍㆍㆍㆍ
심하게 아픈 환자에게는 의료인들의 말과 행동 전부가 처방되는 약과 수술만큼이나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의료인들의 업무는 대부분 너무 빡빡하게 짜여 있어서 이들이 환자의 혼란, 두려움 그리고 자존감 있는 인간이고자 하는 분투에 민감하게 마음 쓰기 어렵다.(237쪽)
이 책은 질병의 연구나 의료윤리 따위의 목적으로 쓰여지진 않은 것 같다.
'질병과 회복의 영적인 차원'이라고 했는데,
우리 말로 옮기면 간증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다.
사실 내가 원했던 것과는 약간 다른 종류의 책이었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뭔가 특별한 의료서비스와 처우 따위를 원했던 게 아니라,
아픈 사람이 사회에서 또는 병원에서 어떻게 치료받고 위로받으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
뜬구름 잡는 식으로가 아닌,
우리의 현실과 의료제도에 맞는,
보다 적절한 무엇인가를 원했었던 것 같아서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