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독서에 속도가 붙지 않는다.
날이 너무 좋아 꽃들이 피고 지는데 엉덩이가 들썩거려 책을 붙들고 앉아 있을 수 없다고 해야겠지만,
그런 것은 아니고~--;
책을 조금만 집중하여 읽을라치면 눈이 침침하여 브레이크가 걸리기 때문이다.
요번에 읽은 책 '길버트 그레이프'는 영화로 먼저 보고 책을 집어들게 되었다.
휴일 낮 텔레비전을 이리저리 돌리다가 EBS에서 해주는 이 영화를 만났다.
이 영화를 본건 조니 뎁과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때문이었는데,
강렬한 인상이 남았었다.

길버트 그레이프
라세 할스트롬 감독, 조니 뎁 외 출연 /
에스엠픽쳐스(비트윈) / 2001년 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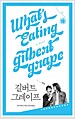
길버트 그레이프
피터 헤지스 지음, 강수정 옮김 /
호메로스 / 2014년 4월
그 기억으로 읽은 책인데, 영화보다 훨씬 좋았다.
영화에서는 아무래도 조니 뎁과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에게 집중되다보니,
그리고 대부분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가 그렇듯이 생략이 많이 되어,
어떤 부분은 뉘앙스를 읽어내는 것으로 짐작해야 했다면,
책은 길버트 그레이프가 화자이다 보니,
그의 속마음을 섬세하게 표현하는데,
그 상황을 심리학적인 통찰로 그려내고 있다.
이렇게 재밌는 책인데 진도를 쑥쑥 빼서 읽을 수가 없었는데,
글자 크기가 작아도 너무 작은 거라,
책에서 글자들을 꺼내다가 뻥튀기하여 집어넣었음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책 뒷표지를 보면 '뉴욕타임스'를 인용하며,
"독창적이란 이런 것이다. ㆍㆍㆍㆍㆍㆍ피터 헤지스는 읽는 사람의 공감대를 건드리는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데,
내가 보기엔 심리적 장치들에 치중하다 보니,
개연성이나 핍진성 면에서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 싶다.
동생 어니는 지적장애아라고 하는데, 그려내기는 자폐아나 시한부인생처럼 그려낸다.
지적장애는 말 그대로 지적으로 부족할 뿐이지,
그것과 살아가는 데는 하등관계가 없다.
가족이라는 울타리나 방패막이가 필요했다면, 다른 설정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다.
내 이런 마음을 엿보기라도 한듯 이런 구절이 등장한다.
"형이 점점 작아지는 거야."
"그래?"
"맞아. 형이 점점 작아지는 거야. 오그라들어."
가끔은 멍청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소리를 하기도 한다. 어니마저도 내가 쳇바퀴에 갇혔다는 걸 알고 있다.
나는 시계를 차고 다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라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지만 바로 그때, 모자란 동생이 내 가슴에 칭칭 동여맨 붕대를 무심히 뜯어낸 그 순간, 다시 어니가 뭐라고 쨍알거렸다. (15쪽)
얼핏 보기엔 어니의 통찰력처럼 보이지만,
어니에게서 그런 통찰을 이끌어낸 것은 길버트이다.
"보비, 지금 몇 살이지?"
"스물아홉!"
"이런 짓 하기엔 우리 나이가 좀 많은 것 같지 않아?"
나를 바라보는 보비의 빨간 머리가 바람에 흩날렸다. 입술을 다물고 카레이서처럼 핸들을 꽉 쥐더니 "살아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라고 소리쳤다.(126쪽)
누군가는 이런짓이라고 표현하는 일이 누군가는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는 일이다.
그러고 보면 산다는 일은 누구에게는 가슴 두근거리는 설레임이기도 하고, 누군가에겐 그날이 그날 같은 날들의 연속이기도 하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가슴이 두근거리기 보다는 그날이 그날 같은 날들의 연속이 좋다.
눈이 침침해진다는 건,
막무가내로, 앞만 보고 내달리던 삶에 일종의 브레이크라고 생각하면 위로가 된다.
요즘은 형제ㆍ자매나 남매도 별로 없고 외동이가 많아서,
이 책을 권한다면 좀 지루해 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이라는 책임감에 가슴이 막히거나,
가족 속에서의 역할 분담이나 관계가 버거울때 읽어보면 좋겠다.
내겐...뭐라고 딱 꼬집어 얘기할 수는 없지만 묘하게 위로가 되는 작품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