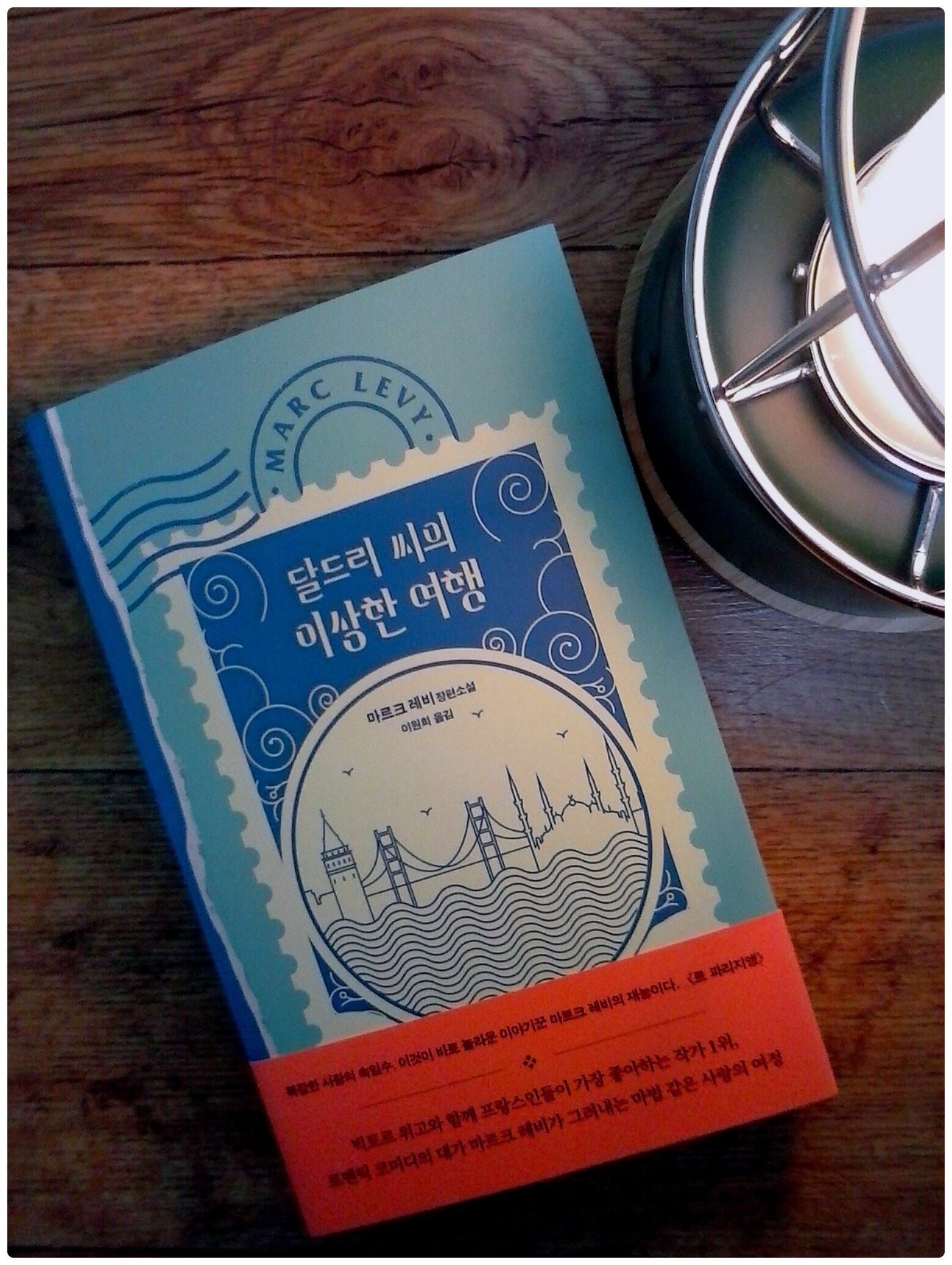-

-
달드리 씨의 이상한 여행
마르크 레비 지음, 이원희 옮김 / 작가정신 / 2023년 8월
평점 :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부르지만, 소위 ‘터키석’이라고 부르는 돌을 많이 좋아했다. 색감 때문에. 조금씩 다르지만, 그 계열의 푸른빛은 몽환적이라서 다 좋았다. 내 눈에 아름다워 무심코 손을 뻗을 듯한 표지다.
마르크 레비의 작품은 두 번째다. 2021년 <고스트 인 러브>를 읽으며 누가 들을까봐 민망할 정도로 웃었다. 황당하기도 하고 이해가 되기도 하고 어쨌든 온갖 이유로 실없이도 헛웃음도 혀를 차는 웃음도 웃게 했다.
전작보다는 현실적(?)인 소재들이지만, ‘사랑’을 핑계(?)삼는 것은 같다. 런던에서 출발해서 다채로운 오감 반응이 가득할 이스탄불로 떠나는 여행이니 따라가지 않을 도리가 없다. 황홀한 음식 생각에 배가 고파진다.
“네 몸 속에 흐르는 피의 원천은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 어딘가에 있고, 거울을 잘 보렴. 네가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운명을 찾아 여행을 시작한 건 앨리스인데 왜 제목은 달드리의 여행이지? 더 읽어본다. 회색의 어둡고 축축한 영국을 떠나고 싶어 기차로 페리 몸속으로 들어가던 오래 전 나와 무겁던 호흡이 떠오른다.
여행은 모험이다. 어떤 우연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다 운명이라 여긴 것으로 삶을 바꾸기도 한다. 그보다 더 설레는 일이 있을까. 이러다 예전 병이 도지면 무작정 떠나고 싶을 듯해서, 가을이 곧 도착하는 계절감이 두렵다.
새롭고 모든 낯선 것들과의 조우를 해석하는 것은 여행자의 선택이다. 대부분이 빠르게 지나치고 마는 기회들이라, 잡아 두고 싶으면 서둘러야 하고, 지나고 나면 모두 꿈같다. 삶도 그렇다. 한시적인 여행과 삶은 동일한 경험이다.
“절대 잊지 마, 끝까지 찾아다니다 보면 네가 아는 사실은 남지 않게 된다는 걸.”
앨리스가 조향사라는 것, 여행을 부추기고 경비까지 지원하는 이웃인 달드리씨가 교차로를 그리는 화가라는 것, 이스탄불에서 향수 장인을 만나는 것, 예민한 후각을 가져 희미한 냄새도 구별하고, 모두 기억하지만, 자신의 과거는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 등등, 설정이 무척 감각적이다.
“냄새는 나의 언어였고, 나를 둘러싼 세상을 배우는 방법이었다는 걸. 그래서 나는 지난 시간들의 냄새를 추적할 수 있어.”
오늘은 9월 1일 관동대지진학살 100주기가 되는 날이다. 나는 엘리스가 대면한, 아르메니아인 대학살에 이르러 잠시 읽기를 멈추고 만다. 과거가 되지 못한, 될 수 없는 비극, 언제든 다시 반복될지 모르는 비극.
기억은 정체성이다. 개인이든 민족이든 사회든 국가든. 기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우고 없애도, 감각으로 남아 기어이 복원될 수 있다. 기억을 되찾아야 자신을 되살리고 짧은 삶을 제대로 자신답게 살아볼 수 있다.
“기억에서 사라진 순간들을 되살리고, 잠든 장소들을 깨어나게 하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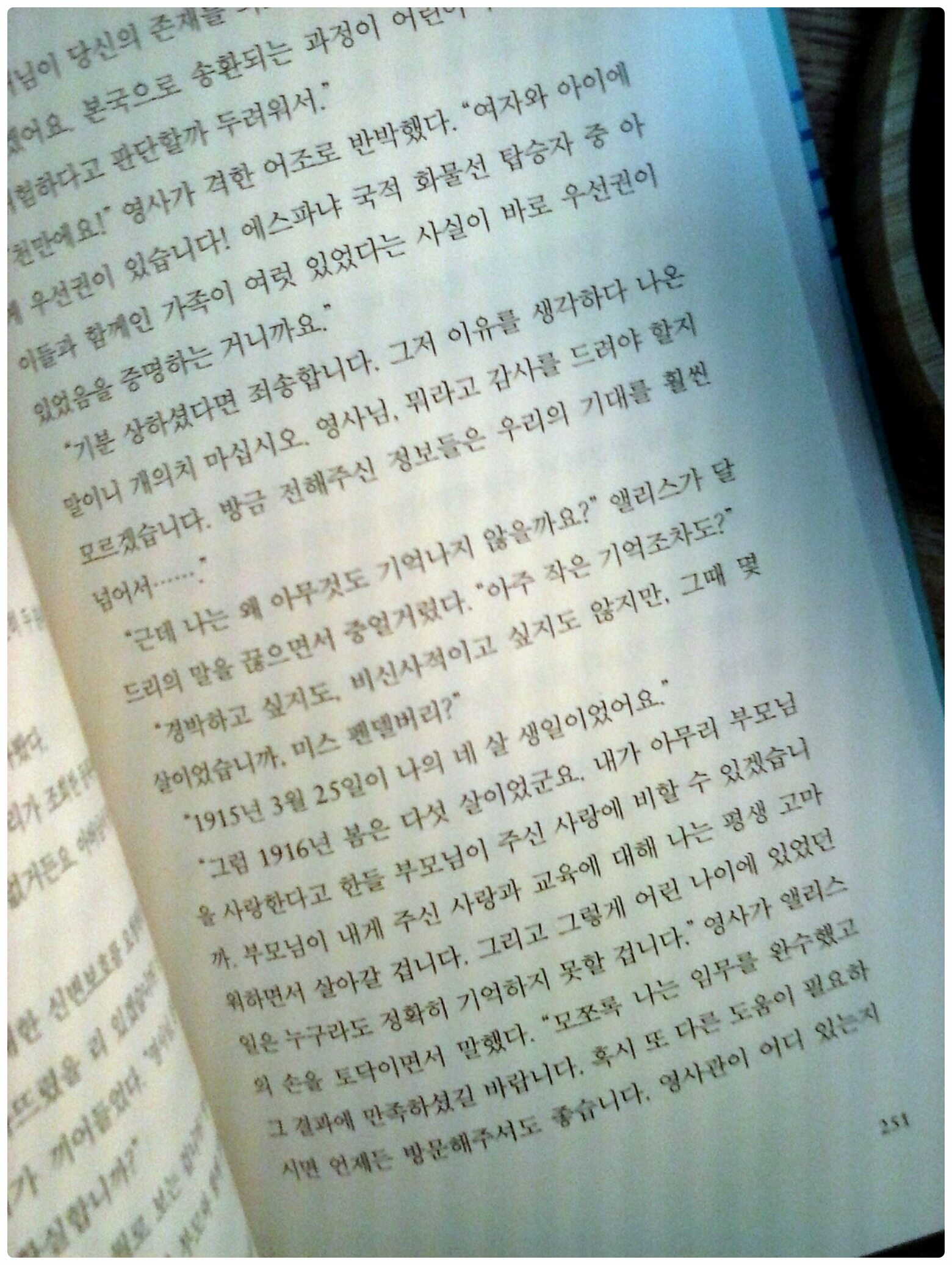
내 감상은 매번 단선적이고 경직된 글로 남지만, 이 작품의 속도감과 다채로움과 복선들을 그렇지 않다. 스포일링은 나름 열심히 피했으니, 즐겁게 읽으시며 우연과 여행이라고 소개하는 삶이 전하는 이야기를 즐기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