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라스팔마스는 없다
오성은 지음 / 은행나무 / 2023년 11월
평점 :



“서류에는 심 선장과 규보가 환자와 보호자로 구분되어 있었다. 그러자 문득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다. 살면서 이보다 잘못된 일은 한 번도 없었던 것만 같았다.”
알츠하이머 판정을 받은 아버지, 슬프게도 인간은 한 방향만 보고 살아가다가, 이렇게 큰 돌부리에 걸려서야 멈춰 서서 살아온 삶의 흔적도, 나도, 내 주변의 사람들도 비로소 돌아본다. 나도 마찬가지다.
의학적 사망에 이르기 전에 이별하는 병, 알츠하이머는 그렇게 주위 사람들과 먼저 이별하고 혼자 먼 시간 속으로 떠나는 병이다. 나는 이 병이 너무나 서럽고 슬프고 두렵다. 이렇게 시작하는 작품이 어디를 항해할지 짐작이 될 듯도 했다. 비록 부산과 바다에서의 삶에 대해서 아는 바가 아주 적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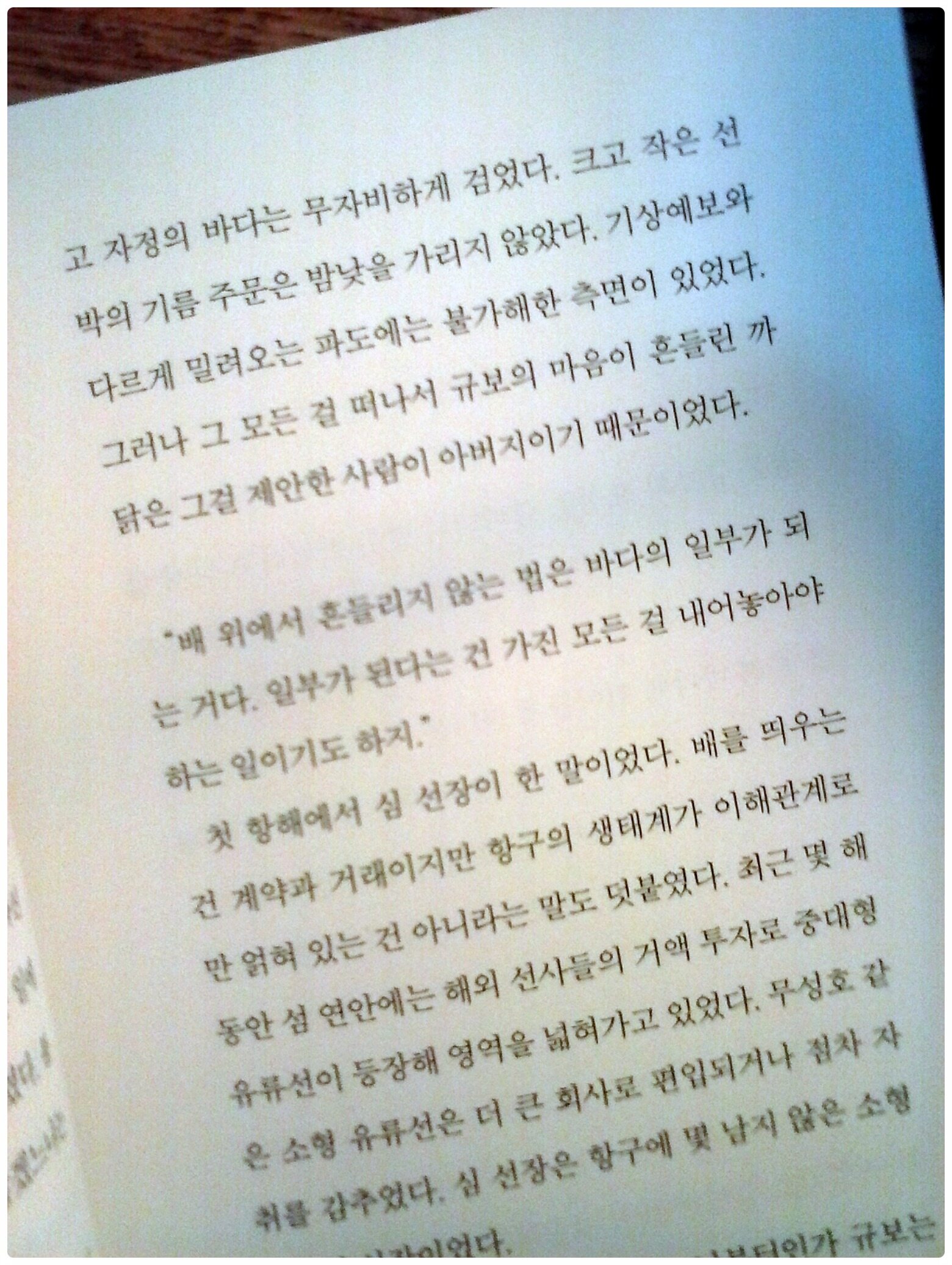
나약할 수 없어서 강해지고자 한 모든 선택은 아버지의 삶을 가족으로부터 오랜 세월 떼어놓았다. 먼 곳의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반걸음 정도의 거리’라는 의미의 ‘규보’라고 지었을 때, 나는 조금 울고도 싶었다. 먼 바다 항해를 하는 아버지가 미처 후회하기도 전에 아이는 자라고 또 자랄 테니까.
좀 더 좋은 밥벌이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아버지는 가족에게서 멀어져 바다로 나가야했다. 그렇게 그의 생은 바다에서 바다로 항행하였다. 구체적 묘사나 서술은 없지만, 어머니의 양육은 부족함이 없었는지, 규보는 “슬픔도 두려움도 없이 제 속도로 커나갔다”고 한다.
그리고 불과 열일곱 살에 어머니가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삼일 상례에 나타나지 못한 먼 곳의 아버지는 양육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내항선 선장 면허를 취득하고, 유류선을 사서 무성호라 이름 붙였다. 아버지와 아들은 그렇게 서로를 잘 모른 채로 함께 살아갔다.
“라스팔마스로 가는 화물선에서 선원을 구한다는 공고가 났다. (...) 나무배만 만지던 아버지가 몇천 톤의 배를 상상할 수 있었을 리가 없지. 아버지는 기술을 배우고 싶었던 게야.”
궁금했던 제목의 라스팔마스는 아버지의 아버지, 규보의 할아버지 이야기였다. 내가 아는 현실의 라스팔마스는 스페인령이라서, 규보의 할아버지가 배우고 싶었던 물에 뜨는 쇠배는 제국주의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떠올리게 했다.

“규보야. 저 배는 항구가 집일까, 바다가 제 집일까.”
배는 집이 필요 없다. 집이 필요한 건 사람이다. 깡깡이 마을에 호텔이 생기고, 바다엔 요트가 떠다니고, 바다는 점점 더 뱃사람들에게 낯선 곳으로 변해간다. 심 선장이 내항선 무성호와 사라져버렸다. 어쩌면 집을 찾아간 것일까.
아들은 아버지의 행방을 찾으면서 몰랐던 아버지란 존재를 만나게 된다. 글을 쓰고 낭독 영상을 남긴 아버지, 전시 프로젝트를 시작한 아버지, 우울증을 겪으면서도 계속 배를 탄 아버지, 사라지고 잃어가는 기억을 붙들기 위해 기록을 남긴 아버지.
산다는 건 잃은 것들을 그리워하는 일이란 걸 아는 나이가 되어 읽어본 이 작품은 바다처럼 아름답고도 막막했다. 아련한 모든 것이 서글펐다. 그러니 살아 있는 동안 모두 한껏 살아가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