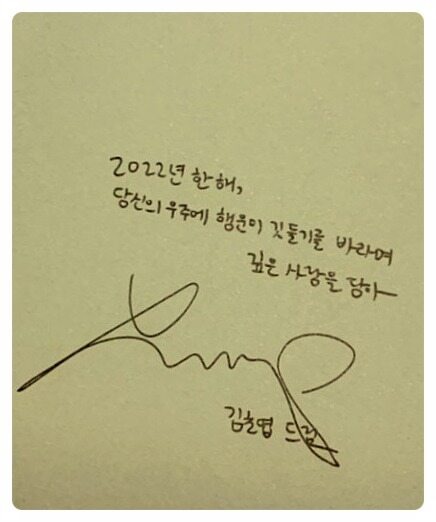-

-
므레모사 ㅣ 현대문학 핀 시리즈 소설선 38
김초엽 지음 / 현대문학 / 2021년 12월
평점 :



<므레모사>는 크리스마스선물처럼 2021년 12월 25일에 출간되었다. 김초엽 작가는 글 쓰는 AI인가 싶게 신작들 소식이 계속 들리던 신나는 해였다. 뜻을 알 수 없는 제목에도 신나지 않은 연말연시에도 경애하는 작가의 아쉬운 분량의 작품은 서로에게 선물하기 참 좋았던 책이다. 그런데 내용이...!
뿌연 우울함을 가뿐한 회복과 힐링이 아닌 무거운 어둠으로 덧발라버린 충격적인 결말이다. 코로나 블루를 잔잔히 앓던 나와 지인들은 일종의 충격요법을 경험한 것 같았다. 푸른 하늘과 다채로운 꽃이 배경인 표지의 의미는 짐작한 바와 달랐다. 다 읽고 표지를 보자 저자가 펼친 깊은 어둠이 다시 번졌다.
유독물질이 유출되어 폐허가 된 땅 ‘므레모사’에 사람들이 방문하기 시작했다. 다크 투어리즘 형식의 여행이다. 신청한 이들 중에서 당첨된 이들만 참여가 가능하다. 읽고 얼마간 얘기를 나누고 말았는데, ‘체르노빌’의 역사를 가진 나라에 전쟁이 침공이 이어지는 현실에 기막혀하다 저자의 질문이 생각났다. “왜 재난을 그토록 재현하면서 반복하려 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간다는게 중요한 거잖아요.”(71) 그럴까... 존재가 우연이고 삶이 농담이라면, 노력이 힘도 실력도 되지 못한다면 왜 애써야 하는지 이유를 잊게 만드는 결과들이 빈번한 현실이라며, 그래도 살아야 한다는 설득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모르겠다. 하지만 죽으면 모든 가능성이 무화된다는 것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살아 있다는 건, 곧 움직이는 거야. 왜 ‘생동한다’는 표현을 쓰겠어?” (90) 눈도 뜨기 싫고 움직이기도 싫은 주말을 보냈다. 내내 그럴 수는 없는 입장이라 최소한의 할 일을 위한 신경과 체력을 두고는 다 닫아버린 상태로 살아있었다. 움직이지 않으니 손발이 얼어붙는 듯했다. 피가 돌다 마는 기분. 코로나, 한국의 대선, 우크라이나의 폭격과 죽음의 한편에서의 출산과 탄생...
죽음과 괴이한 소문, 공포소설의 단골소재인 절망의 장소인 므레모사를 보는 외부인의 시선은 각자의 목적과 욕망에 뿌리를 두고 있다. 연구 목적인 대학생, 히트 기사를 위해 온 신입 기자, 유튜브 콘텐츠 자료 수집을 하려는 채널 운영자, 이들은 타인의 불행의 크기를 가늠해서 자신의 실패와 비극의 무게를 덜어내려는 생각도 한다.
“솔직히 말하자면, 오늘은 기대에 못 미치지 않던가요?”(59) 외부인인 내가 현실의 비극을 대하는 태도 역시 다를 바가 없을지도 모르겠다. 내 선택의 범위 안에 있던 무수한 순간들에 대한 변명으로, 실패에 따른 우울함을 외부의 비극에 견주어 위무해보려는 이기적인 인간의 인지과정에 다름 아닌 행동을 늘 한다. 자기합리화 프로세싱은 거침없는 속도로 이루어지고 막지 못한 침공처럼 내 의지로 미리 저지할 수 있었던 적이 없었다.
타인의 비극은 아직은 내가 안전하다는 무자비한 위안이다. 그래서 마음이 놓여 과장된 감정으로 울 수 있는 것이다. 유안을 위한다는 한나의 말들은 귀를 막고 싶은 폭력으로 느껴졌다. 그 입 다물라, 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다. 격려와 용기를 주는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가능한 것이구나, 그렇게 무자비한 태도로 보였다. “상실을 딛고 일어서 나아가는 것, 우리 인간이 지닌 최고의 능력을 봐”(89)


유안이 가장 고통스러워한 것은 오른쪽 허벅지 아래에 달린 신경 의족이 전하는 격렬한 통증이었을까, 그 통증을 전하고자 얘기할 때조차 ‘회복’만을 얘기하는 한나의 견고한 시선이었을까, 자신의 통증에 대해 얘기하지 않게, 못하게 되어버려 홀로 남은 자신이었을까, 아무에게도 이해받지 못할 것이라는 절망감이었을까.
내 존재를 신체를 실격, 결핍, 부족이라고 규정하고 극복, 회복, 건강, 완치, 성공, 최고가 아니면 ‘옳지 않다고’ ‘노력해야할 상태’라고 하는 인식을 마주한다는 건 숨 막히는 일이다. 지금의 너를 부정해야 한다는 인식을 마주한 유안은 어떤 선택을 해야 했을까. 타인과 세상의 기준에 맞춰 통증과 비명을 홀로 삼키며 기준의 근사치에 근접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인가.
죽을 듯해 죽고 싶은 고통 속에서 신음을 삼키는 이들에게 명랑하고 발랄한 응원과 격려와 희망의 말들은 한없이 가볍고 무용하다. 나는 유안의 선택을 지지한다. 실은 너무 무서워서... 단단한 얼굴로 나를 보는 유안의 어둠과 마주한 듯 몸이 떨렸다. 눈을 감고 의족과 분리된 순간의 안도감을 힘껏 상상해보았다.
다시 뜨고 싶지 않은 눈이 떠지는 위로는, 힘이 되는 것은 고통을 괴로움을 안다는 말, 나도 그러했다... 그러하다는 동감과 공감의 대화이다. 그게 없다면 판단도 평가도 없는... 친밀함도 기대도 사라진 장소만이 구원일 밖에. “오늘은 피를 흘려도 상관없어 (...) 눈에 안 보이면 그만이지.”(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