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문명과 자본주의 1> 일상생활의 구조
오늘부터 읽기 시작. ‘서론‘, ‘서문‘을 읽었고 ‘제1장 수의 무게‘ 중 두번째 챕터를 읽고 있다. 서론에서 산업혁명이 도래하기까지의 경제사회를 ‘자본주의‘, ‘시장경제‘, ‘물질문명 혹은 물질생활‘의 삼분법적 도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제 1장에서 부족한 통계수치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인구를 통계학적 기반에서 최대한 추론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의외로 재미있었다.
이 책을 처음 검색했을 때 표지에 사용된 그림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었다. 이 그림은 피터르 브뤼헐의 <곡물수확>인데 얼마 전 읽었던 패트릭 브링리의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에서 알게 된 그림이었다.
˝멀리까지 펼쳐진 광활한 풍경을 배경으로 농부 몇몇이 오후의 식사를 즐기는 모습˝을 그린 것인데, ˝배경 중반쯤 교회가 있고 그 뒤로 항구 그리고 황금빛 들판이 아스라이 지평선까지 굽이쳐 펼쳐진다.... 맨 앞쪽 구석에는 일을 하다가 배나무 아래에 앉아 식사를 하는 아홉 명의 농부의 모습이 다소 희극적이면서도 애정을 담아 묘사되어 있다.(164쪽 )˝
패트릭 브링리의 책을 읽을 때 책에 등장하는 그림, 조각 작품들과 유적, 설치 미술들을 하나하나 검색해보며 읽다 이 그림을 보게 되었다. 봐도봐도 질리지 않는 그 아름답고 따스한 색감에 매료되어 꽤 여러번 찾아 보기도 했는데 뜻하지 않게 다시 보게 되어 너무 좋았다. 19세기 이전의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등의 세계는 누가 뭐래도 강력한 농업 기반의 사회였다. 이 책에서 다루는 시기에 꼭 알맞는 그림으로 <곡물수확>보다 더 어울리는 그림을 찾을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
책 읽을 때마다 정말 갖고 싶다 생각했던 그림을 부분이나마 볼 수 있어 더욱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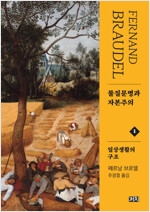
*서론
1952년에 뤼시앵 페브르가 자신이 기획한 세계의 운명 (Destins du Monde)』총서를 위해서 이 책을 써달라고 부탁했을 때, 나는 얼마나 끝없는 모험에발을 들인 것인지 분명히 상상도 못했다. 원칙적으로는 전(前)산업화(pré-industriel, preindustrial) 시기의 유럽 경제사에 관한 저작들을 단순히 재손질하여 내놓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종종 원사료를 다시 보아야 했을 뿐 아니라, 그것을 연구하는 중에 15-18세기의 이른바 경제적 현실들을 직접 관찰하면서 당황하게 되었다는 점을 고백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경제적 현실들이 전통적이고 고전적인 여러 도식들과 잘 맞지 않거나 때로는 전혀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 P15
그러나 실제로 관찰한 19세기 이전의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하다. 물론 우리는 그 진화과정을 추적해갈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진화과정이란 하나라기보다는 서로 대립되고 어깨를 겨루며 심지어 서로 상반되기까지 한 여러 진화과정들을 말한다. 그것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경제가 있음을 인식하는 것과 같다. 그중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묘사하기 좋아하는 것은 이른바 시장경제이다.
그것은 농업활동, 노점, 수공업 작업장, 상점, 증권거래소, 은행, 정기시期市, foire, fair), 그리고 물론 시장에 연결된 생산과 교환의 메커니즘들을 뜻한다.
경제학은 바로 이 명료한, 심지어 "투명한 현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속에서 활발히 움직여가고 또 그렇기 때문에 파악하기 쉬운 과정들에 대해서 먼저 연구하기 시작했다.
즉 경제학은 처음부터 다른 것들을 사상한 채 이런 특별한 분야만 골라서 보았던 것이다. - P16
그러나 다른 한편에는 불투명한 영역, 다시 말해서 흔히 기록이 불충분하여 관찰하기 힘든 영역이 시장 밑에 펼쳐져 있다. 그것은 어느 곳에서나 볼수 있고 어마어마한 규모로 존재하는 기본활동의 영역이다. 지표면에 자리잡고 있는 이 폭넓은 영역을 뜻하는 더 알맞은 이름이 없어서, 나는 이것을 "물질생활(vie marerielle, material life)" 혹은
"물질문명(civilisation materielle, material civilization)"이라고 명명했다.
확실히 이 표현은 너무 모호하다. 그러나 현재를 보는 시각이 일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공유되듯이
과거를 보는 나의 시각이 공유된다면, 언젠가는 이
하부경제(infra-economie), 다시 말해서 자급자족적이거나 아주 좁은 범위 내에서 재화와 용역을 물물교환하는, 경제활동의 이 또다른 덜 형식적아 절반을 가리키는 데에 더 적잘한 명칭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 P17
다른 한편으로, 시장이라는 광범한 층의 밑이 아니라 그 위로 활발한 사회적 위계가 높이 발달해 있다. 이런 위계조직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교환과정을 왜곡시키며 기존질서를 교란시킨다. 원하든 아니면 의식적으로는 원하지않든 간에, 그것은 비정상과 "소란스러움"을 만들어내며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자신의 일을 수행한다. 18세기의 암스테르담 상인이나 16세기의 제노바 상인은 이 위계의 상층에 자리 잡고서 원거리에서 유럽 경제나 세계경제의 전 분야를 뒤흔들 수 있었다. 그런 방식으로 이 특권적인 주인공 집단은 일반인이 모르는 유통과 계산을 수행했다. 예를 들면 환업무는 원거리 무역과 신용수단의 복잡한 운용과 연결되어 있어서 소수 특권적인 사람에게만 개방된 정교한 기술이었다. - P17
시장경제의 투명성 위에 위치하면서 그 시장경제에 대해 일종의 상방(上方) 한계를 이루는 이 두 번째의 불투명한 영역이내 생각으로는 다름 아닌 자본주의의 영역이었다. 시장경제 없이 자본주의는 생각할 수 없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자리 잡고 그곳에서 번영한다.
이 #삼분법적 도식#은 내가 관찰한 요소들을 분류해가는 동안 조금씩 조금씩 거의 저절로 형성되었지만, 아마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는 가장 큰 논쟁의 대상이 될 것이다. 시장경제와 자본주의를 너무 명료하게 갈라놓았으며, 나아가서는 완전히 대립되는 개념으로 만들어놓은 것은 아닐까? 나 역시 처음부터 이 시각을 주정없이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
#삼분법적 도식: 위로부터 보면 차례대로
‘자본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물질문명 혹은 물질생활‘이다. - P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