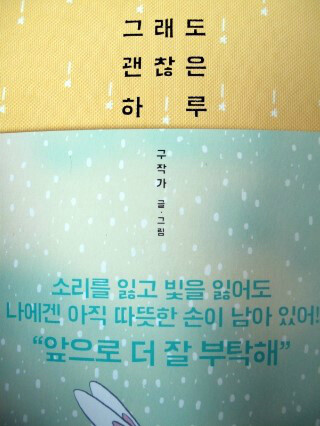
『그래도 괜찮은 하루』를 읽고 구작가이자 베니가 안쓰럽다고 하면 작가에게 커다란 실례일까...
책을 읽는 내내 뭐라 말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던 책이다. 베니는 곧 작가 자신의 분신이기도 한데, 두 살 때 열병을 앓은 뒤로 구작가는 소리를
잃게 된다.
소리를 잃은 그녀가 말을 해보기도 전에 혀가 굳지 않도록 그녀의 어머니는 입술 주변에 설탕을
묻혀서 혀를 움직이게 하고, 자신이 말할 때 목에 손을 가져다 대게 해서 소리를 익히도록 했다고 한다. 장애를 가진 사람이 현실에서 살아가기는
참으로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감히 상상조차 못할 어려움이자 고통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작가는 어렸을 때 자신이 의사소통으로
활용했던 그림을 통해서 자신의 틀 안에만 갇혀 지내지 않고 세상 속에 당당히 맞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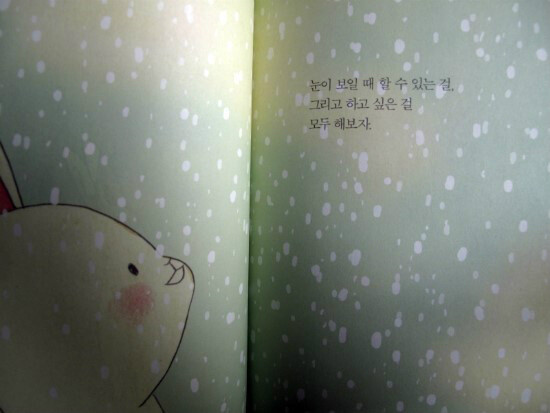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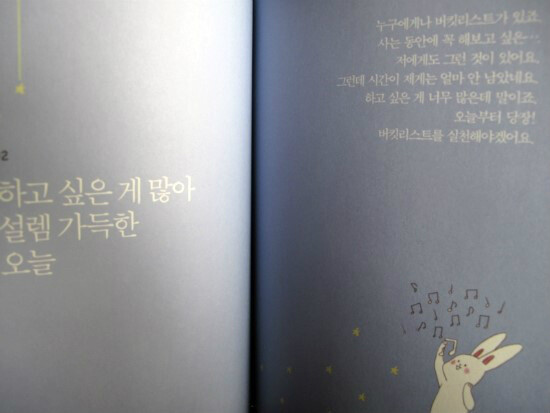
물론 이런 그녀의 도전이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지인을 통해서 싸이월드 스킨작가가
된다. 그러다 그 과정에서 지칠대로 지친 상황에서 그려낸(제목도 마찬가지로) '다 귀찮다'는 스킨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사람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게 되고 일약 화제가 되었다고 한다.
이 책속에는 그녀의 자라 온 과정과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가 담담하지만 너무나 솔직하게
표현되는데, 그녀는 근래에 들어서 시력을 잃어가는 망막색소변성증이라는 유전적 질환에 걸리게 된다. 이후 그녀는 시력을 완전히 잃기 전에 하고픈
일들을 버컷 리스트로 만들어서 어떻게 실천할지를 담아내고 있는데, 어릴 때부터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헬렌 켈러가 3일만이라도 눈을 뜨게 되면
이루고 싶었던 소원을 구작가는 베니를 통해서 이루어낸다.
그 과정이 참 아프게 다가온다. 처음부터 보지 못하다가 이렇게 보는 것이 나을지, 처음에는
보다가 나중에는 전혀 보지 못하는게 더 나을지...
구작가는 청력에 이어 시력을 잃을 것에 대해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그런 과정이
애잔하게 느껴지지만 본인은 그 마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것 같아 구작가가 베니를 통해서 계속해서 많은 독자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