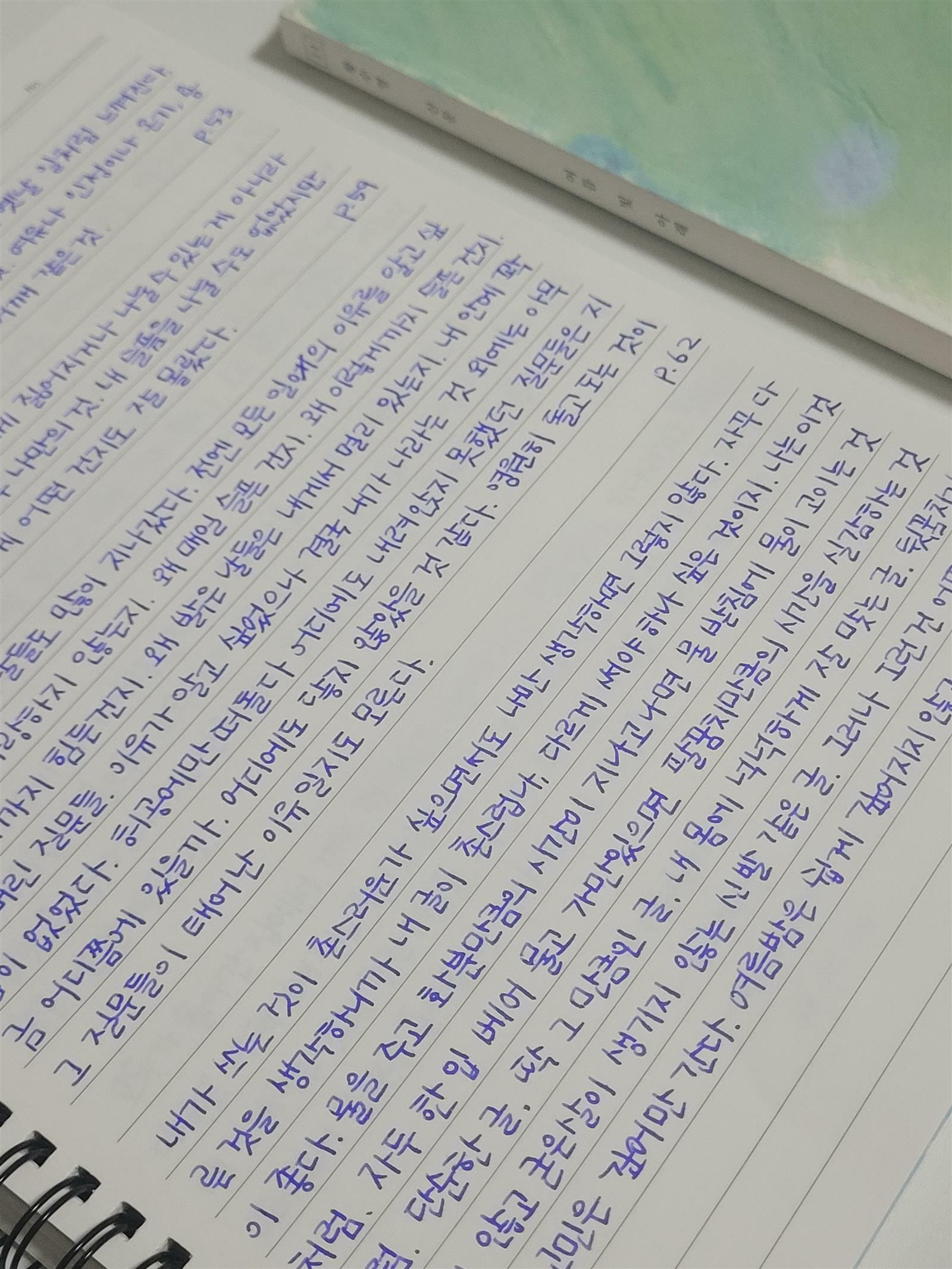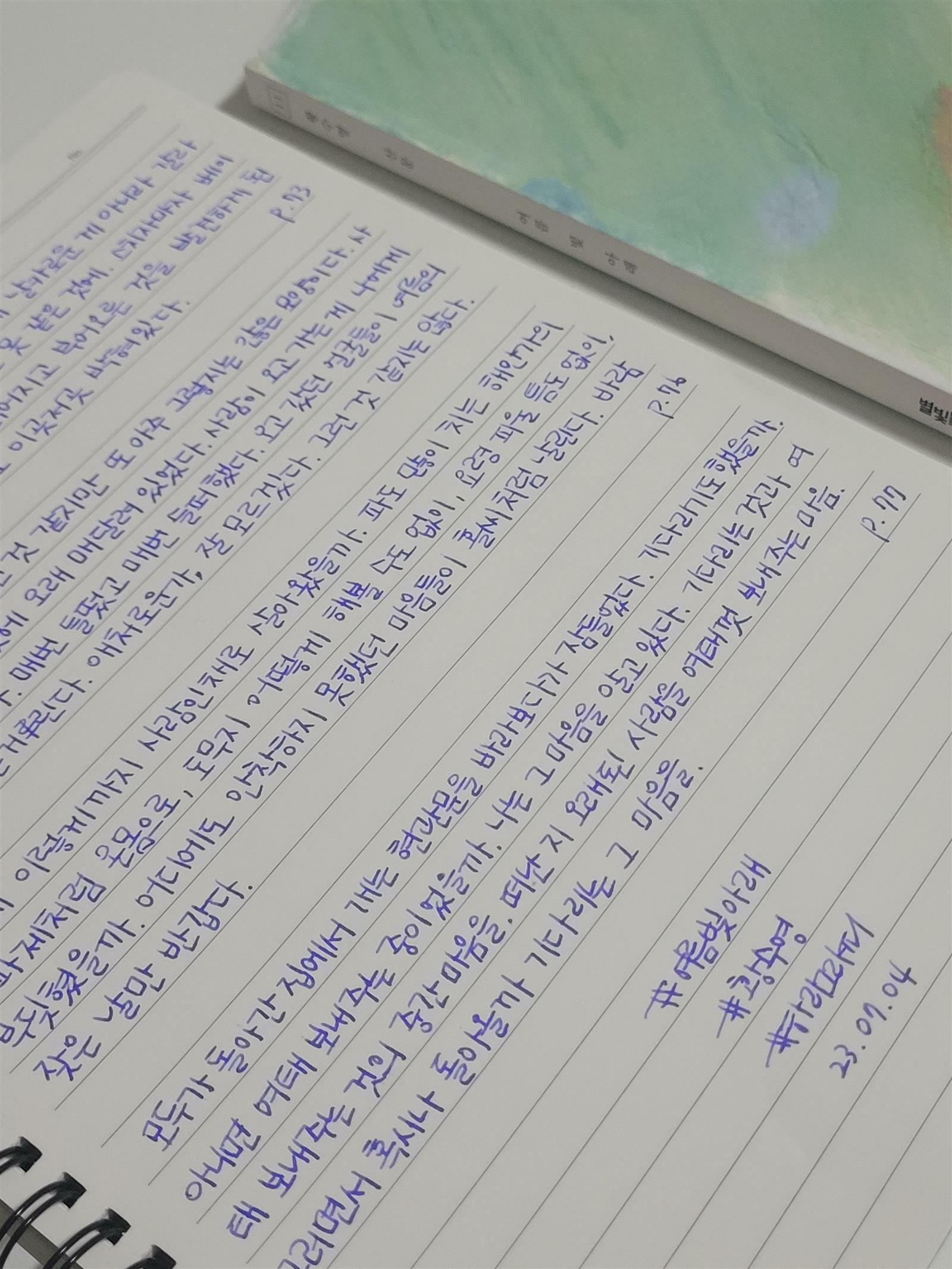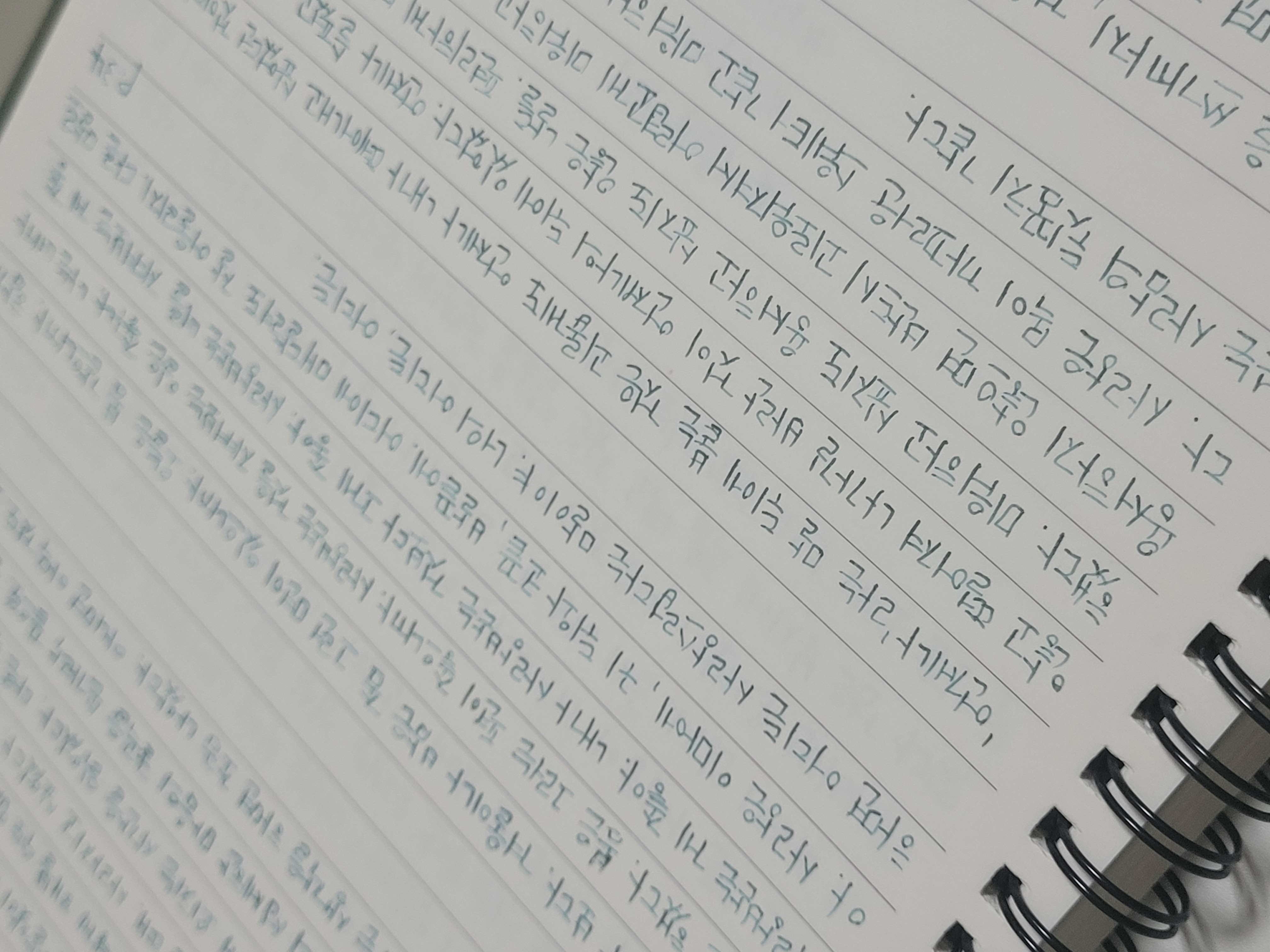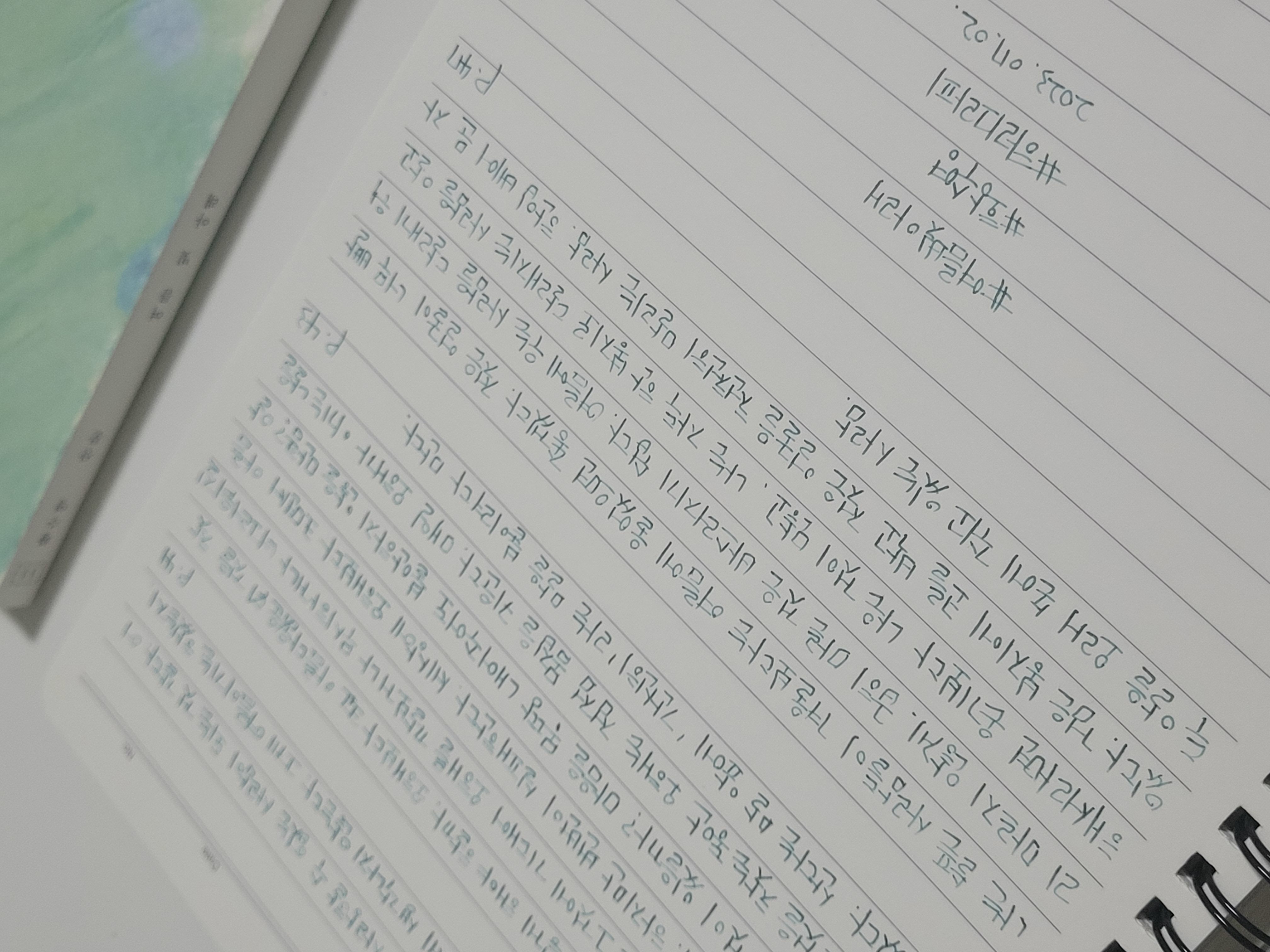-

-
여름 빛 아래
황수영 지음 / 별빛들 / 2022년 3월
평점 :



여름 빛 아래, 황수영
여름 책 두 번째.
올해는 여름 책이 계속 기다리고 있다. 모순같지만 비를 좋아하지만 여름은 좋아하지 않는데 여름의 책들을 읽다보면 여름이 좋게지게 될까. 좋아하지는 않아도 여름을 잘 보내고 싶다.
황수영 작가는 이 책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다. 서울 국제도서전에 갔다가 별빛들 부스에서 커버가 눈에 띄었고 제목에 눈이 갔으며 게다가 사인본이라(결국 이거였나?) 사고 말았다. 결론은 사길 잘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잔잔하면서 마음을 쓰다듬어주는 기분이 들었다. 이병률 시인의 추천사까지 완벽했다. 플래그는 너무 많았고 필사하다간 책 전체를 할지도 몰랐을, 나의 아름다운 여름 책.
자주 우울하고 자주 슬퍼하는, 그래서 자꾸만 숨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싫었다. 밝고 건강한, 화사한 사람이고 싶었다. 슬프기만 하진 않고 즐겁고 발랄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나 혼자만 슬퍼하지 말고 함께 슬퍼하기 위해 따라나서는 사람(p.24)이고 싶다.
누구라도 나를 좋아할 순 없겠지만 사람들에게 편안하고 좋은 사람이고 싶어서 애쓰곤 했었다. 그러나 나는 나를 지키는 게 중요한 사람이라 견고한 벽을 만들어 주변을 막고 뾰족한 가시들로 그 벽을 에워싸고 했다. 지금도 여전히 툭툭 튀어나오는 모나고 날선 모습들. 별거 아닌 일에도 발작버튼이 눌리고 스위치가 켜져 공격적이 되곤 하는 나를 볼 수 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마저 환상같지만)이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내가 가둔 내 방 안에서 혼자라는 사실이 사무치게 두렵고 외로웠다. 그건 누구도 채울 수 없고 그런 모습마저 좋아할리 없었기에 그래서 시를 읽고 필사를 했던 것 같다. 눈이 뻑뻑해져도 팔이 아파와도 벌 서는 어린 아이처럼 그렇게 읽고 쓰고 읽고 쓰면서. 여전히 나에게는 없는 것. 익숙해지지 못했고 배우지 못한 것. ‘사랑이나 사람이나 마음 같은 것. 여유나 인정이나 온기, 용서 같은 것. 마중하는 얼굴과 자랑스레 여기는 어깨 같은 것.’(p.53) 그런 것을 찾기 위해, 배우기 위해.
요즘은 쨍한 여름 빛 아래 축축하게 젖어있는 마음들을 꺼내 잘 말리고 싶다. 못생기고 미운 마음들도, 여리고 나약한 마음들도, 사랑받고 싶어 애쓰는 마음도, 어찌해야할지 모르겠는 마음도, 잊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마음도. 그래서 잘 말리고 닦아서 내가 나를 다독여주고 예뻐해줘야지. 누가 나를 좋아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기대하지 말고 나 먼저 나를 좋아해줘야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밤도 끝나고 그치지 않을 것 같은 눈도 그친다. 그만둘 수 없을 것 같은 말들도 언젠가 멈출까. 꿈이나 악몽, 소원도. 환상 끝에 남는 온기도. p.20
슬픈 건 나쁜 게 아니지만 슬픈 이야기를 너무 오래하고 싶지는 않다. 나는 슬프기만 한 사람은 아니고, 슬프기도 하고 즐겁기도 한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먼저 슬퍼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슬퍼하려고 따라나서는 사람이 덜 외롭다고 하니 다행이다. 슬픈 이야기를 꺼내 놓는 마음이 덜 무겁다. 자주 먼저 슬퍼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또 그만큼 자주, 함께 슬퍼하기 위해 따라나서는 사람이 되고 싶다.
맞아. 그래.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말을 하면서. p.24
꿈속에서는 나이면서 나 아닌 것이 많다. 내가 만져보지 못한 당신도 꿈속에는 많다. 본 적 없는 얼굴과 잡아보지 못한 손도 많아서 그건 너무 꿈 같다. 꿈이구나 생각하는 순간 끝난다. p.29
가끔씩 정말로 혼자임을 실감하면 무서웠다. 살갗이 서늘해지고 손톱 밑이 저리고 얼굴이 따갑게 혼자라는 느낌이 들 때. 어떻게 해볼 수도 없이 혼자구나 정말로 혼자구나 온 몸이 소리낼 때. 외칠 때. 사라지고 싶었다. 그럴 때 시를 읽었다. 혼자인 사람이 혼자인 것을 소래 내 외치는 시간을 읽었다. 다른 몫의 혼자를 받아들이면서, 너무 외로운 사람들의 섬세한 마음의 굴곡을 손가락 끝으로 훑어내리면서. 아무것이라도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 조금 나았다. 아니면 아무것도 되지 않겠다고. p.33
오래전 나에게 없는 것으로 인해 많이 울었던 날들이 먼 옛날 일처럼 느껴진다. 나에게 없었던 것. 사랑이나 사람이나 마음 같은 것. 여유나 인정이나 온기, 용서 같은 것. 마중하는 얼굴과 자랑스레 여기는 어깨 같은 것. p.53
이유가 궁금했던 날들도 많이 지나갔다. 전엔 모든 일의 이유를 알고 싶었다. 왜 날 사랑하지 않는지. 왜 매일 슬픈 건지. 왜 이렇게까지 힘든 건지. 왜 밝은 날들은 내게 멀리 있는지. 내 안에 꽉 갇혀버린 질문들. 이유를 알고 싶었으나 결국 내가 나라는 것 외에는 아무 답이 없었다. 허공에만 떠돌다 어디에도 내려앉지 못했던 질문들은 지금 어디쯤에 있을까. 어디에도 닿지 않았을 거 같다. 영원히 돌고 도는 것이 그 질문들이 태어난 이유일지도 모른다. p.62
마음이 자주 긁힌다. 칼날이나 송곳처럼 매섭게 날카로운 게 아니라 갈라진 플라스틱이나 오래돼서 녹슬고 뭉뚝해진 못 같은 것에. 스치자마자 베이는 게 아니라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 붉어지고 부어오른 것을 발견하게 된다. 언제 생겼는지 알 수 없는 멍도 이곳저곳 박혀있다. p.73
모두가 돌아간 집에서 개는 현관문을 바다보다가 잠들었다. 기다리기도 했을까. 아니면 여태 보내주는 중이었을까. 나는 그 마음을 알고 있다. 기다리는 것과 여태 보내주는 것의 중간 마음을. 떠난지 오래된 사람을 여태껏 보내주는 마음. 그러면서 혹시나 돌아올까 기다리는 그 마음을. p.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