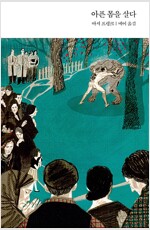20211011 #시라는별 63
살구나무 발전소
- 안도현
살구꽃 . . . . . .
살구꽃 . . . . . .
그 많고 환한 꽃이
그냥 피는 게 아닐 거야
너를 만나러 가는 밤에도 가지마다
알전구를 수천, 수만 개 매어다는 걸 봐
생각나지, 하루종일 벌떼들이 윙윙거리던 거,
마을에 전기가 처음 들어오던 날도
저깃줄은 그렇게 울었지
그래,
살구나무 어디인가에는 틀림없이
살구꽃에다 불을 밝히는 발전소가 있을 거야
낯에도 살구꽃 . . . . . .
밤에도 살구꽃 . . . . . .
안도현 시인의 일곱 번째 시집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하여』 를 거의 다 읽었다. 이 시집은 1961년생인 시인이 만으로 마흔이 되었을 때 출간되었다.
때때로 울컥, 가슴을 치미는 것 때문에
흐르는 강물 위에 돌을 던지던 시절은 갔다
시절은 갔다, 라고 쓸 때
그때가 바야흐로 마흔 살이다 (<마흔 살> 중)
˝시절은 갔다˝ 라는 의미를 나는 저 나이에는 느끼지 못했고, 그로부터 십 년이 넘는 세월이 더 흐른 요즘에야 매일, 조금 섬뜩하게 느끼며 산다. 그리고 내 어미는 그 시절을 어찌 견디며 살았을까 하는 생각도 무시로 든다. 기억을 잃어가는 어미 대신 시어머니가 대신 해주신 답변은 이러했다. ˝그런 거 느낄 새가 어딨었갔니. 애 새끼들 밥 굶기지 않으려고 일하기 바빠 죽갔는디 . . .˝ 내 어미의 삶은 시엄니의 삶과는 달랐지만, 어느 순간부터 돈벌리는 재미에 살구나무에 꽃들을 ˝알전구˝처럼 피어 올렸다. 그 시절 내 어미의 몸속에는 ˝살구꽃에다 불을 밝히는 발전소˝ 같은 것이 있어 날마다 벌떼같은 사람들이 들끓었다.
그 시절은 갔다. 영영 갔다. 내 어미 나무는 자가발전할 수 있는 동력을 잃어 더 이상 ˝알전구˝를 ˝수천, 수만 개˝씩 켜지 못하고 몇 개만 간신히 매단 채 희미한 빛을 발하고 있다. 나는 그것을 슬퍼하지 않는다. 내 어미는 충분히 열심히 꽃을 피어 올렸으니, 이제는 ˝야금야금
자신을 갉아먹는 벌레들˝(<살구나무가 주는 것들>)에게 자신의 이파리와 몸통을 내주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아주 많이 늙어가는 이들에게까지 끝끝내 곧게, 곱게 살라는 건 너무 가혹한 요구가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엄마에게 다녀왔다. 코로나로 오랜 시간 엄마와 딸이 같이 누워 보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한 요양원 측에서 독방을 내주며 하는 말, ˝엄마 품에 안겨 한 시간 정도 같이 자요.˝ 물론 어미는 몸이 아파 쉬이 잠들지 못했고, 나는 어미의 아픈 몸을 주무느니라 잠들 수 없었다. 정신이 깜박깜박 하는 와중에 어미가 내 어떤 물음에 명쾌하게 답을 해주었다.
ㅡ 엄마, 나 키우면서 뭐가 젤 힘들었어?
ㅡ 요기 3분, 조기 3분, 저짝에 3분. 정신을 쏘옥 빼놓는 게 젤 힘들었재.
ㅡ 근데, 왜 야단 치지 않았어. 딱 부러지게 혼을 내지 그랬어.
ㅡ 하이고, 엄마만 보면 좋다고 헤헤거리며 다가오는데 우째 혼을 내노.
ㅡ 내가 그랬어? 내가 엄마 좋다고 헤헤거렸어?
ㅡ 하모, 그랬재.
이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고, 내가 모르는 나였다. 내가 기억하는 나는 엄마 품을 찾는 아이가 아니었고, 내가 기억하는 엄마는 다가가기에 매정한 엄마였다. 그랬던 시절도 갔다. 지금은 내가 모르는 어린 나를 우쭈쭈하며 안아주고 업어주고 달래주었을 어미를 상상할 줄 아는 나이 든 내가 있다. 나는 이런 내가 썩 괜찮고, 발전소 문을 닫으려 하는 늙은 어미의 마르고 퍼석한 몸뚱이를 만지며 내 늙어가는 모습을 상상한다.
주목나무는 살아 천년 죽어 천년을 사는 나무라고 한다. 사람도 죽어 천년을 살지 모른다. 우리의 몸속엔 어미의 어미의 어미의 어미의 어미의 . . . 피가 흐르고 있을 테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