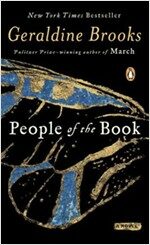
People of the Book
- Geraldine Brooks 지음 / Penguin Group USA / ★★★★
춘천 북쪽 용화산 기슭 근처에 고탄이라는 동네가 있다. 집안 선산이 있는 곳인지라 어렸을 때부터 명절 때마다 꼭 가게 되는 곳이다. (그러고보니, 한국에 있었으면 지금쯤 벌초하러 갔겠구나) 예전에는 춘천에서 이 곳으로 가려면 춘천댐 근처까지 올라가서 물길을 따라 나 있는 좁은 도로를 따라 들어가야 했는데, 언제부터인가(기억이 잘 안 난다) 지내리를 통해 고개을 넘어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생겼다. 이 고갯마루 무렵에서 뒤를 돌아보면, 산등성 사이에 자리잡은 작은 평야가 눈에 들어온다. 산을 병풍처럼 두르고 물길을 따라 자리잡은 작은 마을들과 논밭들. 전형적이라 할 수 있는 한국 농촌의 풍경이다.
이 풍경 자체가 내게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나는 이 풍경을 볼 때마다 인간의 역사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아마 수천년전 춘천 부근에 터를 잡았다는 고대국가 맥국(貊國)에 대한 이야기가 상상력을 불어넣은게 아닐까 싶다. 수천년 전에도 누군가가 저 곳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은 언제나 나를 경이롭게 한다. 기껏해야 50~100년 사는 인간의 삶이 쌓이고 쌓여 수천년의 강을 이룬다. 누군가 이 땅에 자리를 잡아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의 자식이 또 자식을 낳아 오늘의 나까지 이어진 셈이다. 그 강물은 나를 지나쳐 또 수천년을 흐를 것이다. 그것이 역사책에는 담기지 않는 진정한 인간의 역사 아닐까.
물론, 기록에 남지 않은 이들 하나하나를 오늘의 우리가 기억할 방법은 없다. 큰 사건이나 업적이 없는 이상 개인의 삶은 역사학의 시야 밖에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 모든 익명성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마을 제방의 저 돌을 쌓았고, 누군가는 우물을 파 시원한 물을 퍼올릴 수 있게 하였고, 또 누군가는 나무를 심어 쉴 그늘을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오늘의 우리가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한 과거의 그들을 기억하는 출발점은 바로 그 간접의 증거들이다. 그리고, 그 토대 위에 상상력의 벽돌을 쌓아올려 모두가 볼 수 있는 작은 사원을 짓는 것이 문학의 몫이 아닐까 싶다.
그러니, <People of the Book>은 책보다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맞겠다. "사라예보 하가다(Sarajevo Haggadah)"는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소재이지만, 작가가 이를 통해 풀어내려 한 것은 이 작은 책 한 권에 얽힌 이름 없는 이들의 삶이다. 책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작은 힌트들(곤충 날개, 얼룩, 흰 머리카락 등)은 각각 이 책이 거쳐간 인물과 시대들을 보여주는 에피소드로 이어지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머나먼 땅의 오래되고 낯선 인물들의 모습을 우리 앞에 그려 놓는다. 하지만 이 이국적 풍광과 인물들 속에서 느껴지는건 이질감이 아닌 동질감과 공감이다. 슬픔과 기쁨, 분노와 용서, 탐욕과 박애. 그 긴 세월 동안에도 우리는 모두 이토록 인간적이지 않았는가.
책의 중심 소재가 된 "사라예보 하가다"는 실존하는 책이다. 하가다(Haggadah)는 유대인들이 유월절의 첫날밤(Passover Seder) 자식들에게 유대인들이 모세를 따라 이집트를 탈출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사용되는 경전이다. 보통의 하가다는 간결하고 검소하게 만들어지는데 비해 사라예보 하가다는 매우 화려한 그림과 장정을 사용해 예외적인 사례로 더 큰 문화사적 가치를 가진다고 한다. 하지만 이 책이 작가의 흥미를 끈 것은 그 예외성 때문은 아니다. 2차 대전과 유고슬라비아 내전 등을 거치며 이 책은 여러번 파괴될 위기를 넘겼는데, 그 때 이 유대교 경전을 구해낸 것은 다름 아닌 무슬림이었다. 오늘날의 종교간 갈등(을 표방한 헤게모니 다툼)을 생각해보면 이러한 종교적 관용의 실례는 좋은 소재가 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감동적인 이야기인데, 소설로 재구성되면서 어쩐지 상투적이라는 느낌을 준다. 이야기의 초점이 무슬림이 아닌 유대인에 맞춰지면서 목숨을 걸고 책을 구해낸 무슬림의 이야기는 곁가지로 밀리고 있는 탓이다. 신앙은 그 속성상 자신의 신앙이 옳다는 독선을 어느 정도 전제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믿기 때문에 신앙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 독선을 넘어선 관용이 더욱 어렵고 가치 있는 일일 것이다. 그런데, 이 책의 무슬림들에겐 그게 너무 쉽다. 마치 아무 이유 없이 백설공주를 도와주는 착한 일곱 난장이처럼 말이다. 그러니 결국 주인공은 유대인이라고 읽는건 그저 내 편견일까? 게다가 주인공인 한나가 알고보니 유대인 핏줄이었다는 내용까지 접하고나면 슬슬 짜증까지 밀려온다. 내가 보기엔 굳이 전체적인 이야기의 전개와 연관도 없는데 말이다. 왜 이렇게까지 유대인이라는 핏줄에 집착하는거지?
개인적으로 내러티브의 개연성을 떨어트리는 소재는 과감히 덜어내는 것이 좋은 작가의 기준이라고 믿는다. 작가로서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을지 몰라도, 독자에겐 과잉으로 느껴질 뿐이니까. 작가의 전작들을 접해보지 못해서 이 작가의 일반적인 성향인지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그 때문에 작가의 다른 작품을 찾아 읽을 생각까지는 딱히 들지 않는다. 좋았던만큼이나 실망도 남는 책이다.
ps. 원서읽기에 대한 첨언 : 단어나 문장 등이 전체적으로 무난한 수준이니 원서로 읽어도 크게 부담은 없겠다. 하지만 거꾸로 말하면 굳이 원서로 읽을만한 이유도 별로 없어 보인다. 중간중간 히브리어가 영역되지 않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좀 귀찮기도 하다. 국내 번역본의 번역이 얼만큼 잘 빠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왠만하면 번역본으로 읽는게 무난할 듯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