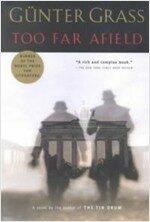
Too Far Afield
- Gunter Grass 지음 / Harcourt / ★★★★★
그 날, TV 뉴스는 긴급 속보로 베를린 장벽의 붕괴를 알리고 있었다. 화면은 온갖 낙서로 가득한 잿빛 담벼락 주위로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비추고 있었는데, 일부는 아예 담 위로 올라가 있었으며, 다른 사람들은 깃발을 흔들거나 서로 부둥켜 안은 채 기쁨을 나누고 있었다. 감격과 환희에 찬 모습들. 하지만 어린 나로서는 무언가 대단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정도만 느낄 수 있었을 뿐,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다. 그것이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1989년 11월 9일의 일이었다.
그로부터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1990년 10월 3일, 동독과 서독은 하나의 독일로 재통일된다. ‘통일’ 이라고는 하지만, 동독 지역에 속했던 주들이 독일 연방 공화국(서독)에 가입하는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사실상 ‘병합’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병합의 의미는 분명했다. 동독 지역에서 40여년간 고수해 왔던 공산주의 제도와 정책들을 모두 무효화하고, 대신 서독의 자본주의 시스템을 전면화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독일 통일은 공산주의의 붕괴, 더 나아가 자본주의의 승리를 상징하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졌다.
무능하고 부패한 공산주의가 몰락하고 민주적이며 부유한 자본주의가 승리했다는 시각은 독일 통일을 바라보는 가장 보편적인 관점이다. 분명 역사는 자본주의 국가들이 현실 공산주의 국가들보다 최소한 더 유연한, 따라서 더 유능한 체제임을 증명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비교우위가 한 쪽이 옳고 다른 쪽이 그르다는 평가로 이어지는 것은 분명 논리의 비약이었음에도, 이러한 평가는 서독을 위시한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사실, 서독인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단순화는 매우 편리한 것이었다. 이 도식을 통해 동독의 몰락이 곧 무능한 체제에서 고통받던 동독인들의 해방을 의미한다고 받아들여졌고, 자연스럽게 통일이 모두를 위한 善(심지어 동독의 빈곤까지 떠안은 서독의 희생이라는 주장과 함께)이라는 결론으로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
|
|
| |
What he really wants to hear is that we suffered day and night and felt like we were in one of those concentration camps(정말로 그가 듣고 싶어한 것은 우리가 그런 수용소들 중 하나에 있었던 것처럼 느끼며 밤낮으로 고통받았다는 말이었다 ). P. 272 |
|
| |
|
 |
물론, 대부분의 동독인들도 장벽의 붕괴와 독일의 재통일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2차 대전 패전 이후 점령국들에 의해 인위적으로 분단된 나라가 하나로 다시 합쳐지는 것은 물론이요, 동독의 일상을 지배했던 경제적 빈곤과 정치적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독인들이 통일이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장벽 붕괴 이후 실제 통일에 이르는 불과 1년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즉 통일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이미 동독인들은 통일이 자신들의 삶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살아왔던 삶 전체의 해체(winding down)였다.
독일 통일의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 기구는 Treuhandanstalt (영역본에는 Handover Trust로 번역되어 있는데, 한국어로는 적당한 표현이 떠오르지 않는다) 였다. 이 기구의 목적은 동독의 자산을 사유화 하는 것. 협동농장이나 공장 등 이전에는 “인민(people)”의 소유였던 자산들이 자본주의로 편입되면서 누군가의 사유재산으로 바뀌어야 했던 것이다. 이 거대한 이권을 향해 서독은 탐욕스럽게 달려들었다. 개인들은 동독 지역 구석구석을 누비며 부동산을 헐값에 사들였고, 기업들 역시 공장 등의 자산을 인수한 후 자신들의 시스템에 맞게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죽은 시체에 달려들어 살점을 뜯어먹는 하이에나 떼처럼, 그들은 무너진 체제를 갈기갈기 찢어 자신들의 배를 채웠다. 책 첫머리에 묘사되었던, 무너진 베를린 장벽에 모여들어 뜯어낸 조각을 기념품으로 챙기거나 팔아치우던 사람들의 모습은 앞으로 벌어질 통일의 한 측면을 보여주는 전조였던 셈이다.
이렇게 해체된 것은 체제만이 아니었다. 개인들의 삶 역시 그와 함께 해체당했다. 서독인이 인수한 부동산은 ‘재개발’이 되어 고급 주택가로 바뀌었으나, 그 곳에 살던 동독인들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쫓겨나야만 했다. 어제까지 “인민”의 공장에서 일하던 수많은 노동자들이 사유화의 과정에서 해고되었고, 저가의 노동 시장을 전전해야만 했다. 그나마 모아두었던 연금과 사유재산 역시 화폐 통합의 과정에서 반토막이 난 상태였다. 하지만 그들은 반박할 수 없었다. 그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왔던 것들(공공주택, 노동자 소유의 공장 등)은 ‘사회주의적’인 사고였으며, 통일된 ‘자본주의’ 독일에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고방식이었기 때문이다. 오직 ‘잘못된’ 체제에서 살아왔다는 이유로 그들의 모든 사고는 ‘잘못된’ 사고방식이 된 것이다.
 |
|
|
| |
Furthermore, he says, and I agree, that the rules of impending unification demand- in order to justify this move as the victory of capitalism- that not only every product of our devising but also every last Eastern idea be proven worthless(더 나아가 그는 임박한 통일의 규칙들이 – 이러한 변화를 자본주의의 승리로 정당화하기 위해서 - 우리가 만들어낸 제품들 뿐 아니라, 동독식 사고 하나하나가 모두 무가치한 것으로 증명될 것을 필요로 한다고 말한다). P.295 |
|
| |
|
 |
하지만 합병’당하는’ 동독 지역의 목소리는 통일의 환상에 젖어 있는 독일 주류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외면 받았다. 다시 하나가 된 ‘강력하고 위대한’ 독일에 대한 찬가가 울려퍼질 때, 그 영광된 순간이 동독인들의 희생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니, 95년 귄터 그라스가 독일 통일이 동독인들에게 어떤 삶의 조건들을 강요했는지는 통렬하게 비판하는 이 책 [Too Far Afield(원제 : Ein Weites Feld)] 를 발표했을 때, 독일 사회가 격렬한 논쟁에 휩싸인 것은 놀랄 일은 아니다. 당시 슈피겔 지는 보수적인 평론가로 유명한 마르셀 라이히-라니츠키가 이 책을 반으로 찢는 합성사진을 표지사진으로 게제함으로써 논쟁이 얼마나 격렬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훗날 귄터 그라스는 이 작품을 둘러싼 논쟁이 본질적으로 ‘문학적’이기보다는 ‘정치적’인 성격의 것이었다고 회고했다. 미학적으로 무가치하다, 지루하다, 혹은 구동독의 슈타지(Stasi)를 미화했다 등 여러 가지 혹평이 쏟아졌지만, 논쟁의 진영은 독일 통일에 대한 평가를 두고 명확히 갈려 있었으니까.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소설이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철저히 ‘문학적’이기 때문이었다. 독일 통일에 대한 비판적 문제제기는 이전부터도 존재해 왔다. 다만 귄터 그라스는 문학 본연의 능력을 통해, 즉 타인(동독인)의 시각으로 세계를 조망함으로써 읽는 이로 하여금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더 큰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허나, 이 작품의 의미를 “독일 통일에 대한 비판적 문제제기”로 단정짓는 것도 일종의 평가절하다. 사실, 통일의 형식에 대한 논쟁이라면 “흡수통일보다는 헌법 개정을 통한 연방제가 더 적절했다”는 짧은 결론으로도 충분했다. 그리고 그 결론을 위해서라면 작품의 주인공 역시 통일 이후 불안정한 미래에 신음하는 어느 동독 출신 노동자로 설정하는 것이 더 적절했을 지도 모르겠다. 만약 그랬다면, 이 작품은 사회적으로 유의미할 지언정 문학적으로 그저 그런, 평범한 작품으로만 남았을 것이다. 하지만 작가는 다른 길을 택했다. 비록 멀리 둘러 돌아가는 길이지만, 그래서 그 의미와 깊이를 잡아내려면 훨씬 많은 노력을 요구하지만, 이를 통해 작가는 독자들로 하여금 눈 앞의 사건에 매몰되지 않고 보다 더 긴 호흡으로 독일의 역사를 되돌아보도록 이끈다.
수많은 상징과 은유로 넘쳐나는 이 작품에서 가장 흥미로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설정 중 하나는 주인공 Theo Wuttke 라는 인물이 한 세기 전을 살았던 작가 Theodor Fontane 의 삶을 재현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통일 공간이라는 좁은 시간대는 Wuttke 의 삶을 통해 20세기 전체로 확장되고, 다시 Fontane 를 통해 한 세기 전으로 이어지며, 궁극적으로는 독일의 근대사 전체로 확장되게 된다. 프리드리히 대제로부터 비스마르크, 1차 세계대전과 바이마르 공화국, 나치의 준동과 2차 세계대전, 그리고 분단과 긴 냉전에 이어 마침내 재통일에 이르기까지. 그러나, 이 격변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한 세기의 간격을 가진 두 인물의 삶은 놀라울 정도로 서로 겹친다. 시대에 따라 체제가 변하고 정부가 바뀌었지만, 실제 독일을 지켜온 독일인의 삶, 그리고 독일의 문화 유산(cultural heritage)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Theodor Fontane(1819 - 1898)
작품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장식하는 강연에서 Fonty(Wuttke 의 별명)는 Fontane 의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하나씩 불러낸다. 한세기 전 독일, 특히 베를린의 시민 사회를 그린 Fontane 의 인물들은 강연을 들으러 온 사람들(대개 구 동독인들)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독일인들의 표상이다. 문학은 이렇게 웃고 울고 때로 환호하고 때로 분노하는 인간의 삶이 시대와 체제를 넘어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기에 청중들 역시 자신이 좋아하는 작중인물을 연호하여 이 상상의 파티에 동참한다. 현실에서는 통일이 그들에게 이등국민의 지위를 강요할 지언정, 적어도 이 파티에서만은 그들 역시 독일 시민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인정받으며, 초대받은 손님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작가가 이 작품을 통해 독일 사회에 요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들이다. 통일을 체제의 문제로 바라보는 대신,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갈 독일 시민으로서의 연대의 문제로 바라보자는 것이다. 그것이 형식으로서의 통일이 아니라, 진정한 통합으로서의 통일을 지향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된다. 물론, 통일의 과정에서 더 익숙한 쪽이 다른 쪽을 이끌 수는 있을 것이다. 전지구적 자본주의가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면, 그래서 동독의 사람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정복자가 되어 그들을 윽박지르고 갈취하는 대신, 손을 내밀어 그들의 변화를 도울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흔들리는 조각배 위에서 자리를 바꾸는 이들처럼, 조심스럽게, 그러나 모두가 같은 배를 타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
|
|
| |
At any rate, the two of them stood facing each other without a word. No order was given, unless of course my whispered "Go!" was a help: now they began changing positions simultaneously. With small groping steps, which, however, could merely be guessed at from the shore, they moved a shoe's width at a time, at first freehand, their arms still dangling, then joined together, each seizing hold of the other, for the boat had begun to rock, and they were now reeling along with it. Fonty's hands gripped Hoftaller's shoulders firmly, and Hoftaller hung on to Fonty's hips.
What could now be heard from the shore were instructions issued to Hoftaller, which he followed scrupulously because his subject was experienced at changing places in a rowboat. The linked pair pushed and turned clockwise. A solemn, groping dance. Or a ceremony of ritual seriousness. Or an embrace of the sort that is based on the well-known assurance: We're in the same boat.
(어쨌건, 그들 둘은 말 없이 서로를 마주하고 섰다. 그리고, 내가 "가요!"라고 속삭인게 들렸던게 아니었다면, 아무런 신호도 없이 동시에 자리 바꾸기를 시작했다. 비록 호수 기슭에서는 그저 추측할 따름이지만, 작은 종종걸음으로 한 번에 신발 하나의 폭만큼씩 움직이면서. 처음에는 빈 손으로 팔을 허공에 내밀었는데 배가 흔들리기 시작하자 이내 하나로 합쳐져 서로를 웅켜잡았다. 그들은 배와 함께 흔들리고 있었다. Fonty의 손은 Hoftaller의 어깨를 꽉 잡았고, Hoftaller는 Fonty의 엉덩이에 매달렸다.
이제 호수 기슭으로 Hoftaller에게 내려지는 지시들이 들려왔다. Fonty가 배 안에서 자리를 바꾸는데는 익숙했기 때문에, Hoftaller는 그의 지시를 충실히 따랐다. 연결된 둘은 서로를 밀며 시계방향으로 돌았다. 장엄하면서도 조심스러운 춤. 또는 제의적 진지함을 지닌 의식. 또는 “우리는 같은 배를 탔다네”라는 잘 알려진 확신에 근거한 포옹 같은 것.) P. 340 |
|
| |
|
 |
그러나 불행히도, 작가의 염원은 실현되지 못한 듯 하다. 오늘날 오씨(Ossi, 구 동독 지역 출신)와 베씨(Wessi, 구 서독 지역 출신) 간의 빈부격차와 갈등은 독일 사회의 가장 큰 불안 요소로 남아 있으니까 말이다. 겉으로만 본다면 독일은 더 강한 국가가 되었다. 한 때 전범국가로 인류의 죄인 취급을 받기도 했지만, 오늘의 독일은 유럽연합을 이끄는 중심국가가 되었으니까. 하지만, 그것이 진정 독일이 추구해야 할 가치일까? 강한 독일, 영광된 프로이센의 재림이라는 환상에 취하기보단, 고통받는 형제와 친구의 아픔을 함께 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 그것이, 모두가 프로이센의 절대군주 프리드리히 대제를 기리는 동안, Fonty가 친구 프리드리히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Katte 를 추모하는 까닭일 것이다. “I still say, my hero is Katte : 여전히 말하지만, 내 영웅은 Katte 라네”(P.623)
당연한 얘기겠지만, 독일의 통일은 그저 남의 일이 아니다. 남과 북으로 갈린 우리에게도 통일은 (아직은 요원해 보이지만) 언젠가 다가올 미래일 것이다. 그러나, 그 통일에서 당신은 무엇을 기대하는가. 북한을 붕괴시켜야 한다는 주장, “공산 독재 타도”, “고통받는 북한 민중의 구제”와 같은 익숙한 레토릭이 가져올 미래는 뻔하다. 그 레토릭이 전제하는 흑백논리(자본주의가 옳고 공산주의가 그르다)야말로 통일 후 우리 사회를 야만으로 이끌 광기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It looks as though the victory over communism has made capitalism rabid : 마치 공산주의에 대한 승리가 자본주의를 미쳐 날뛰게 만든 것처럼 보였다. P. 569) 삼등국민으로 편입되어 사회의 밑바닥을 형성할 북한 지역 출신들, 북한 지역 전체를 투기의 장으로 뒤바꾸어 놓을 남한의 자본들, 그 와중에서 통일의 공로를 가로채려 이전투구하는 정치인들. 지금과 같은 대결논리가 횡행하는 이상, 이러한 상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개연성이 높은 우리의 미래이다.
따라서, 통일을 준비하는 것은 바로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노력과 다르지 않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 다름에도 불구하고 모두 평등한 인간이라는 연대의 정신을 공고히 하는 것이야말로 통일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이 될 것이다. 한 사회의 수준은 결코 그 나라의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 가늠되지 않는다. 오히려, "강함"을 선호하는 사회일수록 "약한" 사람들에게는 지옥과 같은 사회가 되기 마련이다. 이 사회의 약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나 이주 노동자들, 조선족 동포들을 대하는 모습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진정한 가치를 말해주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그것이 독일 통일을 통해, 그리고 이 작품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 아닐까.
이 외에도 너무도 풍부한 작품이라 미처 적지 못한 이야기들이 여전히 많다. 책 자체도 결코 적지 않은 분량인데 그 안에 그보다 훨씬 더 큰 사유를 압축적으로 담아 놓았으니, 진지한 독자들에게는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책이 되리라 믿는다. 국역본이 없어 영역본으로 읽긴 했는데,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다. 문장이 어려운데다, 독일 역사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필요로 하고, 또 Fontane의 작품들이 끊임없이 인용되기 때문이다. 결코 녹록치 않은 작업이겠지만, 이 책은 꼭 번역되어 나와야 할 작품이 아닐까 싶다.
단언컨대, 이 작품은 우리 시대의 고전으로 남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