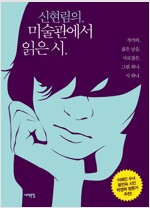
인터넷서점 알라딘의 문화초대석에서 신현림 시인과 함께하는 낭독의 밤, 이벤트에 당첨되어 류가헌갤러리에 다녀왔다. 서촌 류가헌갤러리는 사진전을 주로 하는 곳으로 한옥으로 되어 있어서 더욱 인상적이었다. 아이들에게도 좋은 경험이 될 거라며 아이들 동반을 흔쾌히 허락해준 관계자 덕분에 아이 둘을 데리고 서울 나들이를 다녀오게 되었다.
4월, 어느새 따뜻해진 날씨에 류가헌갤러리 마당에 모여 앉은 저녁 시간도 아늑하고 따뜻하게 느껴졌다. 진한분홍 원피스에 연한분홍 양말을 신은 시인의 모습은 평소 알고 지내는 옆집 언니의 모습처럼 정겨웠다.
시를 읽기 전에 갤러리에 전시중인 사진들을 큐레이터의 설명과 함께 둘러보았다. 그냥 무심히 볼 때와 다르게 작품에 대한 이해에 큰 도움이 되었고 처음에는 시큰둥한 모습이던 아이들이 어느새 사람들 앞에 나가 설명과 그림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마당을 향해 툇마루에 걸터앉거나 마당을 둘러싼 보조의자에 자리하고 앉았고 시인은 사진책 도서관을 뒤로하고 우리를 향해 앉았다. 시인을 향해 둘러앉은 독자들은 시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다. 미술에 조예가 깊은 시인의 면모에 다시 반하는 시간이었다.
스무 명 남짓한 독자들과 시인의 만남은 오붓하게 느껴졌다. 봄밤에 어울리는 꽃도 한 송이씩 선물해주어서 기분이 한결 들뜨는 것 같았다.
<신현림의 미술관에서 읽은 시>에 실려 있는 시 중에서 네 편의 시를 낭독하였다. 처음엔 백석의 <선우사>를 가장 늦게 온 미모의 독자가 낭독하였다. 전기의 <매화초옥도> 그림을 함께 보며 시인의 이야기를 들었다. ‘벗을 만나러 가는 길’이라는 소제목만으로 우리의 시낭독회를 여는 시로 맞춤했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들은 가난해도 서럽지 않다/ 우리들은 외로워할 까닭도 없다/ 그리고 누구 하나 부럽지도 않다”(백석, <선우사>중) 눈처럼 피어난 매화꽃 풍경도 아름답지만 아직은 쌀쌀한 초봄, 하얗게 눈 덮인 산길을 헤치며 벗을 찾아가는 선비의 모습은 가슴 찡하도록 아름답다는 시인의 이야기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형렬 시인의 <꽃의 통곡을 듣다>를 낭독하였다. 아이들과 함께 갔으니 눈에 쉽게 띄었고 시인은 아들에게 한번 읽어 보겠냐고 하셨지만 부끄러워하는 아들을 대신하여 엄마인 내가 낭독하기로 하였다. 대신 마당의 한가운데에 아들과 등을 지고 서서 낭독해달라고 부탁하셔서 그렇게 하였다. “꽃의 통곡을 듣다/ 밖에서 누가 부르니까 꽃이 피는 겁니까/ 누가 찾아왔다 간다 나를 찾아올 사람들은 죽었는데/ 주먹을 자기 얼굴 앞에 가만히 올리고/ 가운뎃손가락 마디로 현관문을 똑똑똑 노크한다/ 먼 곳이다 작년의 그루터기와 얼음을 밟고 오는/ 그 신의 증인들일까/ 나는 대답을 놓쳤다 안에 주인 분 아니 계십니까/ 혀는 있는데 언어가 없어 대답할 수 없었다/ 물은 고여 침묵한다/ 방문이 실례가 된 적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나는 오늘,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게 되었다/ 안에서 부름켜가 인간의 마음을 듣고 있었다/ 숨어 있는 것이 있다면 대답 않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꽃이 오는 길이 매우 춥고 그 시간은/ 우리가 태어나던 침묵의 흐름입니까/ 그럼 밖에서 누가 부르지 않아도 꽃은 피는 것입니까/ 하지만 가지에 저렇게 많은 꽃이 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표시가 아니겠습니까/ 등 뒤에 그리고 뇌 속에/ 그들이 걸어가는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전문) 프랑스 초현실주의 화가 이브 탕기의 그림 <엄마, 아빠가 다쳤어요>와 함께 읽은 이 시는 “저렇게 많은 꽃이 피는 건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표시”라는 구절에서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세 번째로 낭독한 시는 데이비드 허버트 로렌스의 <현대의 기도>라는 시였다. 이 시의 거친 언어로 남성독자가 낭독하기로 하였는데 시인의 왜 혼자 왔냐는 질문에 남성독자는 시는 혼자일 때 더 감흥을 느낄 수 있다며 그 시간을 즐기러 왔다고 하였다. 뭉크의 <절규>와 함께 이 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자본주의 사회의 적나라한 비판이 담겨 있었다. 에드바르트 뭉크의 <절규>를 처음 접했던 스무 살 무렵의 충격이 지금은 많이 완화된 것을 느낀다는 시인의 말에 나도 그렇다는 생각을 하였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림이라 아이들도 아는 그림이라고 아는 척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신현림 시인의 <양말 한 마리> 시를 시인이 직접 낭독하였다. “당신이 선물 준 양말을 버릴 수가 없어/ 해진 곳을 기워 가니 비단길처럼 아름다워요/ 한 땀 한 땀 기울 때마다/ 돈황 가는 길목/ 명사산 모래소리가 흘러내려요/ (중략) / 가엾이 여기는 사랑 끝에서 날개가 자라고/ 우리는 서로 버리지 못할 양말이 되어/ 붉은 저녁 하늘을 맘껏 날으며 흘러내려요” 어긋나고 합쳐지는 사랑의 속성을 표현한 이 시는 시인이 정말 양말을 기우며 쓴 시라고 하였다. “서로를 가엾이 여기는 연민이 그 어느 때보다도 소중한 때”라고 말하는 시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시를 읽는 밤은 깊어가고 시간은 정말 빠르게 지나갔다. 정해진 시간을 훌쩍 넘겼지만 우리는 어느 누구 하나 쉽게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낭독회가 끝나고 준비해간 책에 시인의 서명을 받았다. 그리고 시인과 포옹하고 사진까지 찍었다. 아이들은 처음 경험하는 광경이 낯설기도 하였겠지만 평소와 다른 분위기에 압도당한 듯 그 흥분이 쉽게 가시지 않았다.
혼자 즐기는 것도 좋았겠지만 엄마가 가는 곳을 구경하고 싶어 하던 아이들과의 동행은 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아이들이 처음 가본 한옥갤러리, 사진전 그리고 시인과 함께하는 낭독회의 추억이 어른이 되어서도 오롯이 남아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