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에 가서 머뭇거리면 누군가 달려와서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간이 카페의 키오스크 앞에서 잠시 카드를 만지작거리면 누군가 냉큼 달려와서 대신 해주려고 하고, 매표소에선 어르신 우대에 해당되지 않냐고 물어보질 않나... 어르신 되려면 아직 멀었는데..... 그런 친절을 바라지 않는데 세상은 자꾸 내게 친절을 베푼다. 아무래도 머리 염색을 해야 하나. 누군가에게 친절을 바란다면 빨리 늙어서 하얀머리 휘날리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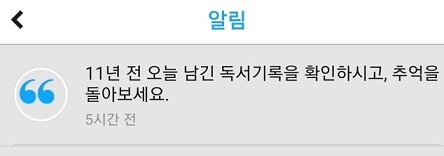
북플을 열면 거의 매일 이런 알림이 뜬다. 이런 알림이 뜨지 않는 날이 있었던가 싶게 거의 매일이다. 그냥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진 않았구나 생각하지만 가급적 지난 글을 다시 읽지는 않는다. 읽기가 싫다. 다만 무슨 책을 읽었나 싶어 슬쩍 열어보면 대부분 기억이 나지만 어떤 책은 매우 낯설게 다가온다. 이건 뭐지? 뭐가 되었든 그래도 기록을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편견이나 독단일지라도.

글은 매끄럽지만 울림은 약한 책. 한 권의 책에서 두고두고 되새길 한 문장이라도 남으면 되지 뭐.
-58쪽
누군가의 슬픔을 알면, 정말 알면, 무엇도 쉬이 질투하게 되지 않는 법이니까. 어려운 형편은 모르고, '좋아 보이는' 면만 어설프게 알 때 질투가 생긴다.
-62
오늘 아침 소파에서 남편의 신간 시집을 읽다 이런 구절을 발견했다. "세월이 가면 우정은 사소해진다." 별일 없이 마음을 다치게 하네. 시는 이게 문제다.
-280
멀어진 친구를 생각하면 한밤중에 갑자기 가난해진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마음을 탈탈 털린 기분.

단순 여행자의 단편적인 경험 이상을 누리는 사람의 책. 질투하며 읽은 책.
-118
작은 언어가 모어인 사람은 시인이 될 확률이 높다. 시의 독자도 마찬가지다. 독일 시인 한스 마그누스 엔첸스베르거가 언젠가 신문에 썼다. 지금 시대에 시집은 크로아티아어로 출판되든 미국에서 영어로 출판되든 2천 부도 안 팔리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미국 인구는 크로아티아 인구의 60배쯤 된다. 그렇다면 비율로 따져 크로아티아에서 시집이 엄청 잘 팔린다는 말이다.
-120
유럽은 프라하나 빈처럼 아름답고 오래된 수도가 많다. 하지만 현대식 생활을 해치지 않고 관광객을 만족시키려는 나머지, 너무 정리된 완성작 같다. 그에 비하면 소피아는 관광객도 거의 없고 생활도 그다지 쾌적하지 않다. 하지만 로마 유적, 비잔틴 교회, 터키 식민지 시대의 이슬람 사원, 내가 좋아하는 러시아 교회, 빈에서 공부한 건축가들이 세운 아르누보 양식의 건축, 소련식 건물 등 볼 것이 많다. 역사의 흔적이 거인의 발자국처럼 성큼성큼 남아 있는 곳에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아, 피곤하긴 하지만 흥분을 느낀다. 조그마한 과거를 만지작거려 기념품처럼 만든 소규모 '관광지'가 아니다. 역사라는 거대한 공사 현장에 던져진 듯한 감동이 밀려왔다.
*소피아: 불가리아 수도
-172
전에도 이런 경험이 있었다. 일본은 택시 운전사가 몸도 마음도 프로인데, 독일은 원래 교사였거나 생활고에 시달린 시인 또는 예술가였던 사람이 택시 운전사일 때가 많다. 이 손님들, 자신들은 잘난 듯 문학을 하면서 나는 하찮은 운전사라고 생각하나 보네, 하고 확 액셀을 밟은 것이리라. 도시는 곧 운전사의 언어고 골목길은 운전사만 알고 있는 문법이다.
-207~208
일본에서 독일어를 공부하는 사람에게도 독일어로 일기 쓰기를 권하고 싶다. 문법이나 철자에서 틀리는 부분이 많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우선 무시하고 쓰고 싶은 말을 즐겁게 쓰는 것이다. 재미있는 점은 모어로는 부끄러워서 쓰지 못했던 것을 아무렇지 않게 외국어로 쓸 때가 있다는 점이다. 매일 글쓰기를 하면 글이 이어져서 천을 짠 것처럼 또 다른 자기가 나올지도 모른다. 외국어 공부는 새로운 자기를 만드는 일, 미지의 자기를 발견하는 일이다. 나를 비롯해 일본어가 모어인 사람들은 일본어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웠다. 생각해선 안 되는 일, 입에 내서는 안 되는 말이 금기로 머릿속에 일본어로 설정됐다. 다시 말해 일본어로 글을 쓰면 자동적으로 금기를 건들지 않게 된다. 대신에 외국어로 글을 쓰면 이 금기를 배척하는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평소에 생각지도 못한 것을 과감하게 쓰기도 하고 잊어버렸던 어린 시절 기억이 갑자기 되살아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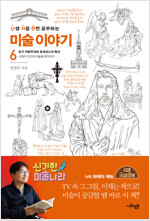
'초기 자본주의와 르네상스의 확산' 시장이 인간과 미술을 움직이다.
대하소설을 제대로 읽은 적이 거의 없는데 이 책은 나오는대로 읽고 있다. 이 시리즈를 반복해서 한번 더 읽으면 내 것으로 소화시킬 수 있을 것 같다. 흐름으로 읽는 거라서 인상적인 부분을 옮기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만 6편에서는 '제대화'에 대한 안목을 기를 수 있어서 좋았다는 것을 말해둔다. 유명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종교화라고 싸잡아서 도외시했던 그림들을 조금은 볼 수 있게 되었다.

범우문고 시리즈를 아시는가?
1. 수필(피천득)
2. 무소유(법정).....288번 까지 출간되었다.
법정스님의 <무소유>가 범우문고 출신이다. 유명했다. 삼중당문고, 서문문고, 범우문고와 친하게 지내던 시절이 있었다. 부담없이 구입, 지적 허기를 채워주었던 책들이다. 옛친구를 만난 기분이다.
-99
슬갑 도둑
남의 시문의 글귀를 따다가 제것인 양 쓰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슬갑(膝匣)이란 겨울에 추위를 막기 위하여 바지 위로 무릎에 껴입는 옷이다. 그런데, 어느 도둑은 남의 슬갑을 훔쳐서는 이것을 어디가 쓰는지를 몰라 이마에다 붙이고 나왔다가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었다는 것이다.
옛날에도 표절은 욕먹을 짓이었나보다. 도둑놈이니까.

스페인어를 독학해보겠다고 이런저런 책을 사보았지만 모두 작심삼일. 기초가 없으니 어쩌면 당연한 일일 터. 이 책만큼은 끝까지 읽고, 기초 단어 정도는 착실하게 노트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왕초보가 읽기에 딱 어울리는 책이다.

멍멍이 머리맡에서 발견한 책.(우리집 개 소파는 책장 앞에 있다.) 딸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사준 책이다. 오우, 나도 제법 훌륭한 엄마였음을 입증하는 책.^^
중세에도 앞선 여성들이 많았다. 단지 우리가 모를 뿐. 그런 걸 가르치지 않을 뿐.
한 꼭지씩 읽어가며 연신 감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