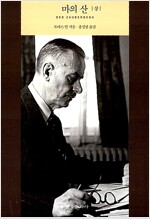그러니까 ..... 테리 이글턴의 [악], 토마스 만의 [파우스트 박사],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표상으롯의 세계](테리 이글턴은 "인간의 어둠을 다룬 위대한 기념비"라고 평했다.),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쇼펜하어의 [의지와 표상]을 소설에 구현한 작품).....슈테판 츠바이크의 [톨스토이를 쓰다]...로
메뚜기처럼 이책저책으로 옮겨가며 읽고 있는데, 츠바이크의 [톨스토이를 쓰다]를 보다가 전기작가의 왕이라는 츠바이크의 평전은 누가 썼나, 는 생각에 머물렀다.
[어제의 세계]가 츠바이크의 회고록이고 타인이 쓴 그의 평전이 있는지 모르겠다. 검색해보면 있겠지만 번역되어 나온 건 없는 듯하다.
[톨스토이를 쓰다]를 읽다 숨이 턱 막히는 듯했다.
와 도대체 어쩌면 이런 글을 쓸 수 있나.
흔히 3대 전기작가로 츠바이크와, 영국의 리튼 스트레이치 Lytton Strachey, 프랑스의 앙드레 모루아 를 뽑는 모양인데(리튼 스트레이치의 글을 읽어본적이 없어서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에겐 딱 두 권의 번역서가 있다) 다른 두 작가에 비해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번역서도 압도적으로 많고 단연 인생 자체도 극적이다.
토마스만의 대표작으로 흔히 왜 [마의 산]을 꼽는지 읽어봐야 할 것 같다.
[파우스트 박사]는 생각보다 고개가 갸우뚱 거려지고 있다.
뒷장부터 거꾸로 읽어도 보고, 분권된 우리의 민음사판 1권의 마지막으로 돌아가 읽고도 있지만, '나치 독일의 우화'로서, 그리고 악의 전형 또는 악에 대해 많은 걸 알려주는 아드리안 레버퀸이라는 인물을 부여잡고 읽기엔 인내가 대단히 필요한 소설이다.
레버퀸 자체가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
화자인 나에 의해 전적으로 관찰되는 레버퀸이 실감나지 않는다.
토마스 만은 왜 레버퀸을 직접 다루지 않고 나라는 화자, 나라는 창을 걸쳐 그를 바라보게 했는가.
'나' 또한 살아있지 못하다. 간간이 '나'의 생활에 찾아온 변화를 서술한 것외엔 살아있는 인물의 맛을 좀체 느끼기 어렵다.
그러면서 나의 평이 등장한다.
화자가 이글을 집필하는 기간은 2차대전이 한창으로 자신이 머무르는 뮌헨이 공습으로 폐허가 되어가는 상황을 직접 겪으며,
1차대전에 독일이 취했어야 했던 과오.
무조건적 항복으로 초토화되는 것을 막았어야 했는데, 독일민족은 '강렬한 비극성에 이끌리는 성향'에 의해 점점 더 비극적 영웅주의로 기울었다는 식의 평가가 끼어든다.
비극성에 이끌리고 도취되기를 갈망하는 독일민족성을 작가는 레버퀸을 통해서 비판하고자 했던 것인가.
매혹되지도 비판적이지도 못한 어정쩡한 거리감이 이 소설을 갸우뚱거리며 읽게 하는건 아닌지 .... 더 두고볼 일이다.
어느 인물 하나 사로잡고 놓치 못할 만한 인물이 아직은 없다.
다만, 영화 <베니스에서의 죽음>의 인상이 강해서인지 모르지만 젊음, 아이, 여성, 눈, 외모에 대한 묘사가 상당히 낭만적이라는 느낌은 받는다. 이런 낭만성이 죽음, 비탄, 비극... 이런 거에 끌리도록 하지 않았는지 짐작해본다. 토마스 만에 대한 전기적 정보도 필요하고 더 많은 그의 작품 독서도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느낌이 든다.
[마의 산]을 읽어봐야겠는데... 당분간 토마스만을 더 들여다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솔찮은 양반이여. 어쩐지 허리가 휘는 느낌이여.
다시 츠바이크.
츠바이크의 브라질에서의 마지막을 담고 있는 영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웨스 앤더슨)이 생각났다.
정말 재밌게 본 영화였는데. 특히나 츠바이크를 모티브로 삼아 영화를 만들었다는 감독의 얘기 때문에 더 인상적이었던 영화가 됐다.
영감을 주는 인물의 존재.
츠바이크와 프로이트도 당연히 빼놓을 수 없는 주제다. 악에서 프로이트의 죽음충동은 필수지참 요소다.
츠바이크의 다른 글들도 굉장했지만 톨스토이를 다룬 이 글들도 감탄에 감탄을 하도록 한다.
나는 감탄하는 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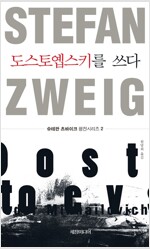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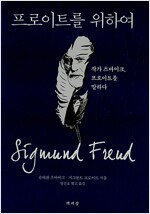

츠바이크와 프로이트
츠바이크의 내면을 다룬 소설이라는 [체스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