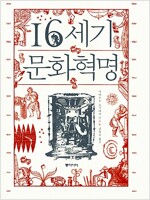2월의 아름다운 표지
2월의 아름다운 표지
3월도 다 갔다. 왠지 억울. 나만 억울한가요?! 그래도 3월은 31일까지.. 그래도 3월엔 야구도 시작했고 .. 롯데의 개막전은 오늘이라는게 사실인가요? 네. 최면성공. 롯데의 개막전은 오늘입니다. 이야! 신나는 개막전이다! 이런 .. 꼴데스러운 지난 2연전의 더러운 패배..좋지 않은 야구였습니다. 무척요! 투수도, 타자도 ... 타자들은 공격도, 수비도 ... 모두 ㅄ 같았지요.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야 할까요? .. 네, 없었던걸로 하고, 레드썬! 오늘이 2010 개막인셈 칩시다. 이야, 드디어 기다리고기다리던 야구 시즌 개막! 어이, 여기는 '표지홀릭' 카테고리 .. 네.. 네..
3월의 아름다운 표지들. 꽁꽁 찜해둔 표지들을 풀어 본다.

열린책들 세계문학 시리즈는 대산세계문화총서와 함께 딴딴한 만듦새로는 널리고 널린 세계문학전집들 가운데 독보적이고, 디자인도 자체 디자인으로 프라이드가 대단히 높으나, 워낙 페이퍼백과 전집을 왔다갔다 하면서 이 전에 나왔던 책이 그대로 나오는 경우도, 약간 바뀌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뭐랄까, 정체성의 혼란. 깔끔함이 없다. 그 와중에 이렇게 멋지고 깔끔한 디자인으로 뽑아져 나오는 몇몇 책들을 보면, 사고 싶어 몸살 . 조지 오웰의 <버마 시절>은 아직 실물을 접해보지 않았지만, 나의 그간의 열린책들덕후경험으로 어떤 표지와 촉감일지 그려진다.






 비밀엽서 시리즈의 완전판이라나, 새로 나온 <비밀의 일생>
비밀엽서 시리즈의 완전판이라나, 새로 나온 <비밀의 일생>
이 시리즈는 전국에서 받은 무기명의 엽서, 즉, 비밀엽서를 손글씨, 각각의 디자인이 묻어나는 그대로 올려 놓은 것인데, 지구 어느 곳에서도 공감 갈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하고, 공감가는 글귀들이 포인트. 때로는 감동, 때로는 유머.
커다란 판형이라 넘겨 보는 재미가 있다. 두고두고 볼 책인지는 모르겠다만.
무튼 <비밀엽서>의 표지도 괜찮았는데, 이번엔 좀 더 '비밀엽.서.'스러운 표지로 돌아온 <비밀의 일생> ( .. 이 번역 제목이 아리송한건 나뿐?) 무튼. 눈에 들어오는 표지다.



잘 나가는 경제,경영서의 공통점은 .. 'RED' 인가요?
말콤 글래드웰의 신간 <그 개는 무엇을 보았나> What the dog saw. 그에게 유명세를 치르게 한 뉴요커 칼럼들 중 엄선하여 책으로 엮었는데,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인기 있었던 칼럼의 제목을 표제작으로 하였다. 말콤 글래드웰 정도의 네임벨류가 아니었다면, '뭥미' 하고 넘어갔을지도 모르는 모험적이기까지 한 제목
표지가 정말 맘에 든다. 인터넷 이미지도 원제와 번역 제목이 눈에 확 들어오고, 실물도 깔끔하니, 책무더기 사이에서 단연 튀는 표지다. 글, 주로 제목이 되겠고, 컬러와 폰트와 구도를 이용하여 괜찮은 표지를 뽑아내는 것은 쉽지 않은데, 이 책의 표지에는 모든 것이 적절히 자리잡고 있다.
인터넷 이미지로 안 보이는 뒷표지는 빨갛고, 책등은 표지를 압축시켜둔것 같은 모양새다.
 데이비드 실즈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 문학동네에서 나온 책이고 김명남 번역이다.
데이비드 실즈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 문학동네에서 나온 책이고 김명남 번역이다.
죽음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라.
유년기와 아동기’ ‘청소년기’ ‘중년기’ ‘노년기와 죽음’까지 총 4부로 장을 나누고 각 연령대에 따라 우리 몸이 노화하면서 겪게 되는 육체적ㆍ심리적 변화들을 자세하게 설명한다. 빽빽하게 나열된 과학적 수치와 생물학적 통계 들은 우리가 모두 똑같은 동물로 태어나 똑같은 경로로 ‘죽음’을 향해 진군하고 있음을 끊임없이 상기시킨다. 그러나 저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공자, 셰익스피어, 장 자크 루소, 오스카 와일드, 에밀 졸라, 존 업다이크 등 세기의 지성들과 무명의 묘지기 조수, 택시 운전기사 등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남긴 삶과 죽음에 관한 경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움으로써 우리가 얻는 것들에 대해 생각해보게 한다.
-알라딘 책소개中-
글 잘쓰는 과학저자가 쓴 경계를 허무는 '죽음'에 관한 책인건가?
크라프트지 표지는 미묘하다. 왜 미묘하냐하면, ... 잘 설명할 수 없으니깐 미묘하다.. 라는건 비겁한 변명!앞으로 더 생각해 보겠다.


 다음 크라프트지 표지가 나올때 까지 ..
다음 크라프트지 표지가 나올때 까지 ..
크라프트지 표지에 대해 대충 생각나는 것만 말해본다면,
인터넷 이미지가 다른 책들과 볼 때 인상적이다. 크라프트지 표지의 포인트는 블랙과 화이트, 혹은 레드 정도가 대부분이니깐. 심플하고. 배경자체가 말을 하고 있는듯한 표지다.
그러나, 이게 책이야, 노트야. 할 수도 있고, 쉬이 질릴 수도 있고,
사실 나는 내구성도 좀 의심되고, 그런 좋거나 나쁘거나의 사이를 바쁘게 파락파락파락 오가다가 팽팽하게 결정 못하게 되어 버리고 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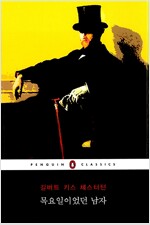 체스터튼의 <목요일이었던 남자>
체스터튼의 <목요일이었던 남자>
오.. G.K. 체스터튼이라고만 하다가 '길버트' '키스' 체스터'턴'이라고 하니 새롭군
명화를 가져다 붙여 놓은 대단히 흔하고, 평범한 느낌의 표지들은 지루해서 혼이 빠질 것만 같은데, (예, 햄릿 표지, 에곤 쉴레 나오는 대부분의 표지 (인간실격 빼고), 호퍼 표지도 살짝..)

 펭귄의 표지는 그런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스테레오타입의 그림들을 가져다 붙이는 통에 그닥 내가 좋아하는 표지는 아니다. 그러니깐, 펭귄클래식'코리아' 말이다.
펭귄의 표지는 그런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스테레오타입의 그림들을 가져다 붙이는 통에 그닥 내가 좋아하는 표지는 아니다. 그러니깐, 펭귄클래식'코리아' 말이다.
요즘은 맘에 드는 표지들이 간간히 나오는데, (음..그러고보니, 근래 나온 표지들은 다 맘에 든다.)
이번 체스터튼의 작품, 저 남자가 목요일과 상관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의외로 상관 있을수도..) 노란 벽 앞에 신사 그림. 제법 맘에 든다. 펭귄클래식코리아는 종이질만 좀 어떻게 개선하면, 그래도 소장할만한 작품들 있는데, 그 즈질 종이질. 세계문학전집중에 젤루 맘에 안 드는 종이질이다. 종이질이 불만인건 펭귄클래식코리아밖에 없어. 어떻게 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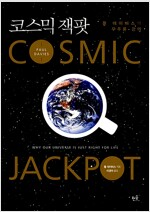 신화책 하나랑 과학책 하나.
신화책 하나랑 과학책 하나.
둘 다 인터넷 이미지도 훌륭하지만, 실물도 대단히 고급스럽다.
 대단히 못 읽을 껄 알기에, 평소에 가장 관심 덜한 분야가 '과학'인데, 과학분야 저자중 노벨문학상을 탈만큼 달필들이 있고, 좋은 작품이 많다는 걸 일단 알고는 있다. 추천도 많이 받고 ..
대단히 못 읽을 껄 알기에, 평소에 가장 관심 덜한 분야가 '과학'인데, 과학분야 저자중 노벨문학상을 탈만큼 달필들이 있고, 좋은 작품이 많다는 걸 일단 알고는 있다. 추천도 많이 받고 ..
그러나, 표지라도 예뻐야, 일단 눈에 들어오고, 평을 매의 눈으로 보며, 사면 읽을까.를 고민하는 현실
그러니깐, 표지라도 예쁘면 나처럼 비과학, 반과학인 사람도 일단 보관함에 넣어둔다는 걸 얘기하고 싶었다. 물론 믿을만한 평도 빵빵해야 하고, 내용도 좋아야 하며, 글발도 있는 작가여야 한다.


 <덕시티>와 <반쪼가리 자작> 민음사 세계문학선 표지중 기억하고 있는 표지가 많긴 하지만, '아름다운 표지'로 꼽을만한 첫인상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 이탈로 칼비노의 <반쪼가리 자작>, 카를로스 푸엔테스의 <아우라> 같은건 굉장히 인상적이더라.
<덕시티>와 <반쪼가리 자작> 민음사 세계문학선 표지중 기억하고 있는 표지가 많긴 하지만, '아름다운 표지'로 꼽을만한 첫인상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 이탈로 칼비노의 <반쪼가리 자작>, 카를로스 푸엔테스의 <아우라> 같은건 굉장히 인상적이더라.
 <오렌지만이 과일은 아니다>의 표지를 보고, 이게 무슨 건강쥬스책이냐며! 분노하며 ^^; 모던클래식표지를 까고, 또 깠는데, 볼수록 익숙해지고, 처음 나왔던 레파토리들에 비해 괜찮은 표지들이 종종 나온다. <덕시티>도 그 중 하나. 이 표지는 이 포맷이여야 할 것 같은 딱 떨어지는 표지다.
<오렌지만이 과일은 아니다>의 표지를 보고, 이게 무슨 건강쥬스책이냐며! 분노하며 ^^; 모던클래식표지를 까고, 또 깠는데, 볼수록 익숙해지고, 처음 나왔던 레파토리들에 비해 괜찮은 표지들이 종종 나온다. <덕시티>도 그 중 하나. 이 표지는 이 포맷이여야 할 것 같은 딱 떨어지는 표지다.

나는 표지도 아닌 것이, 띠지도 아닌 것이 .. 반커버를 대단히 싫어하는데!
일단 이 책 반커버다. 반양장에 커버 책 읽을때 졸라 불편하다곸! (문학동네의 반양장 전집도 같은 경우) 이 책은 ... 내가 애정하는 카를로스 푸엔테스의 책이라 그런건 아니고, 책이 완소라 그런것만도 아니고, 인테리어나 반커버 벗긴 모습이나 깔끔하니 예쁜 모양이다.
작가, 작품, 표지, 만듦새 .. 이 네가지가 잘 어우러진 책을 사는건 언제나 대만족에 돈 버는 기분 ... 어이어이;;

 표지도 멋졌지만, 인테리어에도 엄청 신경썼던 <이방의 기사> 시마다 소지와 나름 혼자 결별한 후에 미련을 못 버리고 샀던 작품인데, 미스터리라기엔 좀 그렇지만, 미타하리를 애정한다면, .. 애정했다면! 그럭저럭 로망으로 읽을 수 있는 작품이었다. 이렇게 난 또 시마다 소지에 앞으로 또 낚일 예정이고 ...
표지도 멋졌지만, 인테리어에도 엄청 신경썼던 <이방의 기사> 시마다 소지와 나름 혼자 결별한 후에 미련을 못 버리고 샀던 작품인데, 미스터리라기엔 좀 그렇지만, 미타하리를 애정한다면, .. 애정했다면! 그럭저럭 로망으로 읽을 수 있는 작품이었다. 이렇게 난 또 시마다 소지에 앞으로 또 낚일 예정이고 ...
<이방의 기사>에 대한 페이퍼는 '시공사 이방의 기사의 세심한 인테리어에 박수 짝짝짝' 참조. 겉표지 벗긴 책도 너무 이뻤고, 책끈 숨김에도 열광했더랬다. ^^;
<손바닥 소설>은 그냥 딱 봐도 책 내용과 표지가 무척 잘 어울리지만, 그 외에도 나의 얇은 책띠 패티쉬 (..응?)를 자극한 표지
'3월 13일 신간마실 - 서점 나들이'
' 나 열광해도 됩니까'
그 외 3월의 아름다운 표지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