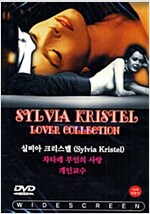
1. 내 청소년 시절 그 질풍노도의 시기에 (사실은 발정 충만 시대.) 의래 수컷들은 시각적 이미지를 탐닉하곤 했다. 그 대표적인 아이콘이 가지가지 여러 방면 두루두루 있겠지만 아마도 “엠마누엘” 이란 이 4글자는 깊숙이 박혀 있을지도 모른다. 실비아 크리스텔이란 이 여배우는 아마도 그 당시 아직 채 덜 여문 내 또래 아이들의 발칙한 상상의 이상향이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그녀가 60의 나이에 삶을 내려놨다고 한다. 이유는 암 발병 후 치료에 전념하다 결국 다른 부위로 전이가 되며 상태 악화. 병원에서 수면 중 운명하였다고 한다. 그래 아무리 화려하고 요철 가득한 인생을 살아왔어도 결국 우린 늙거나 혹은 병들지도 모른다. 그리고 결국 이 복잡하고 머리 아픈 세상과 영원한 작별을 고한다. 같은 나이에 아직도 왕성하게 삶을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또래의 사람들에 비해 그녀의 마지막은 왠지 쓸쓸해 보인다. 어쩌면 너무나 화려하고 자극적인 이미지로 인해 각인되어버렸을 선입견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내 어린 시절의 에로스적 환상을 충족시켜주었던 시대의 아이콘 하나는 이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2. 리턴이라고 해야 하나. 세상은 생각보다 무섭다는 걸 학습했다고 해야 하나. 난 분명 이 일 년 동안 꽤 거칠어진 것 같다. 다른 환경, 다른 부류의 인간들과 섞이면서 많을 것을 보고 경험했다. 아무리 가족이란 테두리의 범위에 있다 하더라도 나락의 상황에서 사람들은 본성이 나온다. 근데 그 모습은 희생적이거나 숭고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 추하고 졸렬할 뿐이다. 나 혼자 독야청청하기에 세상은 만만치 않다. 더불어 흔히 말하는 바닥 쪽에 있는 노동자라는 계층이 무지막지한 대우를 받으며 노동력을 저당 잡히는 모습은 제법 충격이었다. 그들을 위해 만들었다는 노동법이 언제든지 그들의 심장을 관통하는 예리한 비수가 될 수 있다는 웃기지도 않는 현실은 제대로 학습한 것 같다.

3. 프랑수아즈 사강의 “슬픔이여 안녕” 처럼 나 역시 온갖 부정적인 슬픔과 분노의 부조리에게 이젠 안녕을 고해야 할 것 같다. 책의 원제목처럼 바이가 아닌 헬로우 혹은 봉쥬르의 뜻으로 말이다. 아니면 기타노 다케시의 영화 키즈 리턴의 마지막 대사처럼 아직 시작도 안했다고 외쳐야 할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