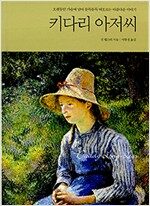금요일은 모든 일에 2%쯤은 여유가 있게 마련이다. 사실 그 2%쯤의 여유는 목요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셈인데, 덕분에 친구에게 오랜만에 주저리주저리 편지를 썼다. 사실 딱히 어떤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시작한건 아니었는데, 편지를 쓰다보니 펜이 저 혼자 달려 버려 써놓고 보니 4장이 넘는다. 학교에 다닌다고 지방에 내려가 있는 친구에게 할 말이 많았나보다.
편지를 쓰고 났는데 잠은 오지 않고 지난 주 아팠을 때 자리에 누워서 읽은 <채링크로스 84번지>가 생각난다. 음 아마 이 책을 읽으면서 친구에게 편지를 써야겠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다. 친구의 편지에 근 2주나 답장도 써주지 못했으니 몸이 나으면 편지부터 써야겠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
주말에 읽을 요량으로 책을 추려서 주문했는데 그 중에 <건지 감자껍질파이 북클럽>이 있었다. 여담이지만 이 책은 입소문으로 화제가 된 소설인데, 그 덕분인지 엄한 표지로 책이 개정되어 나오는 바람에 이만저만 아쉬운게 아니다. 저번 판본이 훨씬 아름다웠는데 갑자기 절판이 되어 버려서 이만저만 손해가 아니다. 이렇게 빨리 개정되서 새판으로 내놓을 줄 알았으면 그 전에 사두는건데. 아참, 인터넷으로 보는 것보다 실물을 보면 훨씬 충격적이다. 도대체 왜 이런 표지를 쓴걸까. 혹시 디자이너가 안티인걸까.
이 책을 읽다가 <키다리 아저씨>가 생각나서 한권을 또 내쳐 읽었다. 아 정말 <키다리 아저씨>는 명작이다. 어머니와 내가 책에 관한 공유할 수 있는 접점이라고 해야하나. 난 <빨간머리 앤>까지는 범접할 수 없는지라 <키다리 아저씨>가 딱 어머니와의 접점이다. 아참, <키다리 아저씨>는 속편이 있다. 주디의 친구가 주디의 요청으로 고아원을 운영하게 되면서 고아원 근처의 의사와 두탁거리는 내용으로 역시 서간채 소설인데, 음 역시 재미나다.
친구에게 못 한 말이 있었는데, 편지를 다시 써야겠다.
아참, 요즘 우표값은 250원이다. (대부분이 모르더라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