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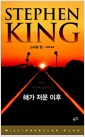
-
해가 저문 이후 ㅣ 밀리언셀러 클럽 126
스티븐 킹 지음, 조영학 옮김 / 황금가지 / 2012년 5월
평점 :

절판

참 오랫만에 스티븐 킹의 작품을 읽게 되었네요. 뭐 사실 스티븐 킹이야 자타가 공인하는 이야기꾼으로 그동안 국내 독자들의 눈을 사로 잡아왔고 나오는 작품들 역시 베스트셀러 반열에 진입하는 유명세를 타는 작가이죠. 내러티브의 참신성과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책 읽는 즐거움을 선사한 작가로 기억됩니다. 특히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면서 펼치는 향연은 참 노력을 많이 하는 작가라는 생각을 절로 갖게 합니다. 이번에 선보이는 <해가 저문 이후> 는 개인적인 견해로는 스티븐 킹의 작품세계를 거의 모두 한 눈에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양한 장르의 작품과 상상을 초월하는 아이디어 그리고 잔잔한 감동을 주는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어 시간가는 줄 모르게 읽어왔던 것 같습니다. 특히 짧막짧막한 13편(의도된 바는 아니겠지만 왠지 13이라는 숫자가 마음에 걸리는 독자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구요)의 단편을 모아놓아 독자들의 의무감도 줄여주고 있어 산뜻한 느낌을 주는것 같네요. 물론 장편을 좋아하는 독자들에겐 솔직히 아쉬운 장면들이 많습니다만...(왜 그런거 있잖아요 정말 좋은 소재로 내러티브를 끌어가는데 좀더 플러서적인 요인만 있으면 대박날것 같다는 느낌들 말입니다. 근데 아마도 단편소설의 매력이 바로 끝을 작가가 비정하기 보다는 작품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상상케 하는게 더 깊은 아쉬움과 여운을 남긴다는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오랫동안 여운으로 남을 것 같은 작품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단편소설의 또 다른 매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행여 짧은 단편들을 모은 선집이라 내러티브의 완성도나 작품성 그리고 소설본연의 모습인 흥미도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우를 가지는 독자분들도 있을리 여겨지지만(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들더군요) 막상 개개별 단편들을 접하는 순간 정말 한순간의 기우였다는 느낌이 들어옵니다. 음 첫 작품인 (윌라) 로 시작되는 범상치 않는 이야기들이 13편 중 어느 하나라도 쉽게 지나칠 수 없을 만큼의 탄탄한 내러티브와 스트럭쳐를 갖추고 있고 인간내면의 심리상태와 더불어 사후세계에 대한 상념등 다양한 감정이입을 끌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한번 역시 스티븐 킹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어 옵니다. 9.11테러와 관련된 (그들이 남긴 것들) 은 조너선 사프란 포어의 <엄청나게 씨끄럽고 믿을 수 없게 가까운> 만큼이나 가슴 아프게 독자들의 심금을 자극하고 있고, 사후 세계를 다룬 두편의 단편 (특별 구독 이벤트), (윌라) 역시 유니크한 내러티브를 통해 한번즘은 상상해보았던 사후 세계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공포호러작품계통에서 죽음 내지는 사후의 세계에 익숙했던 독자들이 받았는 느낌과는 사뭇다른 인간애가 넘치면서 왠지 자신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구별이 없는 그저 바로 전까지 옆에서 통화하고 안부인사를 전하는 친숙한 느낌과 같이 무덤덤 하지만 결코 무의미하지 않는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눈에 띄는 작품들이지 않나 싶네요. 물론 죽은자들의 이야기 치고는 왠지 밍밍한 강도를 주는 것 같기도 하지만요 (지옥에서 온 고양이)를 읽다 보면 그런 밍밍한 강도는 쑥 들어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개인적으로 고양이 등장 공포물중에서 단연 압도적인 섬뜩함을 주는 스토리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왠지 지나다니는 고양이한테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개인적으로 가장 눈여겨보게 된 작품은 마치 <쇼생크 탈출>을 보는 듯한 똥통에 빠지 한 사나이의 눈물겨운 탈출기를 다룬 (아주 비좁은 곳) 입니다. 제목자체에서 많은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내러티브의 전개과정에서 조차 왜 저 제목을 컨텍했을까 싶기도 할 정도였지만 역시 작가의 머리는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하더라구요. 특히 인간의 배설물인 똥과 그들의 안식처인 화장실, 가장 보여지기 싫은 부분을 가장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획기적이고 독특한 가장 스티븐 킹다운 작품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게 되더라구요.
전반적으로 중단편 소설은 흥미면에서 지면상 그 감도가 떨어진다는 그동안의 편협된 생각을 한번에 날려버린 선집이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읽을 수록 좀더 좀더 하는 아쉬움과 더불어 약간의 허탈감을 갖게 하는 아주 묘한 작품들로 구성된 선집으로 작가의 유명세가 허언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산재하고 있어 다소 진득한 느낌을 해치고 있긴 해도 나름대로 각각의 스토리들이 적절하게 합체되어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무엇보다 수록된 단편들이 해가 저문 이후 잔잔하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느낌의 감동과 더불어 밤의 세계에 대한 미지의 공포감을 배가시킨다는 점에서 선집의 제목과 절묘한 앙상블을 보여주면서 기억에 오래토록 남을 것 같네요.